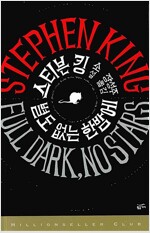
요즘 완전 스티븐 킹에 빠져있다. 그의 소설, 그의 영화만 보고 있다. 슬슬 다른 책들이 보고 싶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그만 읽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읽고 싶다는 말이다. 독한 술을 들이부었으니 물 한 모금은 괜찮지 않을까?
<별도 없는 한밤에>는 독한 소설이었다. 작가 스스로 에필로그에 밝혔듯이. 이 책의 첫 중편 <1922>를 읽었을 때는 너무 독해서 못 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 스티븐 킹이랑 나는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독하다. 어쩌면 읽기 힘든 곳이 몇 군데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랬다면, 나 역시 쓰기 힘든 곳이 몇 군데 있었다는 말을 꼭 해두고 싶다. -p597
이 책은 3편의 중편과 1편의 단편이 수록되어있다. 당연히 4편 모두 재밌다. 글 잘 쓰는 작가가 대개 그렇듯 그는 장편 소설 만큼이나 중편, 단편 소설이 인정받는다. 논핀셕도 말할 것이 없다. <유혹하는 글쓰기>, <죽음의 무도>는 최고의 논픽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어제 스티븐 킹의 나무위키를 봤다. 재밌는 사실들이 한 가득이었다. 그는 과거에 필명으로 글을 썼다. 그 당시 보통 작가는 1년에 1권의 책을 쓰는 게 관례였다. 그 이상을 쓰면 되먹지 못한 작가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스티븐 킹의 1년에 한 권의 책을 내면 다른 책은 필명으로 냈다. 장난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그 당시 스티븐 킹은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다. 하지만 필명으로 낸 책들을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스티븐 킹은 자신의 필명인 작가와 비교당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평가들을 비웃었을지 눈에 훤하다.
스티븐 킹의 글 중에 좋은 점이 뜬금없이 웃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다.
물론 여행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이용하는 유료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놓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 정면충돌이라도 했다가는 꼼짝없이 즉사였다. (그래도 가해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들은 꼭 살아남으니까.). -p231
스티븐 킹은 사투리를 쓰는 입이 걸걸한 욕쟁이 할머니처럼 시원시원하고 거칠고 직설적이다.
스티븐 킹은 이 책에서 비범한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룬다. 소설을 읽으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텐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다.
수중에 있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다 읽어버렸다. 주말에 다음 스티븐 킹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야겠다. 그동안 다른 책들을 봐야겠다. 스티븐 킹의 책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른 책을 읽을 수 없다. 뒷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두번째 책이 두꺼워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른 책 2권 읽을 분량이다.
아무튼 스티븐 킹도 믿고 볼 수 있는 작가가 틀림없다. 다음 책으로 그의 논픽션 <죽음의 무도>를 보고 싶다. 공포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친 논픽션이라고 한다.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