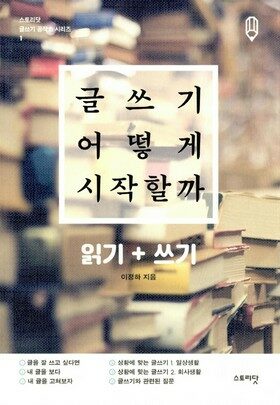-

-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 읽기 + 쓰기 ㅣ 스토리닷 글쓰기 공작소 시리즈 1
이정하 지음 / 스토리닷 / 2016년 4월
평점 :



따뜻한 삶읽기, 인문책 179
맞춤법 틀린 편지가 아름다워
―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정하 글
스토리닷 펴냄, 2016.4.15. 12000원
밥을 짓습니다. 맛나게 먹을 밥 한 그릇을 짓습니다. 때로는 밭에서 거둔 먹을거리로 밥을 짓고, 때로는 가게에서 장만한 먹을거리로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는 혼자 밥을 지었고, 아이들이 제법 자라서 심부름을 할 수 있으니 곁에 두면서 이것저것 잔일을 맡깁니다. 쌀자루에서 쌀을 퍼서 담아서 살살 헹구는 심부름을 맡기고, 달걀을 깨서 거품기로 푸는 일을 맡깁니다. 마늘을 빻으라 하거나 찌꺼기를 뒤꼍에 내놓으라 하거나 밥상다리를 펴고 행주로 닦으라 합니다. 가끔 작은 칼을 건네어 감자나 당근을 썰어 보도록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밥살림을 더 배우고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손수 밥짓기’를 차츰 알아차리겠지요. 하나씩,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씩, 시나브로 눈을 뜨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전문 요리사가 되려면 청소, 설거지, 물 가늠하기 등을 꼬박 몇 년을 거쳐야 드디어 요리를 할 수 있는 불을 만날 수 있다지 않은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15쪽)
1인 출판사 ‘스토리닷’을 일구는 이정하 님이 빚은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를 읽으면, 첫머리에 밥짓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을 짓는 솜씨를 키우기 앞서 이래저래 ‘잔일’을 익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흐릅니다. 글쓰기도 밥짓기하고 비슷한 얼거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자잘하거나 쉽다 싶은 일부터 살피고, 삶에서 바탕이 되는 일부터 헤아릴 적에 비로소 글 한 줄을 즐겁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책방에 가면) 큰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선 보기 어려웠던 책들이 정말 나에게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말을 걸어옥곤 한다. 또 이런 동네 책방의 좋은 점은 책방 주인장들과 책에 대해 좀 더 많은 얘길 나눌 수 있어서 좋다. (18쪽)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할 이야기’가 있을 적에 쓴다고 할 만합니다. 아무 글이나 쓰지는 않으니까요.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하든, 일터에서 보고서를 써야 하든, 면사무소에 서류를 갖다 내야 하든, ‘써야 할 일’이 있으니 글을 씁니다.
틀에 맞추어 딱딱하게 써야 하든, 사랑스러운 이웃님한테 기쁨과 웃음을 담아 편지를 쓰든, 우리는 늘 ‘할 이야기’를 글로 쓰고 ‘할 일’을 글로 옮깁니다.
둘째 언니가 고등학교를 대도시로 가게 됐고, 그 방에 있던 세계문학전집을 동화책이나 위인전 대신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슬레이트 지붕에서 뚝뚝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나 비 오는 소리 그리고 얇은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코끝 시린 바람에도 이불 뚤뚤 말고 읽었던 펄 벅의 《대지》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의 줄거리는 지금도 가물가물해도 그 여운만큼은 아직도 남아 있다. (20∼21쪽)
내게 있어 글은 이런 것이다. 우리 딸이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모른 채 써 주는 편지, 팔순 넘어서 이제 갓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쓰는 첫 편지 같은 것. (29쪽)
《글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를 빚은 이정하 님한테 ‘글’이란 어린 딸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모르더라도 즐겁게 써서 내미는 편지와 같다고 합니다. 이제 갓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쓰는 편지와 같다고도 합니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써야만 ‘글’이지 않아요. 기자나 학자가 써야만 ‘글’이지 않습니다. 한국사람으로서는 한글을 익히면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글이 됩니다. 맞춤법이 어긋나도 좋아요. 띄어쓰기를 틀려도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가 있을 적에 쓰면 될 글이에요. 함께 나눌 이야기를 그리면서 쓰면 될 글이지요.
경험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이기에 그 얘기는 덩달아 독특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읽는 사람마저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간다. (53쪽)
‘의’ 자는 글의 피를 빨아먹는 듯하다. ‘의’ 자를 많이 쓴 글치고 뜻이 분명하게 들어오거나 글이 갖는 힘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가능한 ‘의’ 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5쪽)
나는 내 이야기를 글로 써요. 너는 네 이야기를 글로 쓰고요.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써요. 나란히 밥상맡에 둘러앉았어도 밥을 먹는 손길이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니, 밥을 함께 먹은 이야기를 글로 옮길 적에도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학교에서 한 반 아이들이 똑같은 교사한테서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더라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헤아리면서 글을 쓸 테고요.
간추려 본다면, 우리는 저마다 우리 나름대로 삶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글도 저마다 다르면서 아름다울 만합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흉내내거나 따를 까닭이 없어요. ‘바로 내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바로 내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돼요. ‘바로 내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살피면서,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 결인가를 글 한 줄에 고스란히 담으면 되어요.
글을 쓰는데, 소리 내어 읽어 본다?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 본 사람들은 그 효과를 단번에 알 수 있다. (103쪽)
글에서 ‘-의’만 빼도 무척 매끄럽다고 합니다. ‘-적(的)’을 몽땅 털어내도 매우 부드럽다고 하지요. 같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면 되도록 영어나 한자말이 아닌 한국말로 쉽게 쓸 적에 훨씬 곱다고 하고요. 왜 그러한가 하면, ‘-의’이나 ‘-적’이나 어려운 낱말을 털어낸 글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우리 이야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테니까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얼마든지 틀리더라도 ‘우리 이야기’가 흐르는 글은 즐겁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빈틈없이 맞더라도 ‘우리 이야기’가 흐르지 않으면 즐겁게 읽기란 힘들어요. 어려운 말을 자랑하듯이 곳곳에 끼워넣은 글도 즐겁게 읽기 힘들지요.
어느 모로 본다면 겉치레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글다운 글이 되리라 봅니다. 겉으로 꾸미려 하지 말고, 속내를 속마음을 속사랑을 속속들이 털어놓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려는 몸짓일 적에 ‘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야기가 태어나지 싶어요.
자신의 얘길 쓰시고 싶다면 굳이 컴퓨터로 워드에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조하잖아요. 좀 더 아날로그적인 도구로 자신의 얘길 써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 거울에 손가락으로 “안녕?” 이렇게, (185쪽)
글쓰기를 어떻게 해 볼까요? 거울에 손가락으로 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대고 손가락으로 써 볼 수도 있어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써 볼 수 있겠지요. 바닷가 모래밭이라든지, 바닷물에 대고 써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등에다 글을 써 줄 수 있고,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살살 살가이 써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으면서 글이 되고, 사랑을 띄우면서 글이 되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글이 되고, 이야기꽃을 피우려 하기에 글이 되어요. 그러고 보면 웃음과 노래와 기쁨을 북돋우는 따사롭거나 넉넉한 마음이 언제나 글 한 줄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싶습니다. 2017.1.19.나무.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