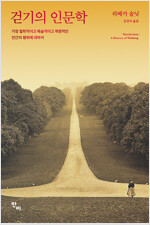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숲노래 책넋
시큰발
우리말 ‘골’이 있다. 셈으로 치면 ‘10000’을 가리킨다. ‘골백번’ 같은 데에도 쓰지만, ‘골짜기’하고 ‘골머리’ 같은 데에도 쓴다. ‘즈믄(1000)’도 세기에 까마득하지만, ‘골(10000)’은 세자면 더더욱 아득하다. 우리 머리에서 생각을 빛처럼 지어내어 씨앗으로 심는 ‘곳’인 ‘골(뇌)’이니, 그야말로 숱하다고 여길 셈값이게 마련이다.
우리말 ‘골’을 넣는 낱말로 ‘골고루’가 있으니, ‘골’이란 ‘고루’를 줄인 얼개라고 볼 만하다. 아프거나 괴롭다는 ‘골골’은 ‘곯다’나 ‘곪다’랑 맞물린다. ‘골짜기·골머리·골고루’라는 낱말로 잇는 ‘골’은 ‘고을’을 줄인 낱말이면서 ‘곳’을 거쳐서 ‘곱다’와 ‘곰’과 ‘고요’로 이으니, 별이 밝은 밤을 나타내는 자리로 고즈넉이 잇기도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골걸음(만보 걷기)’을 하려는 분이 꽤 많은데, 집안일이나 밭일을 하노라면, 골걸음쯤 우습다. 아이랑 놀며 보금자리를 돌보노라면, 또한 쇠(자동차)를 몰지 않고서 걷거나 두바퀴(자전거)를 달리면 골걸음은 으레 날마다 할 테지.
지난날 어린이는 누구나 언제나 끝없이 걸었다. 다리랑 무릎이 시큰하고 아파도 걷고 또 걸었는데, 맨몸이 아닌 짐을 쥐거나 메거나 이거나 안은 채 끝없이 걸었다. 한나절(4시간) 오가는 길을 심부름으로 짐을 나르기 일쑤였다. 요즈음 어린이는 발바닥이 보송보송하겠지. 지난날 어린이는 발바닥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했다. 내 발바닥은 어린날부터 딱딱하고 울퉁불퉁했지만, 여러 또래나 동무에 대면 ‘말랑발’이라며 놀림받았다. 그런데 내 발바닥은 갈수록 딱딱하고 단단하게 바뀐다면, 여러 또래나 동무는 갈수록 거꾸로 말랑발로 바뀌더라.
어제는 고흥에서 새벽부터 달렸다. 아침에 부산으로 건너가서 낮 내내 걷고 서며 돌아다녔다. 저녁과 밤에 이야기꽃을 펴는 일을 할 적에는 모처럼 자리에 앉아서 퉁퉁 부운 발바닥과 발가락과 발등과 뒷꿈치와 종아리와 허벅지를 한참 주물렀다. 여태 이야기꽃을 펼 적에는 으레 서서 말을 했으나, 엊저녁에는 발과 다리를 주무르려고 내내 앉았다. 이러고도 발과 다리가 안 풀려서 밤새 등허리를 펴고서 가만히 주물렀고, 오늘 아침에도 덜 풀렸기에, 뒤뚱뒤뚱 절름절름 걸어서 전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서 고흥으로 돌아왔지. 마지막으로 시골버스를 기다려서 타야 하는데, 발과 다리를 헤아려서 택시를 불렀다. 15km를 달리며 17000원을 치르는 삯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애쓰고 힘쓴 발과 다리를 지켜야지.
집에서 씻고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 부엌에 앉아서 또 주무르며 풀어준다. 이제 비로소 조금 풀린다. 이튿날 마저 잘 쉬고서, 달날(월요일)에 서울로 일하러 즐겁게 가자. 다 풀고서 움직여야지. 달날과 불날(화요일)에도 실컷 걸어다니면서 이웃을 만나고 이야기꽃을 펴고 책집마실을 할 테니까. 2026.1.24.흙.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