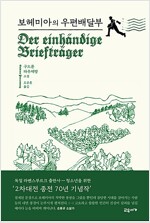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가난한 책읽기
쓸모없어, 네 오지랖
쓸모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쓸모있는 일이 남달리 있을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퍽 많은 분들이 쓸모없는 일에 너무 기울지 싶다. 스스로 사랑하고, 모든 일놀이를 사랑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곳에서 즐겁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펴는 분은 뜻밖에 드물지 싶다.
아니, 사랑하고 사랑받는 온하루를 기쁘게 노래하는 분은 많다고 해야겠지. 많이 배우거나, 많이 쥐거나, 많이 드날리거나, 많이 부리는 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채 움직인다고 느낀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많이’나 ‘적게’가 없다. 남이 보기에는 많거나 적어 보일 테지만, 사랑살림일 적에는 “늘 스스로 즐겁게”일 테니까.
푸른배움터를 다니던 무렵을 떠올린다. 그때 동무들은 “야, 너 그런 책 왜 읽어? 그 책이 시험(수능)에 나온대?” 하고 묻는다. “아마, 이 책이나 이 책을 쓴 사람이 남긴 다른 글은 시험에 안 나올 듯해.” “그래? 알면서도 읽어? 시간 안 아까워?” “책을 꼭 시험에 나와야만 읽니? 읽어야 할 책이니 읽고, 배워야 할 책이니 배워.” “시험에 안 나오는 책을 뭐 하러 읽어? 정 읽고 싶으면 대학교에 붙고 나서 읽으면 되잖아.” “그래? 오늘 안 읽는 책을 나중에 가서 읽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론 말야, 코앞에 시험이 닥쳤다고 해서 안 읽는 책은 있지, 시험이 끝난 뒤에도 안 읽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읽을 책을 그저 읽을 뿐이야.” “…….” “너, 생각해 봐.” “뭘?” “내가 ‘시험에 나올 턱도 없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할 시험공부는 스스로 끝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스스로 읽어.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길에 이바지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들 시험문제를 더 잘 풀지 않을 수 있지만, 거꾸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한결 느긋해.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문제에 안 나오는 책’을 읽으면서 더 ‘시험공부 대비를 잘할’ 수 있어.” “야,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응,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알고 싶으면 너도 이럴 때에 책 좀 읽어 봐. 추천도서나 권장도서에 아예 들어간 적 없는 책을 읽으면, 너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열일고여덟 살 무렵이던 1991∼92년에 동무하고 나눈 말은 오지랖이었을까? 바보스런 멋이었을까? 얼토당토않은 핑계였을까? 그러나 푸른배움터 여섯 해 내내 ‘중간·기말시험’뿐 아니라, 1993년 9월과 11월에 있던 우리나라 첫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에도 ‘수험서 아닌 책’을 잔뜩 챙겼다. 나는 ‘수능 1교시·2교시’가 끝나고서 숨돌리는 틈뿐 아니라, 도시락을 먹는 낮밥 무렵에도 ‘수험서 아닌 그냥 책’을 펼쳐서 읽으며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리면서 이다음에 치를 셈겨룸을 헤아렸다.
이날 저녁에 만난 또래는 “너 진짜 미쳤구나. 그때에 수험서를 한 쪽이라도 더 보았으면 10점은 더 나오지 않아? 아니 20점도 더 나오겠다.” “아니야. 안 나올 점수는 그때 더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 나올 점수는 알아서 나와. 그리고 나는 그때 ‘그냥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기에 시험을 더 잘 치를 수 있었어.”
‘오지랖’이란 뭘까? ‘옷자락’을 가리키는 낱말일 텐데, 옷자락이 넓으면, 품이 넓어서 푸근하게 품을 줄 아는 마음이기도 하다. 오지랖이 넓기에 겨울에도 나눌 수 있고, 너른 옷자락을 잘라서 건넬 수 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닌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은 다르다.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은 늘 말썽을 일으키고, ‘쑤석거린다’고 할 만하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오지랖이 아닌 끼어들기를 하니까. 알지 않기에 뒷말이나 남말이나 쑥덕질을 할 테고.
오지랖은 쓸모없는 짓일까. 오지랖은 그냥 바보짓이고 귀찮거나 성가시게 구는 짓일까. 오지랖이라고 하는 ‘품’이 넓은 사람이란, 언제나 스스로 넓게 펴고 살림을 짓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오지랖이 없다면 ‘품’이 좁거나 밭은 나머지, 오히려 ‘나(스스로)’부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고 바라볼 줄 모르게 마련이라, 이때에는 ‘남’을 헤아릴 그릇이 안 된다고 느낀다. 둘레를 볼 만큼 느긋하고 넉넉하기에 오지랖이요, 둘레를 안 보고 냅다 달려들기에 끼어들기일 테지.
굳이 ‘쓸모있는’ 뭘 해야 하지 않다. ‘쓸모있는’ 글을 써야 하지 않다. 지난날 ‘쓸모있는’ 글이란, ‘애국·충성·효도·교훈’이었고, 오늘날 ‘쓸모있는’ 글이란, ‘돈·이름·힘’이라고 느낀다. 돈되거나 이름팔거나 힘센 글을 써야 할까? 누구나 스스로 사랑하는 글을 써야 하지 않나? 쓸모있을 글이 아니라, 스스로 이 삶을 사랑하면서 나랑 너를 아우르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글을 쓸 일이지 않나? 글삯이 톡톡해야 글을 쓴다는 이름꾼(유명작가)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나는 글삯이 0원이어도 기꺼이 쓴다. 나는 나부터 스스로 살리고, 곁님과 아이들과 이웃이 어깨동무하면서 푸르게 피어날 숲길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2025.2.4.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