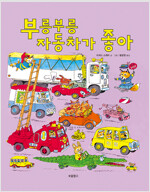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가난한 책읽기
걸어다녀야 사람이라면
걸어다니는 사람이기에 바람을 느끼고 철빛을 읽고 해가 기울거나 서는 줄 알아본다. 안 걷는 사람이기에 달종이로 하루를 보내고 바람을 못 읽고 그저 덥거나 춥다고 여긴다. 걸어다니는 사람이기에 마을을 헤아리고 보금자리를 돌아본다. 안 걷는 사람이기에 길과 길 사이만 가로지르다가 집이라는 곳을 안 돌아본다.
우리는 집에서 걷는다. 마루하고 칸 사이를, 부엌하고 뒷간 사이를, 이곳하고 저곳 사이를 걷는 동안 이 집이 어떤 살림자리인지 헤아린다. 걷고 다시 걷고 새로 걷는 사이에 발바닥과 손바닥으로 오늘이라는 살림길을 짚는다. 우리는 밖에서 걷는다. 우리 보금자리부터 너희 마을로, 너희 마을과 다른 마을 사이로, 다른 마을 사이에서 다시 우리 보금자리로, 가만히 걷는다.
누가 책을 손에 쥐고서 살살 한 쪽씩 펼까? 부릉부릉 손잡이를 쥐는 하루라면, 책을 저절로 멀리한다. 쇠(자동차)에서 내리면 그림(영상)에 사로잡히기 바쁘고, 한집에서도 말소리가 사라진다. 뚜벅뚜벅 걷기에 손에 책을 쥘 틈이 있고, 밖일을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살림을 되새기면서 발걸음과 손길을 가누어 본다.
쇠가 늘수록, 쇠를 장만하는 사람이 늘수록, 쇠에 아이를 태우는 ‘안 어른’이 늘수록, 서로서로 ‘안 읽기’와 ‘책잊기’로 넘어간다. 쇠를 이따금 타더라도 바람소리에 눈코귀입을 맡기는 사람은 “나는 어떤 아이에 어른인 사람일까?” 하고 생각하며 문득 작은책 한 자락을 무릎에 올려놓고서 별바라기를 한다. 나는 어디를 걸으면서 어느 책을 손에 쥔 하루인지 돌아본다. 나부터 오늘 ‘어른’인지 ‘안 어른’인지 가눈다. 한가을부터 늦가을에 이르도록 우리 보금자리에 날마다 날아와서 감을 쪼는 뭇새를 지켜보면서 곱씹는다. 참말로 모든 새는 다 다르게 감알을 쪼고, 다 다르게 노래하고, 다 다르게 날다가, 다 다르게 떠난다.
집일을 하다가 나래터(우체국)를 다녀오려고 나온다. 나래터를 들르고서 가볍게 저잣마실을 한다. 읍내 한켠에서 감꾸러미를 파는 가게 앞을 스친다. 장만할까 말까 망설인다. 집으로 돌아갈 시골버스를 타로 걸어가다가 멈춘다. 때바늘을 보니 감꾸러미를 사러 돌아갔다가는 늦겠다. 다시 걷는다. 이튿날 다시 나래터를 갈 테니 오늘은 지나가기로 한다. 우리 보금자리 감은 다 새한테 내주고서 다른집 감을 사다먹는다. 사람은 이렇게 사먹을 수 있으니, 시골자락 한 집쯤은 까치밥을 고스란히 두어도 즐겁다.
시골버스에 타고서 이마를 문지른다. 아까 읍내에서 책을 읽으며 걷다가 전봇대에 쿵 하고 박았다. 거님길 한복판에 전봇대가 있더라. 가느다란 전봇대였는데, 전봇대가 휘청거렸다고 느낄 만큼 세게 박았다. 쿵 박는 소리도 오지게 컸다. 집으로 돌아가니 큰아이가 “아버지 이마가 발갛게 부었네요.” 하고 웃는다. 걸어다녀야 사람이라면, 걸어다니며 책을 읽어야 전봇대에도 이마를 찧고서, 이 나라 거님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새삼스레 느낄 만하다. 2025.11.19.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



전봇대에 머리를 박은 책은 '토토'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