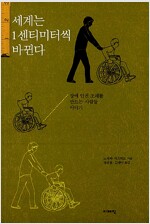오늘도 까칠한 숲노래 씨 책읽기
숲노래 오늘책
오늘 읽기 2024.1.14.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노자와 가즈히로 글/정선철·김샘이 옮김, 이매진, 2011.11.4.
헛간 오른켠을 치운다. 이곳에 책더미를 좀 옮겨 놓고서 느긋하게 추스르자고 생각한다. 묵은 종잇조각을 차곡차곡 풀어서 쌓고 묶는다. 지나가는 바람은 고이 지나가면 되고, 새로 찾아들 바람은 이 땅을 쓰담쓰담 베풀면 된다. 늦은낮부터 잔뜩 모인 구름은 해거름에 빗방울을 조금 뿌리더니, 밤에는 개어 별이 초롱초롱하다. 오늘은 ‘이무롭다·이물없다’라는 낱말을 둘러싼 말밑을 풀었다. 풀고 나니 개운하면서 쓸쓸하다. 그저 사투리인 말씨인데, 아주 수수한 삶과 살림에서 피어난 낱말인데, 숱한 말글지기는 말을 말로 바라보지 않더라. 아무래도 손수 삶을 가꾸거나 살림을 짓는 하루가 아닌, 책상맡에서 맴도는 터라 말길을 놓치는 듯하다.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를 읽고서 돌아본다. 퍽 잘 여민 꾸러미라고 느끼면서도 ‘1센티미터씩’이라고 군말을 넣은 대목을 곱씹는다. “온누리는 바뀐다”라고 하면 된다. 더디 바뀌지도 빨리 바뀌지도 않는다. 그저 바뀌어 간다. 바뀌려고 어지럽다. 바뀌는 길이니 어수선하다. 옛몸과 옛틀을 몽땅 녹여야 바뀐다. 티끌 하나만큼 바뀌더라도 옛길을 모조리 내려놓아야 새길로 나아간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저 앞을 모를 뿐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에, “한 치”라는 군말을 넣었구나 싶더라. 안갯속에서는 참말로 걸을 수조차 없게 마련인데, 오히려 눈을 감으면 근심걱정 없이 척척 걸어갈 수 있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밑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