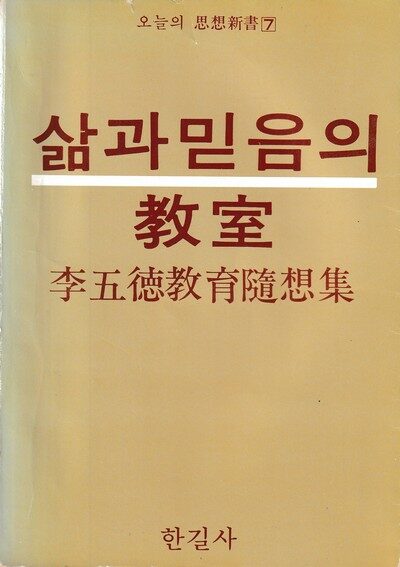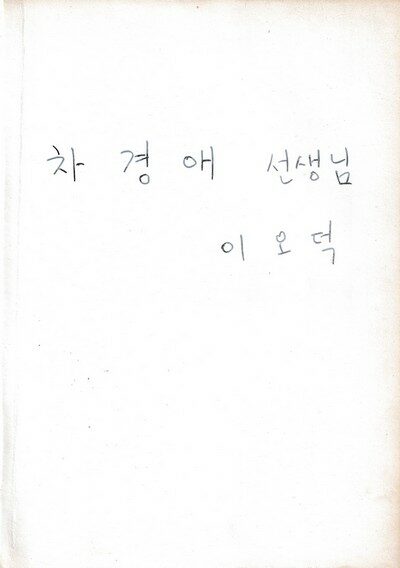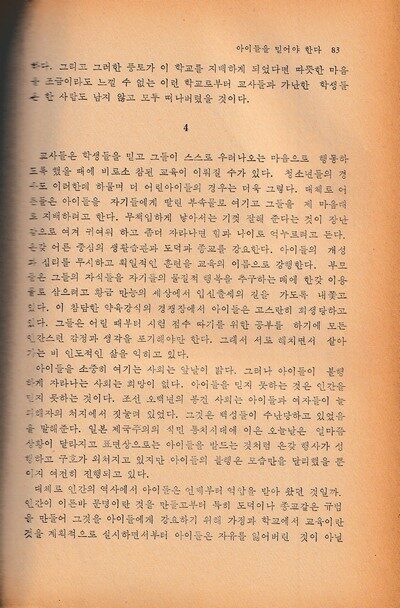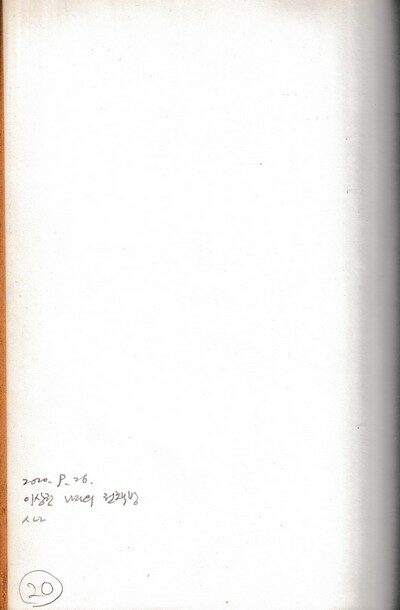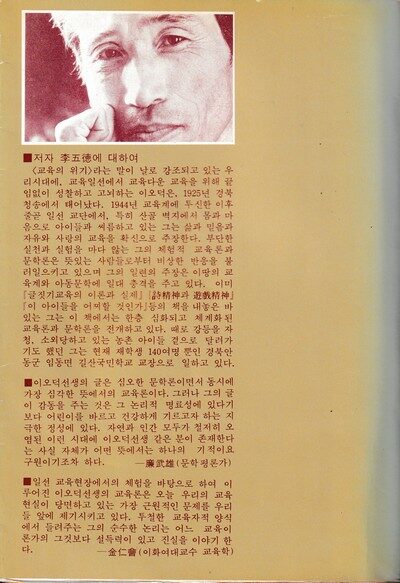이오덕 읽는 하루
― 길들임 맘들임 꽃들임
《삶과 믿음의 敎室》
이오덕
한길사
1978.12.20.
《삶과 믿음의 敎室》(이오덕, 한길사, 1978)은 우리나라가 일본 총칼나라(제국주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지 서른 몇 해 즈음 될 무렵, 이 나라 배움터가 어떤 민낯인가를 낱낱이 밝힌 꾸러미입니다. 이오덕 님은 1944년부터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배움터에서 한글 아닌 ‘국어(國語)’란 이름으로 일본글만 가르치고 읽어야 하던 때부터 길잡이 노릇을 했고, 이듬해에 일본이 물러나면서 바뀌는 물결을 지켜보다가, 한겨레가 두 동강이 난 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피비린내로 싸우는 수렁을 가로질러야 했고, 어느덧 다시 총칼나라에 갇힌 캄캄한 굴레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코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다른 길잡이는 몽둥이를 하나씩 장만해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때리고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따금 맨손으로 다니는 다른 길잡이는 맨주먹과 발길질로 아이들을 두들겨패고 밟았습니다. 다른 길잡이는 아이들이 돈(사납금·육성회비·성금)을 안 내면 또 두들겨패면서 닦달을 해댔고, 시골이나 멧골에서는 숱한 길잡이가 ‘사택’에서 허구헌날 술을 퍼마시는 꼴도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이오덕 님은 몸이 여리기도 했으나 술 한 방울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지만, 정작 언제부터 우리말과 우리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 판입니다. 조선 무렵 세종 임금은 틀림없이 ‘훈민정음’이란 글씨를 여미었습니다. 우리글인 훈민정음입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담는 글”이 아닌 “우리가 내는 소리를 담는 글”로 흘러왔습니다. 세종 임금 스스로도 중국 한문으로 글을 썼고, 조선 오백 해 내내 임금과 벼슬아치와 글바치 누구나 중국 한문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말을 담는 글”이 아닌, “중국 한문을 읊는 소리를 담는 글”로 오백 해를 보낸 굴레였어요.
일본이 총칼로 억누르던 때에는 숱한 사람들이 중국바라기에서 일본바라기로 돌아서면서 ‘우리말 우리글’이 아닌 ‘國語(일본말 일본글)’에 갇힌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물러간 1945년 뒤에는 되레 중국 한문과 일본 한자말이 뒤범벅이었지요. 여기에 영어까지 섞여 ‘우리말 우리글’은 늘 꼬랑지로 밀렸으니, ‘우리 숨결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말 우리글’로 담아내려는 사람은 너무 드물었습니다. ‘무늬만 한글이되 우리 넋도 숨도 얼도 없는 껍데기 글’인 채 참 오래도록 스스로 굴레에 옭매였습니다.
조선 무렵에 ‘백성·백정·천민·종(노비)’이란 이름이던 사람들은 글이 없이 살았습니다. ‘백성·백정·천민·종(노비)’이란 이름이던 숱한 사람들은 붓도 종이도 먹도 벼루도 구경할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만질 수 없고 책은 어림조차 못 했어요. ‘백성·백정·천민·종(노비)’이란 이름인 들꽃같은 사람들이 붓먹벼루종이를 구경하거나 만질라 치면 그만 나리(양반)한테 붙들려서 볼기(곤장)를 얻어맞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틀림없이 세종 임금은 ‘우리글 훈민정음’을 엮었으나 “백성·백정·천민·종(노비)하고는 그저 동떨어진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무늬만 우리글’이 아닌 “참으로 누구나 스스럼없이 생각을 말하면서 담아낼 수 있는 글”이 되기까지는 한참 걸렸습니다. 주시경 님은 1913년 무렵에 ‘한글’이란 이름을 퍼뜨려 주었는데, 이분이 1905년에 《국문문법》을 써내기 앞서까지는 “우리나라에 우리말을 담는 우리글은 싹트지 않았다”고 해야 올바릅니다. 작은이 주시경 님이 새롭게 눈뜨고서 바지런히 ‘우리말 가르치기’를 펴면서 ‘우리말이 어떤 얼개인가를 갈무리해서 말틀(문법)을 처음으로 세우기’를 할 즈음에야 비로소 ‘우리말 우리글’이 싹텄습니다. 이때까지 우리한테는 “우리말은 ‘백성·백정·천민·종(노비)’ 사이에 늘 있기는 했되, 언제나 중국 한문에 짓밟혔을 뿐이고, 우리글이란 까맣게 없던” 굴레였습니다.
《삶과 믿음의 敎室》을 읽으면, 이 나라 배움터 이야기 못지않게 ‘우리말 우리글이 짓밟히고 허덕이면서 몸살을 앓는’ 이야기가 그득합니다. 이오덕 님은 왜 ‘교육’을 짚는 글에 ‘우리말 우리글’ 이야기를 자주 폈을까요? 모든 가르침과 배움은 바로 ‘말’로 하거든요. 참다이 가르치고 배우는 길은 ‘참다운 말글’로 펴게 마련입니다. 늘 쓰는 말부터 참답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책을 손에 쥐더라도 슬기로이 못 가르치고 아름답게 못 들려주며 착하게 못 밝힙니다. 우리말을 우리글에 담을 적에 드디어 홀로서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고 가꾸는 삶이기에 참말·참넋·참길을 이룹니다. 남(권력자·지식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기에 거짓말·껍데기·겉치레를 뒤집어쓰거나 내세웁니다. 겉으로 말쑥하게 차려입어야 어른스럽지 않습니다. 삶을 스스로 짓는 마음을 말에 담고, 이 삶말을 글로 고스란히 옮기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꿈을 그릴 줄 알기에 어른스럽습니다.
나이만 먹으면 늙은이일 뿐입니다. 철이 들어야 어른입니다. 나이만 먹은 늙은이였던 숱한 꼰대는 ‘선생(先生 :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이름을 허울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몽둥이를 마구 휘두른 그들이지요. 아이들을 짓누르면서 길들인 늙은이가 온나라를 뒤덮던 우리 민낯이에요.
나이를 먹기보다는 철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기에 비로소 ‘길잡이’일 수 있고 ‘스승’으로 섭니다. 길을 잡아서 먼저 나아가는 참하고 착한 사람이 ‘이슬받이’입니다. 스스로 삶을 가꾸고 살림을 지으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스승’입니다. 가르치기에 스승이 아니에요. 스스로 삶·살림·사랑을 짓는 하루를 스스럼없이 보여주면서 손을 맞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기에 스승입니다.
길잡이나 스승은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다. 길잡이나 스승은 나란히 섭니다. 가시밭길이나 자갈길을 나란히 걷는 길잡이요 스승입니다. 앞으로 꽃길이 되도록 함께 가꾸려는 길잡이입니다. 머잖아 숲길을 이루도록 함께 땀흘리고 웃음짓고 노래하는 스승입니다.
일본 우두머리만 총칼나라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두머리도 총칼나라를 앞세웠습니다. 예나 이제나 임금도 나라지기도 벼슬아치도 글바치도 총칼(전쟁무기)을 너무 좋아합니다. 총칼을 물리치고서 오직 사랑으로 붓을 잡고 호미를 쥐려는 마음하고는 아주 등진 그들이자 우리들입니다. 모든 총칼은 사람들을 길들이려 합니다. 모든 풀꽃나무는 스스로 곱게 물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들여야 사람다우면서 사랑다우면서 삶이자 살림다울까 하고 생각해야지 싶습니다.
껍데기를 스스로 벗고서 아이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까? 허울을 기꺼이 벗고서 아이 곁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까? 겉치레를 말끔히 물리치고서 아이랑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살림지기로서 오늘을 그리고 가꿀 수 있습니까?
아이한테서 배우기에 눈이 밝은 어른입니다. 어른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넌지시 가르치기에 마음이 맑은 아이입니다. 참다운 사이라면 높낮이가 없습니다. 참답지 않은 사이라서 높낮이를 세우고 틀(질서·권위)에 가두려 합니다. 아이들은 틀에 가두면 죽습니다. 풀꽃나무도 틀에 가두면 죽어요. 물을 틀에 가두면 썩어버리고, 바람을 틀에 가두면 빛을 잃습니다.
ㅅㄴㄹ
20여 년 전 나는 ㄱ도 어느 중학교에 근무한 일이 있다. 그때 ㅂ교장 선생은 손수 ‘교양봉’이라고 쓴 1미터 길이의 몽둥이 하나를 직원실 한쪽 벽에 걸어 두었었다.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두들겨패야 한다는 것이 ㅂ교장 선생의 신념이었다. (33쪽)
나무심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돈을 얻는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무를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대하고 애정으로 심고 가꾸도록 해야만 비로소 교육이 되는 것이고 산림녹화도 참되게 이뤄질 것이다. (51쪽)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내 동직자들은 기계로 전락해 있다. 단추를 누르면 돌아가고, 그만두라면 멈춰서는 비참한 기계다. 환경정리고, 청소고, 문서 처리고, 점수따기 시험준비 교육이고 시킴을 받아 마지못해 한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이 없으면 정작 해야 할 교육은 할 줄 모른다. (60쪽)
오늘날의 학교는 육체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인격으로 감화시키는 정신교육이 없고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노작교육을 등한히 하고, 그저 점수따기 경쟁을 시키고, 겉모양을 갖추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101쪽)
교육자로서 교육 문제를 생각하는데 졸업장이니 자격증이니 학위니 하는 것만을 따진다는 것은 교육을 그르치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본다. (109쪽)
어린이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해서 장차 어른이 되면 돈벌이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벼슬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125쪽)
일선의 교사들은 문인들이 쓴 이런 문학작품의 창작 이론이나 입문서 따위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 교육에다 적용해서 지도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글짓기 교육을 크게 잘못되게 이끌어 온 요인이 되었다. 그것은 산문 쓰기에서 생활을 떠난 거짓스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익히게 하여 어린이다운 순진성을 버리게 하고, 시가 될 수 없는 짝짜꿍 동요짓기로 저보다 나이 어린 아기들 흉내를 내게 하여 아이들의 정신을 퇴화시켰던 것이다. (159쪽)
문학교육(문학작품 감상 교육)은 생활을 정직하게 쓰는 글짓기·시짓기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장차 문학작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닦고 인간적 기반을 쌓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릴 때부터 무슨 문학작품을 쓴다고 해서 어른들 흉내나 내는 사람은 결코 작가가 될 수 없고 참 시인이 되지도 못할 것이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기도 어렵다. (188쪽)
사투리나 순수한 우리말 땅이름도 귀한 문화재라고 하는 말들을 최근에는 더욱 듣게 되어 반갑다. 그러나 우리말이 이조 5백 년과 일제 36년에 이어 여전히 수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말 교육이 보급되어 있는 오늘날이기에 더욱 한심스럽게 생각된다. (228쪽)
물론 이것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인다는 뜻이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되고, 그것을 고심해서 연출하는 아이들보다 구경하는 관중이 본위가 되고, 내면보다 겉모습이 중시되고, 인간적인 아름다움보다 기계적인 통제의 아름다움이 찬양된다고 할 때, 그런 사회는 창조의 샘물이 말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30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