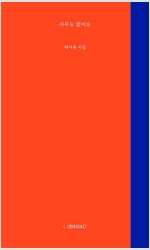숲노래 오늘책
오늘 읽기 2020.2.3.
《박서원 시전집》
박서원 글, 최측의농간, 2018.4.26.
바람은 우리가 속삭이는 말을 듣는다. 시샘하는 말도 듣고, 짜증내는 말도 들으며, 꿈꾸는 말이나 사랑하는 말도 듣는다. 바람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골을 부릴까? 때로는 바람도 골질을 하겠지. 그러나 골질하는 바람보다는 사람들이 문득 내뱉는 숱한 말을 고스란히 사람한테 돌려주지 싶다. 이를테면 덥다는 타령을 하니 무더위를, 춥다고 노래를 하니 추위를, 비를 싫어하니 함박비를, 이 땅을 더럽히니까 망가뜨리니 무시무시한 벼락이며 돌개바람을 주는구나 싶다. 《박서원 시전집》을 읽는다. 단출하게 나온 이녁 시집을 읽은 뒤에 두툼한 시전집은 한동안 책상맡에 모셔 놓았는데 마침 떠올랐다. 1990년대를 가로지르는 다부진 말이요 넋이며 숨이로구나 싶다. 어쩌면 2020년대하고는 살짝 틀어지는 말일 수 있을 텐데, 요즘 나도는 숱한 ‘젊은 시집’을 헤아린다면 박서원 님이 마지막 숨을 그러모아 새긴 이 시전집에 댈 만하지 못하리라 본다. 그저 삶을 말하기에 시가 된다. 그저 사랑을 읊기에 시가 된다. 그저 하루를, 꿈을, 멍울을, 눈물을, 웃음을 차근차근 짚어내기에 시가 된다. 시쓰기란 치레질이 아니다. 시쓰기란 자랑질도 아니다. 시가 아닌 치레질이나 자랑질이 넘치는 요즈막 숱한 시집에 진절머리가 났는데, 좀 풀린다.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