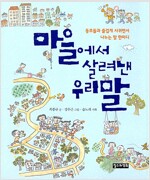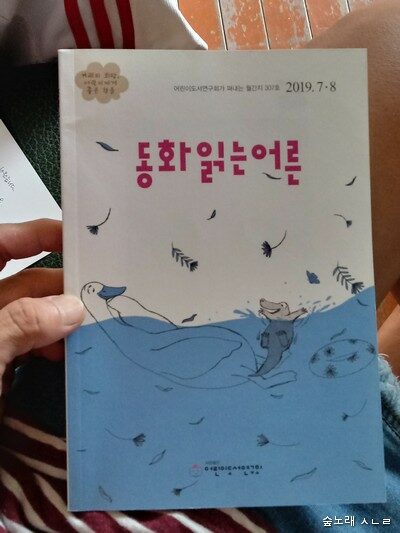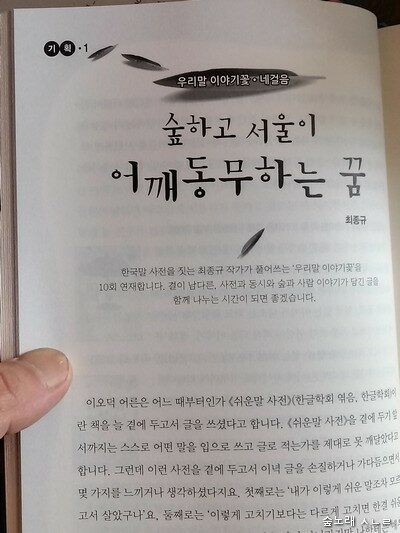우리말 이야기꽃
네걸음 ― 숲하고 서울이 어깨동무하는 꿈
이오덕 어른은 어느 때부터인가 《쉬운 말 사전》이란 책을 늘 곁에 두고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쉬운 말 사전》을 곁에 두기 앞서까지는 이녁 스스로 어떤 말을 입으로 쓰고 글로 적는가를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을 곁에 두고서 이녁 글을 손질하거나 가다듬으면서 몇 가지를 느끼거나 생각하셨다지요. 첫째로는 ‘내(이오덕)가 이렇게 쉬운 말조차 모르고서 살았구나’요, 둘째로는 ‘이렇게 고치기보다는 다르게 고치면 한결 쉬운 말이 되겠구나’요, 셋째로는 ‘이 말씨가 쉬운 말이 아니라지만 나(이오덕)한테는 매우 익숙하고 부드러운 말씨인데, 이 어렵다는 내 말씨를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합니다.
몇 가지 마음이 뒤엉키면서도 더 쉽게 쓰려는 생각을 키우셨고, 1970년대가 저물 즈음에는 ‘쉬운 말 쓰기’보다는 ‘시골말 쓰기’가 어울리겠다고 깨달으십니다. ‘쉬운 말’은 지식인이 머리로 짜맞춘 말씨가 많다고 여기셨어요. 시골에서 흙을 만지면서 살림을 짓고 아이를 돌보는 나날을 보내는 시골지기 입에서 저절로 샘솟는 말씨야말로 참답게 쉬운 말이라고 느끼셨다지요.
이런 마음으로 엮은 책이 《일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다음으로 엮은 《우리도 크면 농사꾼이 되겠지》는 언제나 서울바라기가 되어 시골을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는 시골 어린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기를 바라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시골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늘 듣고 쓰면서 자라는 시골말이 바로 ‘쉬운 말’이니 교과서나 책이나 신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시골말을 건사하기를 바라셨어요. 이러면서 바로 시골 어린이 말씨를 서울 어른이 함께 듣고 읽고 배운다면, 머리로 짜맞추는 억지말이 아닌, 누구한테나 삶에서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말이 새롭게 깨어나리라 하고도 여기셨습니다.
말이란 참 재미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새 말이 태어나거든요. 예쁜 벗님들이 고운 생각으로 떠올리는 낱말은 모두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요.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웃음을 생각하면 웃음이 이루어져요. 옛날 옛적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한아비’라고 하는 분들은, 숲을 생각하고 푸른 빛깔을 생각하며, 보금자리를 생각했어요. 온누리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하며, 사람과 이웃할 작은 새들 둥지를 생각했어요. 자, 모두 눈을 살며시 감고 생각을 기울여요. 내 생각에 따라 새롭게 태어날 어여쁘며 밝고 싱그러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96쪽
2011년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란 책을 써내고 나서 늘 아쉽다고 여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바르게 쓰든 살려서 쓰든, 이러한 이야기는 어린이하고 푸름이만 배울 일이 아니지 싶었습니다. 어른하고 어버이가 함께 배울 적에 제대로 어우러지고, 어린이하고 푸름이가 앞으로 어른이나 어버이가 될 적에도 배움길을 즐겁게 꾸준히 이을 수 있는 틀이 서야 아름답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푸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 그대로 푸른 나이라서 푸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린이’는 익히 알려졌듯이 일제강점기에 방정환 님이 지었습니다. ‘푸름이’는 1980년대에 참교육을 바라거나 꾀하는 젊은 교사들 손에서 조용히 태어난 이름입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이 있기는 했으나 막상 나라에서 청소년을 제대로 헤아리는 길을 가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 나이에 있는 열넷∼열아홉 푸른 넋이, 이름에서 곧바로 ‘우리는 오늘 푸르게 살고 배우고 자란다’는 꿈이나 사랑을 스스림없이, 또 쉽게, 또 부드럽게, 또 누구나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새로 지은 이름입니다.
어느 모로 보면 굳이 ‘푸름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하느냐고 물을 만합니다. 이오덕 어른을 비롯한 분들은 ‘국민학교’란 이름에서 ‘국민’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우두머리를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군홧발로 억지로 지어 퍼뜨린 낱말이니, 이 찌꺼기를 털어야 한다고, ‘어린이학교’나 ‘어린이배움터’ 같은 이름으로 고쳐야 알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란, 그냥 붙이는 말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이름이란, 늘 말하고 들으면서 그 말씨에 깃든 숨결을 마음으로 헤아리니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 ‘푸름이’란 이름을 조용히 지어서 잔물결처럼 퍼뜨린 분들도 그런 뜻이었다고 느껴요. 다만 이 말씨는 ‘어린이’만큼 퍼지지 못했어도 ‘푸른문학’이나 ‘푸른책’ 같은 말을 쓰는 곳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이 대목에서 말이란 참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삶을 바꾸려는 첫길에서 말부터 바꾸거든요. 말을 바꾸지 않고서는 삶을 좀처럼 못 바꾸는 셈이라고 할 만해요.
이 나라에 컴퓨터라는 물건이 처음 들어오던 무렵, 이 컴퓨터를 다루던 젊은 일꾼은 ‘셈틀’이라는 낱말을 새로 지었어요. ‘틀’은 기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뜀틀이나 재봉틀이나 베틀 같은 자리에 쓰지요. 빨래하는 기계는 ‘빨래틀’이 되고요. ‘셈+틀’이라는 얼거리로 컴퓨터에 새 이름을 붙인 까닭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숫자 세기(이진법)’ 때문이에요. 컴퓨터는 이진법 숫자로 모든 것을 읽거든요. 그래서 셈틀이에요. 둘째는 ‘셈(세다)’이라는 낱말은 ‘생각(생각하다·헤아리다)’에서 비롯했기 때문이에요. “숫자 셈”으로 움직이는 컴퓨터이지만, 마치 사람 머리처럼 “생각하는 몸짓”이 되어서 새로운 누리로 우리를 이어 준다는 뜻에서 ‘셈틀(생각틀·슬기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79∼80쪽
저는 1994년부터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글을 쓸 적에 ‘새롬데이타맨 프로’라는 풀그림을 씁니다. 1994년 무렵 이른바 피시통신을 하도록 잇는 풀그림이 있는데, 그 풀그림에 곁딸린 문서편집기를 써요. 오늘날 눈으로 보자면 퍽 낡은 풀그림이고, 문서편집기 말고는 어디에도 써먹지 못한다고 할 텐데, 스물 몇 해를 묵은 이 오래된 풀그림에 곁딸린 문서편집기를 다루다 보면, ‘컴퓨터-피시통신-인터넷 살림’이 이 땅에 갓 퍼지거나 뿌리내릴 무렵 어떤 낱말을 써야 사람들이 더 쉽고 즐겁게 다가설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기울이던 젊은 일꾼 땀방울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셈틀’이란 이름은 1990년대 첫무렵 젊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머리를 맞대어 지었다지요. 짧고 굵고 쉬우면서 깊은 뜻을 담은 이름을 지으려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여럿이 우리말을 엄청나게 새로 배웠다고 합니다. 사전도 샅샅이 읽고 이곳저곳에 끊임없이 묻고 되물었대요. ‘셈틀 = 세다 + 생각 + 슬기’를 담은 이름이라지요. ‘풀그림’은 ‘프로그램’을 걸러낸(또는 풀어낸) 낱말인데, “풀어서 그려낸 것, 또는 풀어 쓰면서 새로운 것을 그리도록 돕는 연장”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는 ‘즐겨찾기, 갈무리, 붙여넣기, 불러오기, 끼워넣기, 잘라내기’ 같은 낱말을 대수롭지 않게 씁니다만, 처음에는 모두 영어였어요. 이 영어를 국립국어원 공무원도 국어학자도 아닌 프로그램 개발자가 서로 모여 하나하나 새로 엮고 지어서 선보였으며, 피시통신에서 제안을 꾸준히 받기도 하면서 가다듬었어요.
‘약손’이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어서 이 어린이한테 ‘약손’이 무엇인가 하고 풀이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요새는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면 쉽게 병원에 가지요. 예전처럼 할머니나 어머니가 포근하게 사랑으로 쓰다듬는 손길보다는 병원 치료가 먼저이다 보니 ‘약손’이란 이름을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요. ‘약손’이란 이름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만, 이 말이 낯선 어린이가 말뜻뿐 아니라 말에 얽힌 삶을 따스히 헤아려 주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랑손’하고 ‘포근손’이란 말을 지어서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네 어머니가 우리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얼른 나으렴 하고 바라는 ‘사랑손’이랍니다. 우리 몸에서 아픈 데를 사랑이 어린 손으로 살살 쓰다듬으면 어느새 그 아픈 데가 따뜻해져요.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도록 하는 손이기에 ‘포근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2014년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이란 책을 썼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전남 고흥이란 시골로 옮겨서 사는데, 시골에서 만나는 어린이마다 ‘빨리 이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놀랐습니다. 마음도 아팠어요. 푸름이도 매한가지였어요. 시골 어린이가 시골이란 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포근한 사랑으로 스스로 읽고 새롭게 배우며 가슴으로 고이 품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고서 생각을 찬찬히 가다듬어 2017년에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이란 책을 썼지요. 오늘날은 시골보다 도시 인구가 훨씬 많고, 도시 독자가 훨씬 많아요. 도시에 사는 이웃님이 ‘도시가 아름다운 숲이 있는 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주 물으셨어요. 그 실마리를 말 한 마디에서 풀도록 이끌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삶터는 시골하고 도시로 다르겠지만, 마음은 언제 어디에서나 숲일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대로 생각이 자라서 말이 될 테니, 서로 어깨동무하는 길을, 말길을 트고 만나면 아름답겠다고 여겼습니다.
주고받는 말이기에 ‘이야기’입니다. 한켠으로 쏠리는 말이 아닌, 주고받는 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보다는 ‘이야기꽃’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서 써 봅니다. ‘글쓰기’란 수수한 이름도 좋으나 ‘글꽃’을 피워 보자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모두 꽃길을 걸으면 즐거울 테니 ‘꽃살림’을 가꾸어 보자는 얘기를, ‘꽃어른’이 되고 ‘꽃아이’가 되어 보자는 말을, 이러면서 ‘꽃책(꽃다운 책)’을 읽고, ‘책꽃잔치(북페스티벌)’를 열어 보자는 말을 넌지시 해봅니다.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