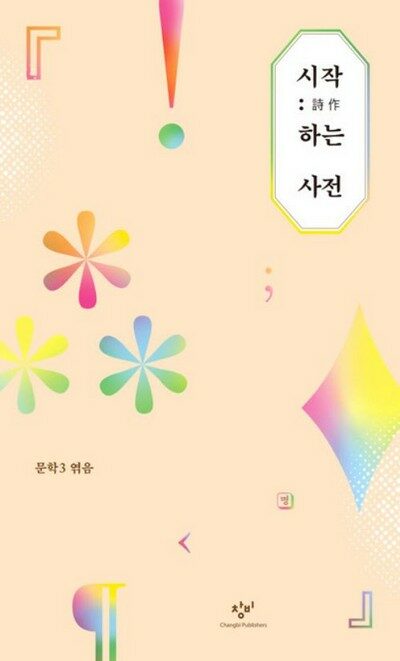-

-
시작하는 사전
문학3 엮음 / 창비 / 2020년 12월
평점 : 


까칠읽기 . 숲노래 책읽기 / 인문책시렁 2024.5.31.
까칠읽기 10
《시작하는 사전》
문학3 엮음
창비
2020.12.4.
《시작詩作하는 사전》을 여민 뜻은 훌륭하다고 느끼지만, 알맹이는 뜻밖에 너무 허술해서 놀랐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글을 쓰면 다 다르게 이야기를 담아내야 맞는데, 이 책에 실린 글은 마치 ‘한 사람’이 쓴 듯싶더라.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에,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말해야 맞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장마다 사투리가 달랐고, 고을마다 또 사투리가 달랐고, 마을마다 다시 사투리가 달랐으며, 집집마다 사투리가 달랐는데, 한집에서 엄마아빠랑 아이들 사투리가 새삼스레 달랐다.
전라북도 사람과 전라남도 사람이 같은 사투리를 쓰겠는가? 터무니없다. 대구사람과 부산사람이 같은 사투리를 쓸까? 말도 안 된다. 인천 남구와 중구와 동구와 북구와 서구 사람이 같은 인천말을 쓸까? 아니다. 인천 남구 숭의동과 용현동과 주안동과 도화동도 인천말이 다른데, 도화1동과 도화2동과 도화3동도 말씨가 다르다.
왜 사투리는 이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마을이 다르고, 모든 골목이 다르며, 모든 들숲바다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작詩作하는 사전》은 왜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쓴 글 같을까?
요사이는 ‘글바치(문인·작가)’가 거의 서울에 몰려서 산다. 그리고 웬만한 글바치는 ‘잿집(아파트)’에 산다. 서울 아닌 곳에 살아도 ‘서울바라기’를 하고, ‘서울로(in Seoul)’를 꿈꾼다. 이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서울글바치도 부산글바치도 글이 비슷하거나 같다. 오늘날에는 광주글바치도 대전글바치도 글이 닮거나 같다.
모처럼 뜻깊에 “노래를 짓는 꾸러미”를 엮기로 했다면 ‘한 사람’ 같은 글이 아니라, ‘다 다른 목소리와 숨결과 살림과 사랑’을 담아내야 어울릴 텐데, 엮은이도 글쓴이도 이 대목을 놓치거나 볼 마음이 없거나 대수롭잖게 넘겼다고 느낀다. 안타깝고 안쓰럽고 아프다.
ㅅㄴㄹ
나뭇가지 : 하늘에 피어난 산호珊瑚. (37쪽)
노래 : 잊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 (45쪽)
아침 :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공간을 후비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129쪽)
예배禮拜 : 눈을 뜨면 사라지는 믿음. (139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