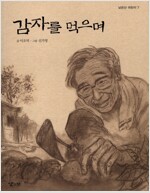아이들한테 시를 읽힐 때에
문학이 태어났을 적에 어른이 써서 어른이 즐길 뿐이었습니다. 어른이 써서 아이한테 들려주는 문학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 백 해 사이에 비로소 어린이문학이 새롭게 태어나 아이들이 읽을 문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린이문학이 따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작 아이들한테 삶을 보여주거나 밝히는 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낱말을 이쁘장하게 엮는 문학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이 만든 제도권 사회 울타리에서 시름시름 앓거나 괴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학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빛이 될 문학은 너무 드물고, 아이들이 스스로 빛을 찾아나서도록 돕는 문학도 너무 드뭅니다.
어린이문학은 아이들만 읽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 누구나 누리는 문학이 어린이문학입니다. 아이들과 읽을 시와 동화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이문학이라는 이름이 아닌 옛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흐르던 ‘말’은 아이와 어른이 한 자리에 앉아서 누렸어요. 콩쥐와 팥쥐 이야기이든, 풀개구리 이야기이든, 해와 달 이야기이든, 언제나 아이와 어른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즐겼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던 어른은 으레 중국글로 어른문학만 했지만, 중국글을 모르고 훈민정음조차 모르던 시골사람은 입에서 입으로 물려주는 ‘말’로 ‘이야기’를 지어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문학을 하는 ‘새로운 젊은 작가’들이 내놓는 작품을 보면, 으레 ‘이쁘장한 동시’이거나 ‘학교생활 동화’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젊은 작가들은 좀처럼 ‘삶글’을 못 씁니다. ‘삶빛’을 밝히려 하지 못합니다. 알맹이를 담는 이야기가 아니라, 껍데기를 꾸미는 문학일 뿐입니다. 지난날에는 지식인과 권력자가 중국글로 문학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한글(훈민정음)’을 쓰기는 하지만 아직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동시(시)를 읽어 주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 동시집을 장만해서 먼저 읽는데, 좀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이끌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원수, 권정생, 이문구, 윤동주, 이오덕, 임길택, 백석, 권태응 같은 님들이 빚은 이야기는 무척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랑스럽습니다. 이 어른들은 언제나 노래를 불렀고, 이 어른들이 부른 노래는 언제나 삶말입니다.
왜 오늘날 ‘새로운 젊은 작가’는 삶말을 빚지 못할까요. 왜 오늘날 책마을에서는 삶책을 펴내려 하지 않을까요. ‘말을 갖고 노는 시’가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시’를 쓰기가 어려울까요. 아이한테 들려주면서 즐거울 시란, 어른끼리 주고받을 적에도 즐거울 시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겁게 웃고 노래할 수 있는 시일 때에 비로소 ‘문학’이라는 이름하고도 걸맞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환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밝게 맞아들일 만한 말을 입으로 읊고 싶습니다. 4347.6.23.달.ㅎㄲㅅㄱ
(최종규 . 2014 - 어린이문학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