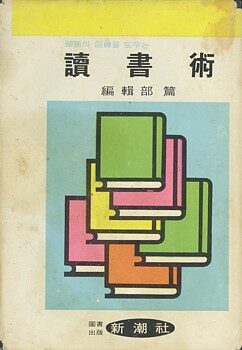책을 말하는 책이 없는 나라
― 해적판, 《두뇌의 회전을 도우는 독서술》
- 책이름 : 두뇌의 회전을 도우는 독서술
- 글쓴이 : ?
- 펴낸곳 : 신조사 (1972.8.15.)
책을 말하는 책이 요즘 들어 퍽 많이 나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고 할까나,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나, 그동안 거의 없던 ‘책을 말하는 책’이 나오는 까닭은 좀 얄궂다고, 꽤 알쏭달쏭하다고 생각합니다.
.. 읽는 책의 선택과 읽지 않는 책의 선택은 표리의 관계가 있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 책을 읽는다. 그밖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도, 책을 읽지 않는 연구의 첫발이고 기본인 셈입니다 .. (116쪽)
요즈막에 쏟아지는 ‘책을 말하는 책’은 ‘우리들이 읽을 만한 책’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 이야기한다거나 ‘깊이’ 이야기한다고는 느끼기 힘듭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 뜻과 생각과 마음에 맞게 ‘다 다르게 반갑게 맞이할 만한 책나라’를 열어젖히는 이야기까지 나아가지도 못한다고 느낍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읽을 책이 있다면 ‘읽을 수 없는 책’이 있는데, 읽을 수 있는 책과 읽을 수 없는 책을 제대로 나누어 말하지 않거든요. 아니, 못한다고 할까요.
‘책을 말하는 책’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라면, 요즈음 들어 참으로 수많은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책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큰 책방에도 제대로 꽂히지 못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에도 제대로 못 알려진 채 사라지는 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나온 ‘책을 말하는 책’들은 ‘반갑게 나왔으나 빛을 못 보는 책’은 거의 다루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안 다룬다고 해야 맞습니다. 굳이 ‘책을 말하는 책’에서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책, 굳이 이런 책에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훤히 아는 책밖에 못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책을 말하는 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새로 나오는 책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될 테고, 한 주면 수백 가지에서 천 가지, 한 달이면 만 가지가 넘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바지런히 읽어서 날마다 두 권씩 읽는다 해도 한 달 동안 100권 읽기 어렵습니다. 한 해에 1000권 읽기란 참 까마득합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책만 읽고 살아갈 수는 없는 터.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책 가운데 ‘저마다 다 달리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골고루 알맞을 책’이나 ‘저마다 다 달리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따로따로 반가울 책’은 어떻게 가려야 좋을까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 눈길과 눈높이를 추슬러야 하지만, 눈길과 눈높이는 어떻게 추슬러 나가야 좋을까요.
‘책을 말하는 책’은 이런 이야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읽으면 좋은 책’과 ‘읽어야 할 책’만 아니라 ‘읽지 않아도 되는 책’과 ‘읽을 까닭이 없는 책’과 ‘읽어서 시간만 버리는 책’을 저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고 이끌 수 있어야 좋아요.
.. 옛날 사람뿐 아니라 지금의 독서가라도, 이를테면 아랑은 “되풀이 읽을 수가 없는 소설이라면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는 다시 일보 전진하여 “무릇 책을 읽는데 노으트를 할 필요는 없다. 노으트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만한 일이라면, 잊어버리는 편이 위생적이다.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일부러 종이에 적을 것까지도 없다”고 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 “늦게 읽어라” 하는 것은 “고전을 읽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또 반대로 “고전을 읽어라” 하는 것은 “늦게(천천히) 읽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지요 .. (53∼55쪽)
《두뇌의 회전을 도우는 독서술》이라는 책이 1972년에 나왔습니다. 얼핏얼핏 ‘일본책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 있지만, 군데군데 ‘한국사람이 썼구나’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글쓴이를 밝히지 않고 ‘편집부’라고만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책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은지, 책이란 우리 삶에 무엇이며, 책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가꿀 수 있는지를 참 단출하고 알뜰히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책이 나온 지 서른다섯 해가 지난 2007년이지만, 아직까지 이만큼 제 눈을 밝혀 주는 ‘책을 말하는 나라안 책’은 눈에 안 뜨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제가 못 알아보았다고 해야 옳고, 못 찾았다고 해야 올바르겠지요. 참말, 내 눈이 더없이 얕고, 내 마음이 그지없이 좁은 터라, 좋은 책을 좋은 눈썰미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야 맞겠지요. (4340.2.7.물.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