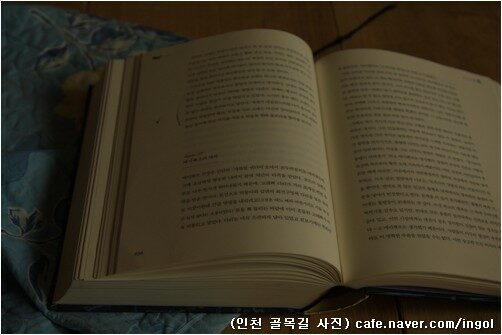
영화로 가는 길과 책으로 가는 길
― 좋은 영화와 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탈리아 영화 〈길(라 스트라다)〉을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바드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나라 안팎 좋은 영화를 집에 앉아 내리 여러 편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든 비디오로 보든 디브이디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아주 손쉽게 옛날 영화부터 요즈음 영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쉰여섯 해를 묵은 영화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봅니다. 퍽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식구로서는 극장마실을 할 수 없는 터라, 집에서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대목이 몹시 고맙습니다. 더구나, 비디오나 디브이디를 갖고 있으면 한 번 보고 나서 가슴이 젖어든 영화를 잇달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커다란 화면으로 자잘한 곳까지 눈여겨보는 맛하고 견줄 수 없습니다만, 집에서 여러 차례 볼 때에는 극장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오줌 마려운 아이한테 오줌을 누이느라 살짝 멈추었다가 다시 보아도 되고, 배고픈 아이한테 밥을 차려 주며 밥을 먹이는 가운데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세 편을 보고 나서 소설 《모비딕》을 펼칩니다. 《모비딕》을 손에 쥔 지 석 달째입니다. 아직 이 책 하나를 다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휙 읽어치울 수 있습니다만, 허먼 멜빌이라는 분이 한 땀 두 땀 이루어 낸 결을 헤아리면서 찬찬히 읽습니다.
다른 책을 읽다가 ‘《모비딕》이야말로 문학이란 이름이 어울린다’는 대목을 곧잘 만납니다. 우리 옆지기 또한 《모비딕》만 한 소설이 아니라면 읽을 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앞서 새로운 번역으로 나온 《모비딕》인데, 언제가 될는지 모르나 이 책을 헌책방에서 영어판으로 찾아내어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번역이 아주 나쁘지는 않으나 책을 읽는 사이사이 턱턱 막힌다거나 그리 알맞아 보이지 않는 대목이 눈에 뜨이기 때문입니다. 못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비딕》이 훌륭한 문학이라 한다면, 훌륭한 문학에 걸맞을 훌륭한 번역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젓겠습니다. 괜찮은 번역이지만 훌륭한 번역문학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할 테지만, 번역을 할 때에도 번역쟁이 한 사람이 창작을 하던 글쟁이 한 사람만큼 품과 땀과 시간과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에서 번역쟁이한테 좀더 긴 시간을 좀더 나은 일삯을 내주어 문학 하나를 아름다이 꽃피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면, 허먼 멜빌 《모비딕》 새로운 번역은 이름만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이름으로도 ‘아름다운’ 번역이거나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돈을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더 넉넉히 일삯을 챙기지 못하는 한편, 번역할 시간을 넉넉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번역을 내놓을 때에 ‘새 번역’이라느니 ‘완역’이라느니 하는 이름만 붙이는데, 정작 어느 새로운 완전번역 작품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번역이라는 이름이나 ‘훌륭한’ 번역이라는 이름은 못 붙입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모비딕》을 우리 말로 옮기려 한다면 적어도 다섯 해쯤은 시간을 주어야 하며, 웬만하면 열 해쯤은 시간을 주되 오로지 이 하나에만 온힘을 쏟도록 할 노릇이라고 느낍니다. 낱말 하나 글월 하나 말투 하나 짜임새 하나 촘촘하면서 너르게 보듬는 옹근 번역이 되도록 북돋우자면 책 하나 섣불리 내놓지 말 노릇이라고 봅니다.
1954년 이탈리아 영화 〈길〉을 보고 나서 세 식구는 잠자리에 듭니다. 고단하고 졸립고 힘들어, 누운 채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 영화 모두 훌륭하기는 훌륭한데, 이 가운데 100번을 내리 볼 영화를 고르라면 아무래도 〈길〉을 꼽겠다는 말을 나눕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님은 〈길〉이라는 영화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슬프며 아름다운 길을 여러 갈래에서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슬픈 길이든 즐거운 길이든 어두운 길이든 밝은 길이든 저 멀디먼 구름 같은 나라에만 있지 않음을 수수하게 보여줍니다. 딱히 밑바닥 사람들 삶을 보여주지 않고, 굳이 잘난 사람들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예 사람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걷는 길을 보여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자리가 될 때마다 보느라 네 번 본 장이모 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슬프며 아름다운 길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굳이 어떤 장치를 쓰거나 따로 무언가 꾸며서 내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람들과 삶자락과 보금자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스스로 우러나오는 뭉클함을 보듬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디 먼 남쪽나라이든 북쪽나라이든 밖에서만 길을 찾다가는 길이고 뭐고 볼 수 없음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좋은 영화 세 가지를 하루 만에 보고 나서 날마다 야금야금 읽고 있는 《모비딕》을 바닥에 펼쳐 놓고 야금야금 읽는 동안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문학 《모비딕》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작품이라 할 때에는 이 문학 하나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여러 갈래로 보여주되 따로 무슨 장치를 하거나 딱히 어떤 꾸밈거리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복닥이고 있는 결을 글쓴이부터 고스란히 껴안는 한편 깊이 삭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웃고 우는 삶을 글쓴이부터 스스럼없이 맞아들이는 한편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따로 미움이라 이름붙일 수 없는 삶을 바라봅니다. 굳이 기쁨이라 이름붙이지 않아도 될 삶을 들여다봅니다. 좋은 영화이든 좋은 문학이든 바로 우리 곁에서 이야기를 얻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좋은 영화나 좋은 문학이 나오는 샘터는 바로 우리 가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든 〈바그다드 카페〉이든 〈집으로 가는 길〉이든 《모비딕》이든, 참 쉬운 영화이고 쉬운 책입니다. 참 아무것 아닌 영화이고 아무것 아닌 책입니다. 참 흔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며 문학입니다. 참 가볍게 일군 영화이자 문학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영화나 책(문학)이란 영화쟁이나 문학쟁이가 당신 삶을 차곡차곡 바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일굴 수 있습니다. 품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세월을 들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영화와 책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여든여덟 나이를 꾸리는 그림할머님을 뵈었습니다. 그림할머님은 “나도 다섯 살이었고, 나도 열다섯 살이었는데, 이제는 여든여덟이라우.” 하면서 “내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면 돈이 바라는 대로 따르며 살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따르며 살았다우.”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림할머님을 낳아 키운 박두성이라는 어른은 일제강점기에 ‘앞 못 보는 사람’한테 빛이 되고자 한글로 된 점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림할머님은 당신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손과 팔과 허리가 아프도록 송곳으로 꾹꾹 누르며 점글책을 만들어 앞 못 보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일을 함께하셨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숨을 거두고 당신 남편 또한 저승사람이 된 뒤에는 당신이 당신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 집에 ‘평안 수채화의 집’이라는 새 문패를 세우고는 아흔이 코앞인 나이에도 신나게 그림을 그리며 이웃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든여덟이라는 길에서 당신이 걸어온 이야기와 삶이란 어느 하나 돈 될 구석이 없는데, 여든여덟 해에 걸쳐 밥을 굶지 않았을 뿐더러 둘레에 밥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림할머님 당신으로서는 돈이 아닌 믿음을 섬기고 사랑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하나를 찍으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사랑받거나 팔리는가를 헤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만큼 사랑받거나 웬만큼 팔리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000만이 보는 영화가 될 수 있고 500만이 본 영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010년에 1000만이 본 영화를 2020년에는 몇 사람이나 다시 볼 만할까요. 2050년에는 몇 사람이나 다시 볼까요. 2100년을 맞이할 때에는 2010년에 1000만이 본 영화를 몇 사람이나 좋아하며 챙겨 볼는지요.
2010년 오늘 100만 권이 팔리거나 10만 권이 팔리는 책이라고 하면 이 책에는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이 붙은 책은 역사에도 남아 길이길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놓고 ‘가슴시린’ 문학이라 하거나 ‘아름다운’ 문학이라 하거나 ‘훌륭한’ 문학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야 알맞으리라 봅니다. 많이 팔린 책이 훌륭한 책이지는 않으니까요. 훌륭한 책이면서 많이 팔릴 수 있으나, 훌륭한 책이기에 많이 안 팔리기도 하며, 많이 팔리지 않으려는 훌륭한 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책이란 돈을 바라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책이란 처음부터 사랑과 믿음을 섬기고 아낍니다. 훌륭한 책 하나를 빚고자 땀흘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문 열 사람이 사서 읽어 주기’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책 하나가 얼마나 내 한 사람이 고운 한 사람으로서 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뿌리를 캘 뿐입니다.
영화로 가는 길이란 책으로 가는 길하고 같으면서 다릅니다. 영화나 책으로 가는 길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길하고 같으면서 다릅니다. 농사짓는 길하고 같으면서 다른 영화길과 책길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뜻을 담으면 어떠한 영화이든 아름다울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넋을 실으면 어떠한 책이든 훌륭할밖에 없으며, 사람을 아끼는 얼을 깃들이면 어떠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참될밖에 없습니다. 영화쟁이이기 앞서 참사랑 나누는 수수한 한 사람이어야 하고, 책쟁이이기 앞서 참믿음 펼치는 조촐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살림을 꾸리든 돈벌이를 하든 참마음 고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343.5.25.불.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