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힌두교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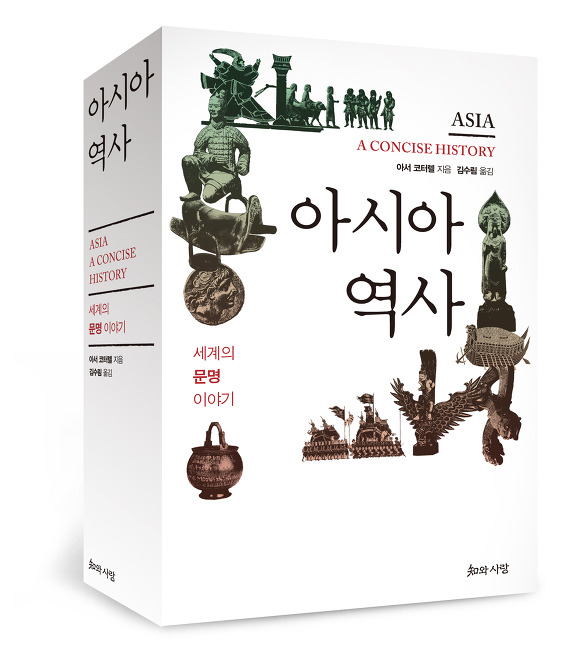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보살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쿠샨의 비문이 마투라Mathura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니슈카의 개인적인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당시는 대승불교의 사상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의 보살의 강조와 대승불교의 부흥은 불교의 성인 나가르주나의 사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의 일이었다. 나가르주나의 사상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야, 서방정토 붓다인 아미타불Amithbha, 미래불인 미륵Maitreya, 그리고 자비의 신 관세음보살Avalokitesvara의 존재가 완벽하게 정립되었다. 아미타불・미륵・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에서 붓다는 아니지만 여러 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위대한 반신半神으로 추앙받았다. 나가르주나는 관세음보살이 남자・여자 혹은 동물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 덕에 관세음보살이 중국의 자비의 신 관음으로 변신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중국 동진東晋의 승려 법현은 자신이 목격한 대승불교 반신들의 기념행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불교의 여러 반신들을 태운 정교하게 꾸며진 의식용 마차를 한 무리의 가수・음악가・승려들이 에워싸고 시가를 행진했다고 한다. 힌두교사찰의 행사용 운송수단과 마찬가지로 이 마차는 그 높이가 웬만한 건물 5층 높이에 이를 정도로 높아서, 도시를 대표하는 거대한 건축물이나 성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이 마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불교와 힌두교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불교 내에서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학자들 간에 피 튀기는 논쟁이 한창이었다. 갈등의 골이 어찌나 깊었던지 붓다가 살아 있었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였다. 나가르주나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붓다의 가르침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나가르주나는 절묘한 논리로
불교의 모든 종파의 사상적 오류를 지적해갔다. 나가르주나 자신의 논리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다는 무생無生의 논리를 폈다. 감각의 소용돌이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유한 형태를 가진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현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관계에 존립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가르주나는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여야만 궁극의 진리에 대한 직관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만이 붓다가 중생에게 전하고자 했던 심오한 가르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감을 품은 몇몇 사람이 그의 ‘무無’에 대한 사상 때문에 불교계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고 나가르주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나가르주나는 그들이 ‘무’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붓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물을 통한 매일의 경험에 대한 진리와 이 명백한 현실 이면에 모든 것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 심오한 두 가지 진리를 깨우친 불자만이 꿈과 같은 매일의 삶에서 해방되어 붓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