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리아 왕조의 왕들은 매우 다양한 종교적 기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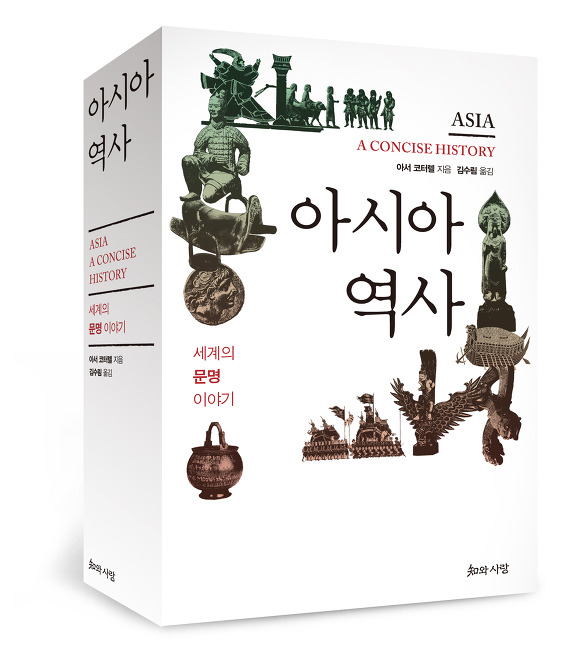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마우리아 왕조의 왕들은 매우 다양한 종교적 기호를 보였다. 찬드라굽타는 자이나교에 심취했지만 아들 빈두사라는 사명외도교의 결정론을 마음에 들어 했다. 사명외도교는 자이나교의 이단적인 한 분파로, 인간은 84,000번의 윤회를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드라굽타의 손자 아소카는 세계 최초의 불교도 군주였다. 기원전 270년 빈두사라 왕의 사후에 왕위계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을 제치고 아소카가 왕위를 거머쥐었다. 그는 기원전 261년경 인도 동부 오리사Orissa 지역에서 카링가 왕국을 정복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정복욕 때문에 일어난 전례 없는 유혈사태로 인한 참상에 심적 충격을 받은 아소카는 마우리아 왕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한 전쟁에 회의를 느꼈다. 번민 끝에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집권 내내 내면의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를 열성적으로 지지했으며, 그 후로는 전쟁이 아닌 ‘법을 통한 정복’을 지향했다. 아소카의 전격적인 포교활동 덕에 불교는 붓다가 세상을 떠난 지 250년 만에 범아시아적인 종교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불교에서 전파하는 붓다의 가르침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왕들이 몇몇 존재했다. 하지만 붓다가 설파한 삶의 원리를 조직적인 방식으로 전파하려 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붓다는 이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불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왕위에 오른 이들은 아소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붓다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소카는 자신의 영토 도처에 불법을 설파하는 칙령을 새긴 암석 또는 석주를 세우게 했다. 그 칙령에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의 지배를 받는 왕국의 영토가 아직 넓지 않아 불법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지 못했도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거대한 돌기둥 표면에 새겨져 있는 이 칙령은 아람어로부터 그리스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언어들로 적혀 있다. 특히 이 두 언어로 적힌 비문은 1958년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칸다하르Kandahar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의 손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아대륙에 정착시킨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데칸 고원 북쪽의 고대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언어는 프라크리트Prakrit어였다. 마하비라와 붓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아리아인의 언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했던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는 브라만 계급의 전용언어였다. 브라만이 남긴 종교적인 문헌들이 산스크리트어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독교 시대가 열리기 직전의 시기에 인도 아대륙 북부의 불교도들에 의해 산스크리트어가 재조명되었다. 이들은 프라크리트어로 기록된 문헌들을 찾아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를 이용한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다. 이는 브라만교가 불교와 융합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굽타 왕조 시절에 브라만교와 불교를 융합한 힌두교가 왕가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굽타 왕조에서 인도 고유의 불교형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종교 융합이라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브라만은 붓다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다. 이 시기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붓다의 온전한 가르침은 이후 원시불교의 내용을 복원한 대승불교에 의해서 다시 부흥된다. 사무드라굽타가 재위했던 4세기까지의 기간에 힌두교가 불교를 대체하는 과정을 지켜본 중국인 순례자 법현法顯이 남긴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