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는 자이나교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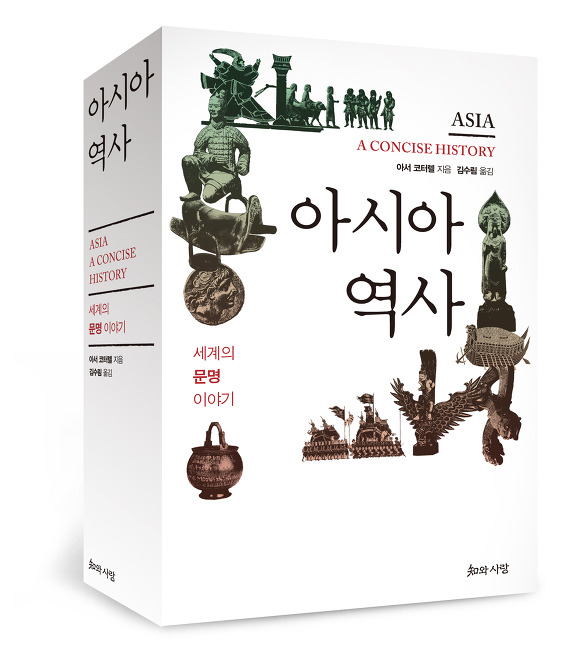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이처럼 제국의 정치적 지형이 급변하던 시절 인도의 종교 또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자이나교와 불교가 엄청난 기세로 그 세를 늘려갔다. 백성들만이 두 종교에 의탁한 것은 아니었다. 찬드라굽타도 자이나교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그는 끔찍한 기근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기원전 298년에 아들 빈두사라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퇴위 후 인도 남부로 향한 찬드라굽타는 그곳에서 자이나교의 은둔자가 된다. 마이소르 주(현재의 명칭은 카르나타카 주)에 위치한 자이나교의 유적지 스라바나 벨골라Sravana Belgola에는 찬드라굽타의 말년에 관한 내용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출가하여 성지 스라바나 벨골라에서 고행을 하며 금식하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수많은 나라들이 난립해 있던 광대한 영토를 한 손아귀에 움켜쥔 최고권력자였지만, 혜성같이 등장한 낮은 계층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찬드라굽타는 고대 인도의 정국에서는 매우 새로운 존재였다. 이같이 차별화되는 출신 덕에 그가 자이나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이나교는 당시의 불교에 비하면 상당히 꾸밈없는 것을 지향하는 종교였다. 자이나교의 이상은 개인의 생존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탈인간적이고 추상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자이나교의 교리에 따르면 금욕생활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세의 고통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자이나교와 불교 둘 다 아리아인의 문화에서 비롯된 종교는 아니었다. 물론 인도인의 장례문화와 브라만이 지독히도 싫어했던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아리아인 고위 성직자들은 마가다 왕국 곳곳에 생겨난 둥그런 무덤을 “악마에 홀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혹평했다. 그들은 사각형만이 신이 좋아하는 형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둥그런 형태의 무덤과 사리탑은 불교도가 있는 모든 지역에 속속 생겨났다. 힌두교도와 달리 불교도는 이런 시설물을 종교적 헌신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브라만의 반발은 금욕사상에 대한 그들의 경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브라만은 엄격한 금욕생활을 했던 자이나교 승려들의 삶에 엄청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요가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인도의 금욕주의가 매우 오래된 사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가 자세를 한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인더스 인장만으로는 이런 금욕사상이 고대 인도의 토착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이나교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최초로 금욕사상을 펼친 종교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붓다와 동시대인이
었던 자이나교의 성인 마하비라는 네 단계의 명상을 거치는 동안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업보를 없애고 해탈했다고 한다. 자이나교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혼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혼은 이동을 멈추고 고요히 정지해 있게 되며,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육신과 영혼이 완벽한 정지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때서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자이나교의 참선을 통한 해탈의 개념이 인도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마하바라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하바라타』에는 참선을 하는 수도자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미동도 없이 놓인 돌과 같이 고요해야 한다. 기둥과 같은 미세한 떨림도 없어야 하며 산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완벽한 정지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붓다는 이러한 자이나교의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는 욕망이나 의도를 인간의 중요한 속성으로 여겼다. 자이나교승려들이 금욕을 통해 정신과 신체를 억압하는 것과 달리, 불교승려들이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 욕망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도들의 목표는 속세의 온갖 복잡다단한 문제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는 것이었다. 해탈을 얻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실제로 작용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들어낸 이면의 동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자이나교의 이론가들은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두고 불교의 윤회개념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불교도가 아이를 구워먹는 사례를 들먹이며 불교의 이론적 오류를 밝혀내려고 했다. 자이나교의 이론가들은 불교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이를 구워 먹었다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빈정거렸다. 이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이나교도는 영혼이 물질에 구속된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영계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 물질계를 떠나 우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야만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또한 자이나교승려들은 살생을 금기시했다. 그들은 우연히 벌레를 삼켜 업을 쌓는 일을 막기 위해 베일로 입을 가리고 다니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