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발미키가 『라마야나』를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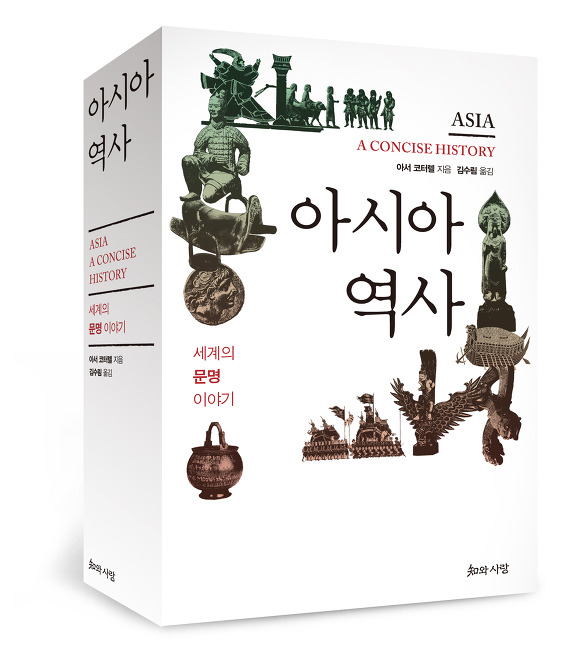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고대 그리스와 인도에 구전되던 신화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었다. 두 사회의 이야기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얻은 경험에 맞게 공유한 신화를 각색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발을 붙인 땅이 다르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라마야나』의 중반부는 아유타야Ayudhaya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리아드』의 내용처럼 미케네 왕이 실제로 연합군을 조직하여 그리스 함대를 트로이까지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리아드』에서 미케네 왕 아가멤논의 리더십은 신들의 갈등에 가려 그 빛을 발할 기회가 없다. 『일리아드』에서 미의 여신 자리를 놓고 다투다 등을 돌린 여신들과 이에 가세한 신들이 옥신각신하며 편을 가른다. 어떤 신은 트로이 편을 들고 어떤 신은 그리스 편을 드는 식이다. 물론 『일리아드』에서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스파르타의 왕비이자 최고의 미녀 헬레네이다.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야반도주를 한 탓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태풍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멋대로인 여인도 왕비이기 이전에 여신이었다. 전지전능한 최고신 제우스의 딸인 헬레네는 알에서 부화한 나무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는 유괴범과 그녀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구조대원들을 추종자로 거느리고 있었다.
『라마야나』와 『일리아드』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 유괴된 여인들, 헬레네와 시타의 신성이다. 『라마야나』에서 라마는 랑카 섬에 있는 마왕 라바나의 근거지를 악전고투 끝에 함락한 후에야 아내 시타와 재회하게 된다. 하지만 외간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난 아내 헬레네 왕비를 기꺼이 용서한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와 달리 라마는 외간남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인다는 것이 영 꺼림칙했다. 고민 끝에 라마는 시타를 내쳤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시타는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대지에 안겨 대지의 균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라마는 강으로 몸을 숨겨 그녀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물은 비슈누의 여덟 번째 요소로, 비슈누의 여덟 번째 분신인 라마 자신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라마는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크리슈나보다 더 신성한 존재로 받들어진다. 『라마야나』에는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가 환생한 이유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바로 ‘절규하는 자’란 뜻의 이름을 지닌 마왕 라바나를 무찌르기 위해서이다. 고행과 헌신을 보여 창조신 브라마의 환심을 산 라바나는 신들은 물론 악마들마저 대적할 수 없는 불사신이 되어버렸다. 만물을 수호하는 신 비슈누의 개입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사상은 상당히 보기 드문 생각이다. 인더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신들마저 무릎 꿇릴 수 있는 성선聖仙이나 보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라바나의 마음속에서 라마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다. 정기적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세상의 악을 정화하고 떠나는 비슈누의 권능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무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었다. 성선의 막강한 힘은 인드라 신이 모욕당한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드라는 성선 고타마의 아내를 유혹했다. 불장난에 대한 대가는 컸다. 분노한 고타마가 인드라의 고환을 잘라버린 것이다. 신들이 후에 인드라에게 숫양의 고환을 대신 달아주긴 했지만, 이는 두고두고 인드라의 굴욕의 상징으로 남았다. 인도-유럽어족의 신들 가운데서 이런 가혹한 처사를 견뎌야 했던 건 인드라가 유일무이했다.
시인 발미키가 그전부터 존재해왔던 구전자료를 바탕으로 『라마야나』를 집필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애초부터 종교적 관점에서 이 대서사시를 집필하려 했던 것 같다. 이 서사시는 비슈누의 환생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환생을 통해 비슈누가 전지전능한 힘을 얻으려는 악마들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시바와 달리 비슈누에게서는 불길하거나 위험한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없다. 구세주가 되어야 마땅한 완벽한 자질을 지닌 신인 것이다. 비슈누는 매우 다양한 화신으로 환생한다. 심지어는 불교의 신 붓다로 환생하여 속세에 강림하기도 한다. “다양한 변설로 악마들을 꼬여내어 악마와 악인을 파멸시켰던” 신묘
한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 붓다로 말이다. 힌두교신앙에 반불교적인 태도가 스며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비슈누를 섬기던 이들에게 붓다의 비폭력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슈누를 섬기는 힌두교도들은 이 ‘악인의 파괴자’ 붓다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지고신 비슈누가 동물을 제물로 삼는 것을 금한 연유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살생을 금하는 사상은 상당히 색다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