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주나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적을 향해 화살을 네 대 연달아 쏘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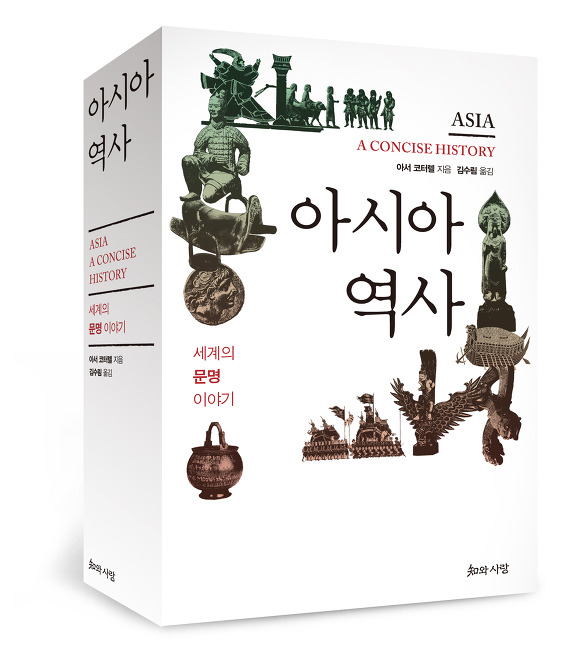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크리슈나는 내면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왕자의 정신적 지주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능숙한 전차병이었던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는 아르주나가 크리파와 벌인 전투에 대한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 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도 대적하기 힘든 막강한 상대를 만난 아르주나에게는 전차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
그때 아르주나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적을 향해 화살을 네 대 연달아 쏘았다. 금빛 깃털을 휘날리며 날아간 화살의 날카로운 촉이 불타는 뱀처럼 크리파의 말 네 마리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말들의 비명이 전장에 울려 퍼졌고 크리파의 전차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제대로 땅에 발을 딛지 못하는 크리파를 보고 있자니 적일지언정 그 순간 그를 덮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아르주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비록 수많은 적군의 영웅들을 이미 살육했을지라도 말이다. 크리파의 위엄을 지켜주고자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이내 균형을 회복한 크리파는 백로 깃털이 달린 화살 열 대를 아르주나를 향해 쏘았다. 하지만 명궁 아르주나가 단 한 대의 화살로 크리파의 활을 반동강 냈고, 크리파는 활을 놓치고 말았다. 곧이어 아르주나가 쏜 화살이 크리파가 입은 갑옷의 취약한 부위에 명중했다. 크리파의 가슴을 덮고 있던 갑옷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러나 크리파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갑옷이 벗겨진 크리파는 흡사 허물을 벗은 뱀처럼 보였다. 크리파는 다시 활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활도 세 번째 활도 아르주나가 쏜 화살 때문에 연거푸 놓치고 말았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은 크리파는 거대한 장창을 움켜쥐었다. 맹렬한 기세로 집어던진 장창이 낙뢰가 떨어지듯 아르주나를 덮쳤다. 아르주나가 황급히 쏘아올린 화살은 이 거대한 장창마저 산산조각내 버렸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크리파는 다시 활을 잡고 열 대의 화살을 아르주나에게 날렸고 아르주나도 불을 뿜을 듯한 기세로 열세 대의 화살을 쏘아 반격에 나섰다. 첫 번째 화살이 멍에를 박살낸 것을 시작으로 네 대의 화살이 전차를 끌던 말들의 명줄을 끊어놓았다. 여섯 번째 화살에 전차병의 목이 달아났고, 세 대의 화살이 연이어 전차를 지탱하는 네 개의 대나무 기둥에 박혔다. 차축에는 두 대의 화살이 날아와 박혔고 열두 번째 화살이 크리파의 전차를 장식한 삼각기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벽력 같은 기세로 바람을 가른 열세 번째 화살의 날카로운 촉이 마침내 정통으로 크리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은 것은 부러진 활과 넝마가 된 전차, 그리고 죽어 널브러진 말들뿐이었다. 안간힘을 써 몸을 일으킨 크리파는 아르주나를 향해 징이 잔뜩 박힌 곤봉을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르주나의 신들린 화살이 날아오는 곤봉에 명중한 것이다.
크리파의 부하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이 결투는 아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군을 지키기로 작심한 크리파의 보병들이 비 오듯 화살을 쏘아대며 접근하여 아직 분이 식지 않은 크리파를 전장에서 끌어냈다. 애매모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리파는 인도 서사시의 대표적인 영웅이자 전사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사실 크리파가
위와 같은 명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건 크리파가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 아르주나의 아량 덕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르주나는 충분히 적을 해할 수 있었음에도 적병들이 부상당한 크리파를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그는 크리파의 명예를 존중했으며, 그 덕에 크리파는 살아남아 다시 전투에 임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아리아인의 무용담을 담은 대서사시로는 『마하바라타』 외에도 『라마야Ramayana』가 있다. 『라마야나』는 『마하바라타』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서사시이다. 『마하바라타』가 여러 차례의 수정・증보를 거친 문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라마야나』의 탄생은 기원전 3세기경 인도의 전설적인 시인 발미키의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미키는 구전되던 음유시가들을 모아 『라마야나』를 집대
성했다.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란 대작을 남긴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호메로스의 작품세계와 인도 대서사시를 비교하는 학문적 연구가 많다. 그 중에서도 초기 산스크리트 문학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라마야나』와 『일리아드』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다. 특히 『라마야나』에서 주인공 라마(코살라 왕국의 왕자)가 납치된 아내 시타를 구하기 위해 현재의 실론 섬인 랑카 섬으로 원정을 떠나는 대목이 주로 원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