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족이 인더스 문명과 교류한 증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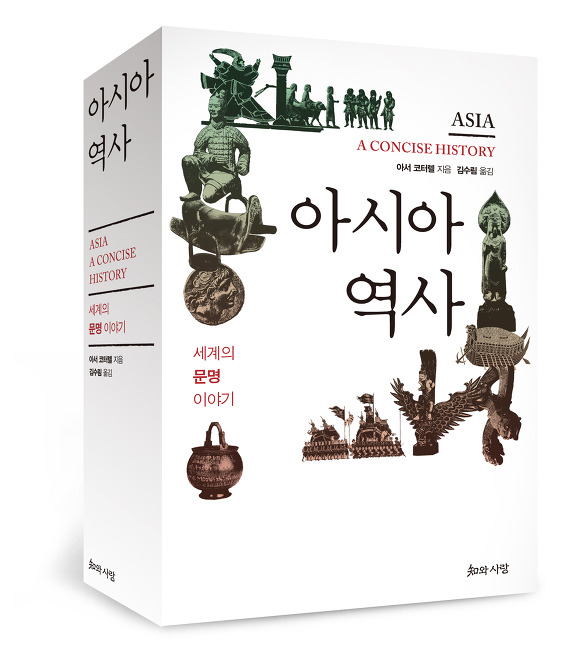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각양각색의 물품이 로톨 항구를 거쳐 갔다. 목재・금・준보석, 심지어 상아까지 수출되었고, 채색도자기는 수입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인기품목이었다. 이 도자기들은 인더스 계곡 상인들의 군락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지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기원전 2200년경에 새겨진 한 비문에는 멜루하Meluhha라는 도시로부터 오는 무역선에 투자한 한 메소포타미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셈족이 인더스 문명과 교류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카드 몰락 이후 수메르 문명이 짧은 기간에 다시 한 번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상교역로의 종착 도시가 인더스 강 하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인더스 계곡 사람들이 멜루하와 교역하던 시기이며, 이 교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우르에 거주하는 수메르인 상인들이었다. 강 하구에서 가장 각광받은 수출입항은 바레인Bahrain이었을 것이다. 비록 바레인에 인더스 계곡의 상인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바레인 섬에는 당시 딜민이라는 독립 무역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더스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의 교역을 가능하게 했던 해상교역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강의 흐름이 바뀐 탓일 수도 있고, 교역의 중심축이었던 도시가 엄청난 홍수에 빈번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인더스 강의 다른 지류들처럼 강물이다 말라버리고 강줄기가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해버린 것 때문일 수도 있다. 모헨조다로에서도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자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흔적, 즉 찬란한 문명을 펼친 이 도시의 인구가 점차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자연에 과도하게 손을 댄 것이 화를 불렀을 수도 있다. 나무를 과도하게 벌채하고 도시를 잔디로 덮어버린 탓에 홍수에 대응할 수 없게 된 인재였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고대 아시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구가했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750년경에 돌연 붕괴했다. 인더스 문명의 붕괴는 북부 펀자브 지역의 하라파와 남쪽 신드 지역의 모헨조다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하라파의 도시 잔해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둥지를 틀었다. 그들은 건물 잔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벽돌을 이용하여 다시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유적의 바로 다음 지층에서 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도시 또한 극적인 최후를 맞았음이 틀림없다.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거리에 널려 있는 유골들도 의미심장하긴 마찬가지다.
이 한 많은 영혼들을 해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리아인이다. 펀자브 지역에 있던 하라파Harappa(하리유피야Hariyupipya라고도 함)에서 이미 도시를 불태우고 압승을 거둔 전적이 있는 아리아인은 이 모헨조다로를 침략했을 것이다. 『리그 베다』에는 아리안 침략자들이 펀자브 지역을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신드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이 좀 더 오래 그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펀자브 지역에 머무르며 남쪽의 상황도 훤히 꿰뚫게 된 아리아인은 모헨조다로를 불시에 급습하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아리아인의 출현으로 고대 남아시아에서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도시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