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두 번째 문명: 인더스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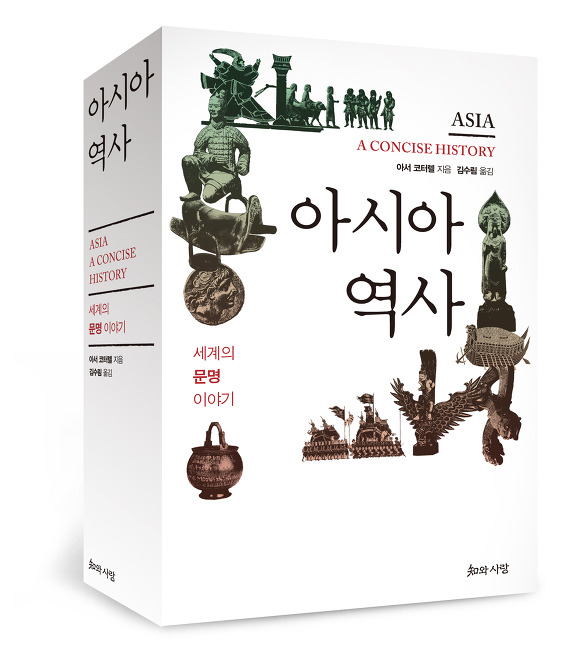
1921년에 펀자브의 작은 마을 하라파에서, 그리고 1922년에는 인더스 강 하류 신드의 모헨조다로에서 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지금껏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유적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존재한 도시의 자취였다. 첫 발굴 이후로 일명 ‘인더스 문명’이라 불리는 인도 아대륙 최고문명의 수혜를 받은 촌락터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가 천여 개에 이를 정도였다. 놀라운 사실은 이 촌락들이 일률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된 거주지구라는 사실이었다. 북쪽에 위치한 촌락이건 남쪽에 위치한 촌락이건 촌락터에는 기가 막힌 질서가 존재했다.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 촌락지구의 발견은 대제국, 아니면 적어도 국가연합의 존재를 제시하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촌락들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촌락의 분포만으로도 아시아 3대 문명의 발상지,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더스 문명・황허 문명 중에서 가장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그 차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해볼 때 한층 확연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계곡의 면적은 약 65,000km2인 데 반해, 인더스 계곡의 면적은 무려1,200,000km2에 달했다. 중국의 상나라가 지배했던 지역은 인더스 문명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현대의 중국은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다른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도시를 기반으로 한 수메르인과 달리 인더스 계곡의 거주자들 대부분이 도시 관할 하의 촌락에 살았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하라파 거주 인구는 약 40,000명이었고 모헨조다로의 거주 인구는 약 30,000명이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들과 그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더스 계곡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중앙집권세력이 거주하는 중심부 촌락이 중심에 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촌락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반면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의 거주지들은 다른 거주지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중국의 황허 문명과 달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고도로 발달된 아시아의 두 번째 문명은 기원전2400~1800년까지 고작 6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모헨조다로에서 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기원전 2350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동부지역에 거대한 시가지가 생겨났는데, 이 동부지역 전체를 요새화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간다. 또 서쪽에는 진흙과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성채도 건설했다. 남쪽은 높이 3m, 북쪽은 높이 6m에 이르는 이 성채에 쓰인 진흙 벽돌 덕에 이곳 사람들은 홍수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인더스 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보리나 밀, 각종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의 선물에는 대가가 따랐다. 강변에 위치한 촌락은 홍수를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구운 진흙벽돌의 발명으로 진흙을 이용해 건설한 벽과 기반은 몰라보게 튼튼해졌다. 인더스 강변에 위치한 모헨조다로의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현재 모헨조다로 유적지에는 성채가 있는 ‘고지대’와 시민들의 주거지가 있는 ‘저지대’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구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이 고대도시가 건설되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