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재는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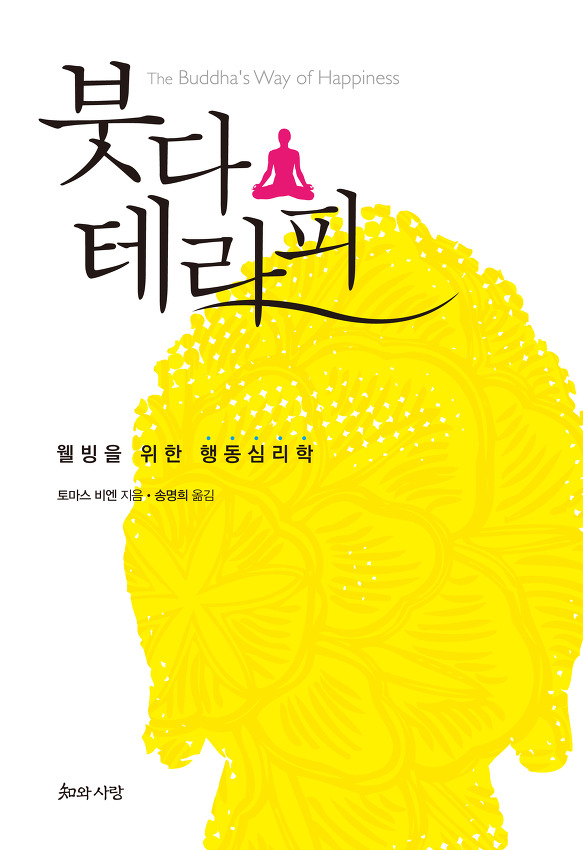
죽음에 대한 간단한 개념으로 시작해보자. 유물론자는 죽음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죽음을 환생이란 측면에서 생각해서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개념들은 너무 단순하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우리 부모나 조상 속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형태들로 살고 있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나는 많은 형태들로 지속된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환생을 문자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불교에서 공śūnyatā이라고 부르는 경이로운 생성의 실재(색色)이다. 한계가 없는 것에 한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과 환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극단적인 시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물질과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변화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문자 그대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음은 끝이지만 단순한 끝이 아니다. 실재는 존재bhava 또는 비존재abhava로 구분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상견常見(sassata, 만물이 실제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 또는 단견斷見(uccheda,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 공무空無로 돌아간다는 그릇된 견해)으로 나눌 만큼 간단하지도 않다. 실재는 그 중간에 있다. 커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맛을 설명하는 것처럼 실재가 무엇인지 말로는 정확 히 표현하지 못한다. 실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을 떠나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분리된 자아로 존재한다는 착각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죽음이 다가올 때 고통을 겪게 된다. 반대로 우리를 삶 그 자체와 동일시한다면 지금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인이었던 아나타핀디카Anathapindika는 오랫동안 붓다와 붓다의 일행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죽을 때 큰 고통에 몸부림쳤다. 붓다는 그를 돕기 위해 수행이 높은 제자 사리푸트라Shariputra와 아난다Ananda를 보냈다. 이들은 아나타핀디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에게 여러 가지 명상법을 가르쳐주었다. 이 명상법은 육체적 자아와의 전면적인 탈동일시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명상으로 아나타핀디카는 크게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무아, 대선사의 죽음 또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리 자신의 통찰이 요구된다. 다음은 아나타핀디카에게 도움이 된 명상법의 일종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수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