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이튼스쿨에 다니던 시절에 프랑스어를 배웠다. 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준 교사는 오웰의 문학에 큰 영향을 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다. 이때 헉슬리의 나이는 스물네 살이었다. 그러나 헉슬리는 눈이 너무 좋지 않았다. 10대 때부터 걸린 각막염으로 인해 시력이 반쯤 상실된 상태였다. 그의 시력 장애는 이튼스쿨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오웰은 헉슬리 선생을 잘 따랐다. 그는 헉슬리 선생에게서 프랑스 문학 작품들을 접했고, 가끔 그와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오웰은 헉슬리에게 프랑스어를 잘 배운 덕분에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 스테판 말테르 《조지 오웰, 시대의 작가로 산다는 것》 (제3의공간, 2017)
오웰은 인도 제국 경찰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와 일 년간 지내다가 파리로 건너갔다. 1928년 초에 그는 가난한 노동자와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살아온 경험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작품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을 쓰게 됐다. 오웰이 파리에 정착하는 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모 넬리 리무진(Nellie Limouzin)이다. 넬리는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영국에서 만들어진 점진적 사회주의) 협회에 소속된 회원이었고,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살롱의 주인이기도 했다. 오웰 평전인 《조지 오웰, 시대의 작가로 산다는 것》 (제3의공간)은 오웰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아주 상사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책에 넬리의 살롱에 드나든 유명 인사들이 누군지 언급된 내용도 있다.
페미니스트이자 페이비언협회 회원인 넬리는 자신의 집을 작가들의 살롱으로 제공했다. [중략] 그러나 불행히도, 에릭은 역시 이 살롱에 드나드는 신랄한 논조로 유명한 G. K. 체스터턴(G. K. Chesterton)이나, 공포 이야기와 공상과학 소설가 P. M. 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우상인 웰스와는 마주친 적이 없었다. (67~68쪽)
그런데 내가 인용한 문장에 오류가 있다. 이 문장의 오류는 ‘공상과학 소설가 P. M. 실’이다. 작가 이름이 잘못 적혀 있는데, 오류라기보다는 ‘오식’에 가깝다. 퍼스트 네임과 미들 네임의 순서가 잘못 적혀 있다. ‘P. M. 실’이 아니라 ‘M. P. 실’이다. 사족이지만 P와 M, 그리고 실(Shiel)의 첫 글자인 S가 합쳐지면 ‘PMS’가 된다. PMS는 월경 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의 약자이다.
넬리의 살롱에 드나든 G. K. 체스터턴과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는 각각 추리소설가(대표작: 브라운 신부 시리즈), 《타임머신》과 《투명 인간》을 쓴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M. P. 실은 어떤 사람인가? 실은 체스터턴과 웰스의 인지도에 비해 한참 못 미치지만, 장르문학의 역사를 논할 때 한 번쯤은 언급되는(언급되어야 할) 작가다.

풀 네임은 매튜 핍스 실(Matthew Phipps Shiel)이다. 카리브 해에 있는 영국령 몬세라트(Montserrat) 섬에 태어났고, 주로 미스터리물이나 공상과학소설을 썼다. 생전에 실의 작품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실은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실이 죽고 난 후에 극소수의 미스터리 마니아와 장르문학 작가들이 그의 작품을 재평가했다.


* M. P. 실 《The Purple Cloud》 (Penguin Group USA, 2012)
* H. P. 러브크래프트 《공포 문학의 매혹》 (북스피어, 2012)
실의 대표작은 1901년에 발표된 <The Purple Cloud>이다. ‘자줏빛 구름’ 또는 ‘보랏빛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작품에 지구가 파괴되어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래서 <The Purple Cloud>는 포스트 아포칼립스(post-apocalypse: 세계 종말 이후의 상황을 그리는 SF문학의 한 하위 장르)의 서막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Howard Phillips Lovecraft)는 공포 문학 작품들을 비평한 자신의 글《공포 문학의 매혹》(북스피어)에서 <The Purple Cloud>의 작품성을 호평했으나 이 작품의 종반부가 아쉽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곁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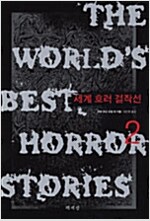


* 안길환 엮음 《영국의 괴담》 (명문당, 2000)
* 정진영 엮음 《세계 호러 걸작선 2》 (책세상, 2004)
*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세계 추리소설 걸작선 2》 (한스미디어, 2013)
* [e-Book] 매튜 핍스 실 《오번 가문의 비극》 (한스미디어, 2014)
실은 스무 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남겼지만, 국내에 소개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총 세 편인데, 나는 이 작품들을 엘러리 퀸(Ellery Queen)이 썼던 평가 방식처럼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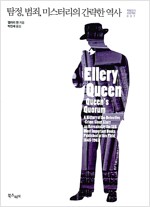
* 엘러리 퀸 《탐정, 범죄, 미스터리의 간략한 역사》 (북스피어, 2016)
‘엘러리 퀸이 썼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가 탐정소설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 기준을 말한다. 첫 번째 기준은 ‘역사적 중요성(Historical Significance)’이다. 작품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품이 문학적으로 우수한지(Quality)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판본의 희소가치(Rarity)다. 내 글에서 사용된 ‘R’은 초판본이 아닌 ‘번역본’의 희소가치를 뜻한다. 퀸은 탐정소설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뜻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HQR’로 표시했다. 나는 여기에 네 번째 기준을 추가했다. ‘번역되지 않은(Untranslated) 작품’일 경우 ‘U’를 표시했다.
1. 지상에서 못 이룬 사랑
The Tale of Henry and Rowena (1928)
R

《영국의 괴담》 (명문당)에 수록된 작품이다. 자신이 사랑한 귀부인에 집착하는 한센병 환자 귀족에 대한 이야기다. 귀부인은 저주의 병(20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센병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었다)에 걸린 귀족에 연민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만, 귀부인에 향한 귀족의 사랑은 간절하다기보다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발악에 가깝다. 번역이 영 좋지 않다. 이 작품만 번역에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괴담》에 수록된 전 작품 모두 번역이 좋지 않다. 2000년에 나온 책인데,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다. 문장 한 개에 들어 있는 한자어가 한글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역자가 한자어를 너무 많이 썼다. 거기에 편집자는 아주 친절하게 한자어 옆에 한문까지 같이 써주셨다…‥. 동양고전을 전문적으로 펴낸 출판사라서 한자를 많이 썼던 것일까? 한자어가 너무 많은 문장은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귀족의 이름은 ‘헨리(Henry)’인데 번역본에는 ‘덴리’로 되어 있다.
2. 제루샤
Xélucha (1896)
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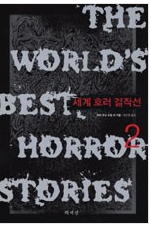
러브크래프트는 이 작품을 ‘독기 어리고 소름 끼치는 단편’이라고 평가했다. 소설 제목인 ‘제루샤’는 ‘악마 같은 여성’으로 묘사된 인물의 이름이다. 『제루샤』는 세기말에 유행했던 병적이고, 반도덕적이고, 퇴폐적인 문화 양식, 즉 데카당스(décadence)풍 감수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메리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비제(Georges Bizet)의 오페라 《카르멘》의 원작자로 유명한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erimee)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3. 오번 가문의 비극
The Race of Orven (1895)
HRU (엘러리 퀸의 평점은 HQR)

실은 아마추어 탐정이 등장하는 탐정소설 네 편을 썼다. ‘잘레스키 왕자(Prince Zaleski)’가 미궁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오번 가문의 비극』, 『에드먼즈버러 승려의 돌(The Stone of the Edmundsbury Monks)』, 『The S.S』는 실이 살아있을 때 발표한 ‘잘레스키 왕자’ 시리즈다. 그러나 이 작품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 [절판] 김봉석, 장경현, 윤영천 《탐정 사전》 (프로파간다, 2014)
잘레스키 왕자는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가 창조한 아마추어 탐정 오귀스트 뒤팽(Auguste Dupin)과 흡사하다. 두 사람 모두 앞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력이 있으나 신분이 몰락한 상태가 되었고, 세상과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도락가로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잘레스키는 골동품을, 뒤팽은 책을 수집한다. 실과 포의 탐정소설에 나오는 화자의 역할도 비슷하다. 작품 속 화자는 탐정에게 미궁의 사건을 들려준다. 이야기를 들은 탐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논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그렇다 보니 뒤팽과 잘레스키는 종종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그들은 너무 진지하게 현학적인 발언을 하는데 대부분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철학적인 내용이다.
『오번 가문의 비극』은 ‘잘레스키 왕자 시리즈’에 속한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번역된 작품이다. 그래서 1895년에 『오번 가문의 비극』과 함께 발표된 나머지 두 작품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U’를 표시했다. 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알려진 『The Return of Prince Zaleski』도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다. 이 소설은 1945년에 쓰였으나 실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한동안 잊히고 말았다. 다행히 실과 공동으로 집필 작업을 했던 존 고스워스(John Gawsworth)가 이 작품의 원고를 엘러리 퀸에게 보내게 되면서, 잊힐 뻔했던 ‘잘레스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오번 가문의 비극』이 수록된 《세계 추리소설 걸작선 2》 (한스미디어)의 작품 해설에 오류가 있다.
『Prince Zaleski: three detective stories』(1895)에는 잘레스키가 활약하는 「오번 가문의 비극」과 「에드먼즈버리 승려의 돌」 「The SS」「The Return of Prince Zaleski」로 네 편의 단편이 실렸다.
(해설, 658족)
『Prince Zaleski: three detective stories』의 부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책에는 세 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해설을 쓴 글쓴이는 이 단편집에 「The Return of Prince Zaleski」이 실려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단편집에 네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면 ‘three detective stories’라는 부제가 삭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The Return of Prince Zaleski」는 실 사후에 나온 단편 선집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소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