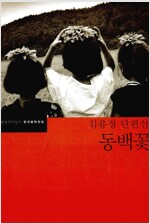
"김유정의 단편집은 문학과 지정사 뿐이네요?"
"네 사람들이 그 출판사 책을 제일 많이 찾아요"
사무실 지하의 작은 서점에서 - 5% 밖에 할인을 안해주는, 하지만 그래야만 그 남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나눈 대화인다. 1908년에 태어나 1937년에 세상을 떠난 30년이 채 안되는 시간을 겨우 보낸 김유정의 단편집을 손에 들었다.
주석이 50페이지에 달했다. 작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많은 강원도 방언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주석만 50여페이지였다. 해설 또한 30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초반에 책을 무척 읽기 힘들었다. 방언이 문제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때의 말들도 많았다. 길지 않은 23편의 단편은 구분해서 기억하기 힘들었다.농촌과 개화기의 힘든 삶의 이야기들. 레이먼드 카버 (Raymond Carver)의 단편이 생각나기도했다.

해설처럼, 삶의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태우듯이 그는 무수한 단편들을 쏟아냈다. 그 짧은 생 동안의 제재로 써내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단편들을.

나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Gabriel García Márquez)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보고, 두 민족은 한국과 중남미의 저항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현실을 처절하고 처량하게 수용하는 공톰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문학은 그 어쩔 수 없는 수용을 이해하고 수용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한 내면의 고통과 인내 슬픔 등을 표현하는.
김유정의 단편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의 이항대립을 해체, 세계 인식에 양가성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p450 해설 중
연모하는 남자가 있으면서도 몸을 상품화하는 사람.
남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열녀로 자신의 정조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사람.
제 논의 벼를 훔쳐 먹는 소작인, 살기 위해 제 다리를 자해하는 광부 등은 모두 양가성의 수용인 것 같다.
김유정은 이런 양가적 수용을 "삶의 현장성과 역동성"으로 "해학과 토속성"으로 그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