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아십니까?] 프레시안, 2010년 10월 1일 (링크)
2010년 10월 첫날. 이 한 편의 글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독자들은 영원히 속을 뻔했다. 금태섭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프레시안’에 서평을 게재했다. 한 권의 책을 칭찬의 미사여구로 치장하는 주례사 서평은 아니었다. 여러 권의 책의 번역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었다. 그중에 가장 화제가 된 내용이 《우울과 몽상》(약칭 ‘우몽’) 번역 비판이었다. 이 책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선집으로 출간된 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서점에 판매되고 있다. 대표작을 포함한 포의 단편소설 58편을 한 권에 모은 장점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지만, 성의 없는 번역 때문에 포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 사이에서 ‘최악의 책’으로 낙인찍혔다. 금태섭은 ‘모르그 가의 살인 사건’에 내용 일부가 빠진 사실을 지적했다. 이 글이 공개된 이후로 ‘모르그 가의 살인 사건’ 번역 누락은 《우몽》의 대표적 오역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 말고도 《우몽》에 오역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더 있다. 금태섭은 ‘책을 던져버리고 싶었을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우몽》 번역에 대한 금태섭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 문장만 봐도 충분히 느껴진다. (놀랍게도 이 책을 추천하는 유명인들이 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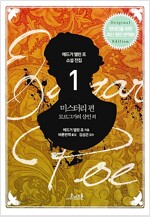

나 또한 똑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지난주에 《우몽》과 코너스톤 출판사의 ‘포 소설 전집’을 같이 읽어보고 있다. 올해 선보인 포 소설 전집을 향한 독자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번역이 어떤지 궁금했다. 출판 번역 전문 기업인 ‘바른번역’이 포 소설 전집 번역을 맡았다. 한 작품에 여러 명의 번역가가 참여하는 ‘집단번역’을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책의 옳고 그름을 분별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집단번역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다. 책을 읽는 방식은 이렇다. 《우몽》과 코너스톤 번역본을 같이 읽는다. 두 권을 책을 읽다가 의미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문장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원문을 대조해본다. 소설 원문은 포의 공식 사이트 ‘The Edgar Allan Poe Society of Baltimore’(http://www.eapo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포 소설은 원문으로 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역시 《우몽》은 한마디로 번역이 ‘개판’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題詞)를 삭제했고, 원문의 의미와 상반되는 의역을 감행했다. 또한, 인명이나 지역명 같은 외래어 고유명사를 잘못 쓰기도 했다.
최근 《우몽》을 읽으면서 발견한 가장 어이없는 오역을 하나 알려주겠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난다. 내가 여태까지 사소한 오역 때문에 이야기의 결말을 잘못 알고 있었다. 다음 문장은 ‘함정과 진자(Pit And The Pendulum)’ 원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There was a discordant hum of human voices! There was a loud blast as of many trumpets! There was a harsh grating as of a thousand thunders! The fiery walls rushed back! An outstretched arm caught my own as I fell, fainting, into the abyss. It was that of General Lasalle. The French army had entered Toledo. The Inquisition was in the hands of its enemies.
엄청난 군중의 떠들썩하고 수선스런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트럼펫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소리도 들렸다. 수천 개의 천둥이 한 번에 몰아치는 듯한, 거친 쇠창살이 삐꺽거리는 굉음도 들렸다. 공포의 벽이 물러나고 있었다! 정신을 잃고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나를 붙들어 준 팔이 있었다. 라살레 장군이었다. 프랑스 군대가 톨레도에 입성한 것이다! 종교 재판소는 이제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포 소설 전집 2 : 공포 편》 ‘함정과 진자’ 중에서, 209쪽)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트럼펫 합주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렸다! 수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불타는 벽은 뒤로 물러갔다! 기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자 어떤 손이 나를 붙잡았다. (《우몽》 ‘저승과 진자’ 중에서, 749쪽)
‘Inquisition(종교 재판)’을 제외하면 나 같은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문장이다. 《우몽》의 역자는 라살레 장군이 지휘한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 종교 재판소를 점령했다는 문장을 번역하지 않았다. ‘함정과 진자’는 거대한 고문 기구의 위협 속에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일품이다. 주인공은 운 좋게 공포의 방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주인공을 구해준 ‘어떤 손’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처음에 《우몽》의 번역으로 읽었을 때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결말이 생뚱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 그 생각은 틀렸다. 오역으로 인해 생긴 오해였다. 원문과 다른 번역본을 같이 읽고 나서야 ‘진짜 결말’을 알았다. 번역자에게 농락당한 느낌이 들었다.
코너스톤 번역본의 장점은 가격이 싸고, 들고 다니기 좋은 판형이다. 출판사는 책의 앞표지에 ‘현대인을 위한 최신 원전 완역본’이라고 소개했다. ‘원전 번역’을 최고로 여기는 독자들의 취향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코너스톤 번역본에 대체로 만족하는 독자 서평이 상당히 많다. 《우몽》과 비교하면 가독성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독자님들아, 또 속나!)
《우몽》 발번역자도 하지 않는 오역을 저질렀다. 다음 원문은 ‘모르그가의 살인(The Murders in the Rue Morgue)’의 오귀스트 뒤팽이 친구(화자)의 생각을 추리하는 장면에서 인용했다.
Here your countenance brightened up, and, perceiving your lips move, I could not doubt that you murmured to yourself the word ‘stereotomic.’ You continued the same inaudible murmur, with a knit brow, as is the custom of a man tasking his memory, until I considered that you sought the Greek derivation of the work ‘stereotomy.’ I knew that you could not find this without being brought to think of atomies, and thus of the theories of Epicurus.
여기에서 자네 표정이 밝아졌고 이런 종류의 도로포장을 일컫는 용어인 ‘스테레오토미’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것을 자네의 입 모양으로 읽어 알아냈어. 스테레오토미(stereotomy)를 떠올리다가 해골(atomies)을 연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에피쿠로스의 학설로 생각이 흘러간 거지. (《포 소설 전집 1 : 미스터리 편》 ‘모르그가의 살인’ 중에서, 18~19쪽)
‘stereotomy’는 돌을 특정 모양으로 절단하는 건축기술이다. ‘atomy’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원자와 해골. 뒤팽은 돌을 절단하는 기술에서 원자를 연상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는 과정을 반복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atom) 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한 철학자가 에피쿠로스다. 그러므로 ‘atomies’를 ‘해골’이 아닌 ‘원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다른 포 소설 번역본들도 ‘atomies’를 '원자'로 번역했다.
코너스톤 번역본은 역주가 적은 편이다. 포는 자신이 관심 있는 철학이나 고대 지식을 소재로 소설을 썼고, 사상가의 문장을 많이 인용한다. 그래서 포의 소설은 생각보다 어렵다. 아무리 가독성 좋은 번역이라고 해도,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설명 하나 없이 넘어가는 건 무성의하다. 심지어 ‘마리 로제 미스터리(The Mystery of Marie Rogêt)’에 포가 쓴 원주(소설의 집필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마저 빠뜨렸다.
현재 《우몽》 추리 편과 공포 편, 코너스톤 포 소설 전집 1권(미스터리 편), 2권(공포 편)을 다 읽었다. 책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우몽》은 불태워버리고 싶고, 코너스톤 번역본은 던져버리고 싶다.”
일반적으로 포의 소설을 ‘무서운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독자들이 원전을 축약하고, 무서운 장면을 더 강조한 우리나라 번역에 익숙해진 탓이다.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라.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포의 문장은 대체로 길고, 라틴어나 고어를 자주 사용한다. 원문으로 읽어 보면 포의 작품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번역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독자들은 무시무시한 ‘검은 고양이’나 추리소설의 원조 격인 ‘모르그가의 살인’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요즘 들어 포의 소설 번역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느새 포도 헤르만 헤세처럼 국내에서 많이 번역된 작품의 작가가 되었다. 이러한 독자의 과분한 관심(?)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나쁜 출판업자는 불량스러운 책을 만들어낸다. 독자를 기만하는 엉터리 책의 양산에 번역자의 책임도 있다.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번역자가 명작을 손대는 순간, ‘망작’이 된다. 이런 책을 만날 때마다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금태섭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