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에 대한 일시적인 동경(?)
고등학생,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이었을 때, 잠시나마 논술고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동경(?)을 가진 적이 있다.
그 때 당시만해도 나에게 '논술'이란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글쓰기 행위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이 방과 후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논술고사 특별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는 내신성적이 있어야하며 수능 모의고사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1,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명문대 SKY를 목표로 둔 성적 최상위권자들만이 배울 수 있었다. 필자는 그런 친구들이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살짝 열등감이 느꼈던 적도 있었다.
그 때 필자의 내신성적은 전교 2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중위권만 맴도는 수준이었으며 수능 모의고사 시험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등급이 언어영역 4등급뿐이었다.
필자는 논술고사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가 항상 보는 EBS 논술고사 문제집을 본 적이 있었다. 살짝 훑어봤는데 몇 몇 출제문 중에는 내가 읽었던 책에서 인용된 것만 눈에 띄었을 뿐, 문제 유형은 무척 어렵게 느껴졌다. 그 이후로 논술고사는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풀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동경은 자기합리적인 위안 덕분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성적 상위권자들은 학교 교과서와 문제집은 친할 수 있었지 책과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한 채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생소한 내용의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대고 해답을 써내야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딱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비록 수능성적은 완전 '개판'이었지만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논술고사
현재는 대학생이라서 요즘 수험생들의 학습 수준을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예전과 다르게 중상위권 학생들도 얼마든지 논술고사를 통해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있지않나 생각해본다.
안 그래도 수능시험의 난이도 수준이 점점 평이화되고 있는 마당에 대학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성적의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출제되는 논술고사의 결과가 수험생들의 대입 전형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 논술고사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시험문제를 어렵게 낼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논술 교사들마저도 대입 전형 논술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논술 교사들 “솔직히 나도 문제 이해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2011년 11월 18일
인용한 관련기사에 언급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출제된 논술고사 인용문의 내용과 문제를 보면 수험생 그리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
테일러리즘은 경영 조직 부문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며 복지 예산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지학과라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배우는 것들이다. 그런데 평생 학교 교과서 속 내용만 암기해왔던 수험생들 그리고 자신의 담당 과목만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교사에게는 논술고사에 출제되는 인용문들이 낯설어 하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일간지에는 특정 요일마다 소개되는 특별 기사, 일명 섹션이 부록으로 딸려 있다. 그 중에 대부분 일간지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섹션이 있다.
간혹 신문을 보게 되면 그런 특별 기사까지도 보게 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 가끔은 대학교에서 만든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출제문을 게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논술고사 교육 전문가의 답변도 같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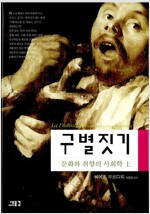

한 번은 모 대학교에서 출제한 모의 논술고사 인용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심지어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중의 문장을 인용하여 출제문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모의' 논술고사 문제였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었다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출제문에서부터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푸코와 들뢰즈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논술고사, 이대로 유지한다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문제의 난이도는 어려워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교육 체계와는 한참 괴리된 대학원생 수준의 문제를 낸다면 논술고사의 참된 교육 목적과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수험생들은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논리고사를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고액의 과외료를 기꺼이 지불해가면서 대치동 학원가의 논술강사에게 배울 것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로 인한 사교육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여울의 지적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소양을 배양시키기보다는 '해답'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획일적인 방식의 시험이 되고 말았다.
엄청난 양과 시간을 입시교육에 쏟아붓는 수험생들에게는 독서 행위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즉,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필독도서 목록이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 수준에 맞지 않은 내용의 책이 대다수이며 그 수가 너무 과하다는 점 그리고 논술고사와 같은 단지 입시성적을 위한 부차적인 독서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서라는 기본적인 행위가 밑받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난해하기만한 내용이 출제되는 논술고사 때문에 되려 청소년들의 독서 행위 장려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대학생인 지금, 요즘 고등학생들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학창시절 때보다 더 많은 양에, 더 어려운 내용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오늘날의 논술고사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교 입학을 위한 기준으로만 남게 되었다. '논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험'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리게 된다.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지식을 얻기 위한 자율적인 독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논술'이다. 요즘과 같이 매년 수험생들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논술의 의미는 그렇게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