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William Thomson, 남작 작위를 받아 ‘캘빈 경[Baron Kelvin]’으로 알려져 있다)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물리학의 미래에 전망한 연설을 한다. 그는 그 당시 밝혀지지 않은 두 가지 물리학의 과제, 즉 에테르(ether)의 실체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를 구름으로 비유한다. 그러면서 이 구름을 완전히 걷어내면 물리학의 하늘이 맑아질 거로 믿었다. 톰슨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계의 거목이었다. 그를 포함한 19세기를 살았던 과학자들은 고전물리학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품었다. 이들은 모든 물리 현상들을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역학적 모델을 기초로 해서 완벽에 가까운 물리학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들이 이룬 성취를 볼 때 그들의 희망에는 확실히 근거가 있었다.

* 토머스 새뮤얼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13)
하지만 톰슨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20세기 물리학의 하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아니었다. 오히려 구름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구름이 연이어 나타났다. 변덕스러운 물리학의 하늘, 이러한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토머스 S. 쿤(Thomas S. Kuhn)의 말을 빌리자면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며, 말 그대로 혁명이기 때문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Einstein)은 20세기 물리학의 하늘을 송두리째 뒤흔들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바로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 이론,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학문 업적이 없는 26살의 스위스 특허국 검사관이었다. 세 편의 논문을 읽은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는, 당시에 “한밤의 어둠 속에서 로켓이 갑자기 강력한 광채를 드리웠다”라고 말했다. 이 논문들에 고전물리학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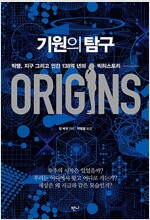
*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까치, 2003)
* 칼 세이건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06)
* 짐 배것 《기원의 탐구》 (반니, 2017)
과학 분야에서 새롭고 놀라운 연구 결과가 알려질 때마다 과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1953년 밀러-유리(Miller-Urey)의 원시지구 실험의 결과가 저명한 <사이언스>지에 실렸을 때 과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유리와 그에게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밀러는 실험실에서 원시 지구의 대기와 흡사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번개를 모방한)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가해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가 아미노산으로 합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성된 아미노산이 지구의 바닷물에 용해되어 여러 가지 유기물이 포함된 ‘원시 수프(primordial soup)’를 형성하고 이 수프 속에서 복잡한 생명체 분자들이 생성한다. 유리는 실험이 성공했을 때 기쁨에 겨워 큰소리쳤다. “만약 신이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엄청난 실수를 한 셈이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 302쪽)
칼 세이건(Carl Sagan)은 밀러-유리 실험을 ‘생명의 음악’을 악보에 옮겨 적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직접 밀러의 실험을 재현해봤지만, ‘생명의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코스모스》 보급판, 93~95쪽). 그 실험은 예견된 실패였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원시지구 실험의 전제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고대 암석을 분석한 자료에서 원시 대기가 원시 지구 실험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달라진 조건을 갖춘 실험에선 유기체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 때 읽었던 아동용 과학 전집에는 원시지구 실험을 생명체 탄생의 실마리를 제공한 유력한 정설인 것처럼 소개했다. 《코스모스》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지 못했으면 한창 유행이 지난 가설을 믿을 뻔했다.

* 다치바나 다카시 《21세기 지의 도전》 (청어람미디어, 2003)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학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 진행형’ 학문이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20세기를 다른 세기와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격심한 변화’라고 했다. 다치바나가 보기에 이런 혁명을 가능케 한 것은 과학이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19세기 또는 20세기 교과서로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 교육은 과학의 지적 대폭발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학 공부와 완전히 담쌓은 대중이다. 그들은 담 너머에 있는 19세기 과학이 어떤 건지 힐끗 쳐다보기만 하거나 아예 거기에 뭐 있는지 관심이 없다. 과학 발전이 빠를수록 대중의 무지는 깊어진다.
이 책 속 지식을 기억 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새로운 과학 이론 및 개념을 이해하는 데 벅찰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면 기존의 현상을 포함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 과학의 일반적 과정이다. 과학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가로막는 벽을 깨뜨려야 오래된 지식의 정수(渟水)를 빼내고, 신선한 지식의 정수(精髓/淨水)를 마실 수 있다. 그래야 과학에 대한 목마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해갈된다.
과학책을 만드는 사람들, 즉 저자, 출판업자 그리고 번역자 모두 과학의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사람들이 잘 사지 않고, 읽지도 않은 과학책이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경사다. 하지만 판매 부수와 증쇄 기록에만 연연하지 말고, 증쇄를 찍을 때마다 낡은 정보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로저 펜로즈 《마음의 그림자》 (승산, 2014)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의 《마음의 그림자》 (승산, 2014)는 1994년에 나온 책이다. 이 책이 나온 지 이십년이 지나서야 국내 번역본이 나왔다. 《마음의 그림자》 첫 출간 당시 인공지능은 인간 체스 챔피언을 가뿐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의 수준이 아니었다. 1990년 치누크(Chinook)와 체커 챔피언 매리언 틴슬리(Marion Tinsley)의 대결에서 틴슬리가 승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낙승할 거로 예상하지 않았다.
컴퓨터는 체스를 굉장히 잘 둘 수 있는데, 인간 챔피언 수준에 도달할 만큼 체스 실력이 뛰어나다. 체커 게임에서 컴퓨터 치누크는 최정상의 챔피언 매리언 틴슬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뛰어남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고대 동양의 게임인 바둑에서는 컴퓨터는 거의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인다. (597~598쪽)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IBM사의 컴퓨터 ‘딥 블루(Deep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를 꺾었고, 2008년 프랑스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모고(MoGo)는 9점 접바둑으로 김명완 9단을 이겼다. 그리고 2016년, 알파고(AlphaGo)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마음의 그림자》 번역본이 2014년에 나왔는데도 이 책의 옮긴이는 2008년 모고의 승리를 언급한 역주를 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