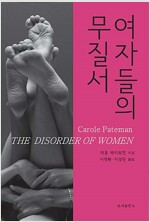
이 책 5장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을 포기해야 하나, 적잖이 망설였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번역이.. 번역 핑계를 대고 싶다 ㅜ
월린의 주장처럼 시민사회의 정치적 본성을 '흐려놓기'보다는 오히려 로크는 그것에게 그리고 오로지 그것에게만 '시민' 또는 '정치적' 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요소'에 대한 전적으로 명시적이었다. (p 164)
.... 세 번쯤 읽었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skip. 이런 문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꾸욱 참고 다 읽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구나 하면서 지나다보니 5장이 끝났고(수없이 헤드뱅잉하며 졸았더랬지..) 6장에 이르러서야 왜 5장에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이분법은 거의 두 세기에 걸친 여성주의적 글쓰기와 정치투쟁에서 중심적이다...(중략)...여성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극도로 가까우면서도 극도로 복잡하다. 두 교설 모두 사회적 삶의 일반 이론으로서 개인주의의 출현에 뿌리를 둔다. 자유주의도 여성주의도 전통사회의 귀속적, 위계적 유대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p 189)
여성주의는 흔히 자유주의 혁명 내지는 부르주아 혁명의 완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즉 자유주의적 원리들과 권리들을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확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평등한 권리들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여성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보편화하려는 시도는 흔히 인식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결과들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자유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급진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자유주의 이론과 실천에 근본적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와 대립에 도전한다는 점에 그렇다. (p 190)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자 한 자유주의는 가부장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지만, 여성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론이 갖는 표면적인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의 가부장적 현실과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지배를 흐려놓는다는 것(p 193)' 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탈정치화된 공적 영역을 사적인 삶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의 가부장적 성격이 왜 이토록 쉽게 '잊히는가' 하는 것이다. 왜 두 세계의 분리가 시민사회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공적 삶은 암묵적으로 남자들의 영역으로서 개념화되는 것인가? (p 198)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사적인 영역은 여성에게 공적인 영역은 남성에게 허용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 이 얘길 하려고 5장에서 자유주의와 사적/공적 영역의 함의에 대해 그 알 수 없는 말들을 얘기했던 것이로구나. 이해는 합니다만, 덕분에 내 머릿속도 책 제목처럼 무질서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일단, 이제 200페이지까지 읽었나이다... 앞으로도 146페이지 남았구요.
이건 약간 빗나간 얘기이긴 한데... 요즘 넷플릭스로 <퀸스 갬빗(The Queen's Gambit)>이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말이다. 이 제목이 체스의 오프닝 중 하나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체스를 모르는 비연ㅜ) 어쩄든 천재소녀의 체스를 통한 인생 분투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 좀 음울한 느낌이긴 하지만 꽤나 재밌다. 체스를 몰라도 재밌다. 체스를 알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체스를 배워볼까 잠시 생각해봤다. (아서라, 비연...;;;)

아뭏든, 엘리자베스 허먼이라는 아이가 엄마를 잃고 고아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는 시작된다. 우연히 거기 일하는 샤이벌 아저씨에게서 체스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데다가 승부욕이 대단해서 금방 천재 소리를 듣게 된다. 샤이벌 아저씨가 소개한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제안으로 고등학교 체스 동아리와 겨루는 장면부터가 압권이다. 말하자면 이 시대가 1960년대. 여자는 시집가서 결혼해서 애 풍풍 낳고 살면 최고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여자인 엘리자베스 허먼이 그 동아리 남자애 12명을 한꺼번에 상대하여 다 이겨내는 장면은, 우와,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벽 하나를 훌쩍 넘은 기분이 들게 한다.
이후에도 계속된다. 베스는 체스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체스로 세상과 겨루고 싶어하지만 주위에서는 그 아이가 '여자'라는 것에만 집중한다. 처음 공식 경기에 나갔을 때 여자아이가 할 게 아니라는 듯한 모두의 표정은 가관이었고 그 와중에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실력 하나만으로 한명 한명 이겨내는 베스의 모습은, 체스만큼이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탱해주는 건 입양된 가정의 양엄마. 사랑을 퍼붓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베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주고 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자립하기에 얼마나 험악한 시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리고 무표정한 베스의 그 담담함이 맘에 들어서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다. <여자들의 무질서>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 드라마가 자꾸 내 머리에 떠올랐다.. 자유주의라든가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어려운 개념을 쓰지 않더라도 여자들이 알 수 있는 그 공기의 맛이 있다. 씁쓸한 맛. 남자와 경쟁하게 될 때 쟤 뭥미? 하는 듯한 느낌. 자라면서 한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고, 집에서도 남녀 차별을 전혀 안 겪으며 컸다 해도 사회에 나가면 바로 받게 되는 '그' 시선과 '그' 느낌이다. 말하자면 남자들이 자신들을 default화해서 정해놓은 (공적) 영역 내에 들어가려 하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무시하며 시작하는 그것. 지금 읽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도 아주 호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가, 쓰는 스타일 정말 맘에 든다. 아주 거침이 없다. 매우 점잖은 단어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내용은 신랄하다. 욕하지 않아도 욕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2년 저서에 이렇게 적었다. "기본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전통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이것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백인이라는 점과 남자라는 점은 말해지지 않는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떄문이다. 백인이라는 점과 남자라는 점은 내포되어 있다.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것이 디폴트이기 때문이다. (p 49)
남성이 보편이라는 추정은 젠더 데이터 공백의 직접적인 결과다. 백인이라는 점과 남자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른 정체성이 아예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 보편은 젠더 데이터 공백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자들이 보이지 않고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 데이터가 우리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성이 보편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소수자의 위치로 끌어내려진다. 특수한 정체성, 주관적 관점의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여자들은 문화에서, 역사에서, 데이터에서 잊어도 되는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자는 투명 인간이 된다. (p 50)
보편은 남성이요, 특수는 여성이라는 생각.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남성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여성을 거기에 넣으려면 뭔가 특수한 상황이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 이제 저자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이름으로 각 분야에서 사라진 여자들을 살펴볼 생각인 것 같다. 기대 만빵이고... '젠더 데이터 공백' 이라는 단어도 너무 맘에 든다.
<여자들의 무질서>는... 번역도 그렇고 사실 내용도 어렵다. 하지만 어쨌거나 끊임없이 머리를 자극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퀸스 갬빗>을 찾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여자들>을 읽으며 그 연관성을 실감하게 한다.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래서 무질서해진 머릿속을 억지로라도 잡아끌고 끝까지 읽어나가야 한다, 싶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