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2/박광수/걷는나무/ 그림과 시가 있는 하루가 되길~
바쁘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가슴에 시 하나는 심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시 한 수 읊조리는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를 읊조리다보면 빠르게 지나던 시간이 느릿한 걸음으로 지나고, 숨 쉴 틈 없이 채워지던 일과표엔 듬성듬성 공간이 생기면서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뜨겁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는 달리 삶이 헛헛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는 순간도 있고요.
느리게 가지고 외치면서도 어느새 헉헉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헛헛한 가슴을 시편으로 채우며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합니다.
유려한 만연체의 이야기보다 소박하고 짧은 한 마디가 가슴을 콕 찌르거나 울리기도 하니까요. 길다란 문장보다 시 속의 작은 낱말 하나가 길고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니까요.

오로지 당신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부디 다른 사랑도
나처럼 당신을 사랑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중에서 (37쪽)
가족, 친구, 이웃, 상대가 누구든 한 마디의 말을 내뱉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이 사랑하길 기도할 때가 많기에 공감하는 시입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우주처럼 해도해도 끝없는 사랑이겠지요.
오늘 하루도 얕은 나의 사랑이 더욱 깊은 사랑이 되길, 후회없는 사랑이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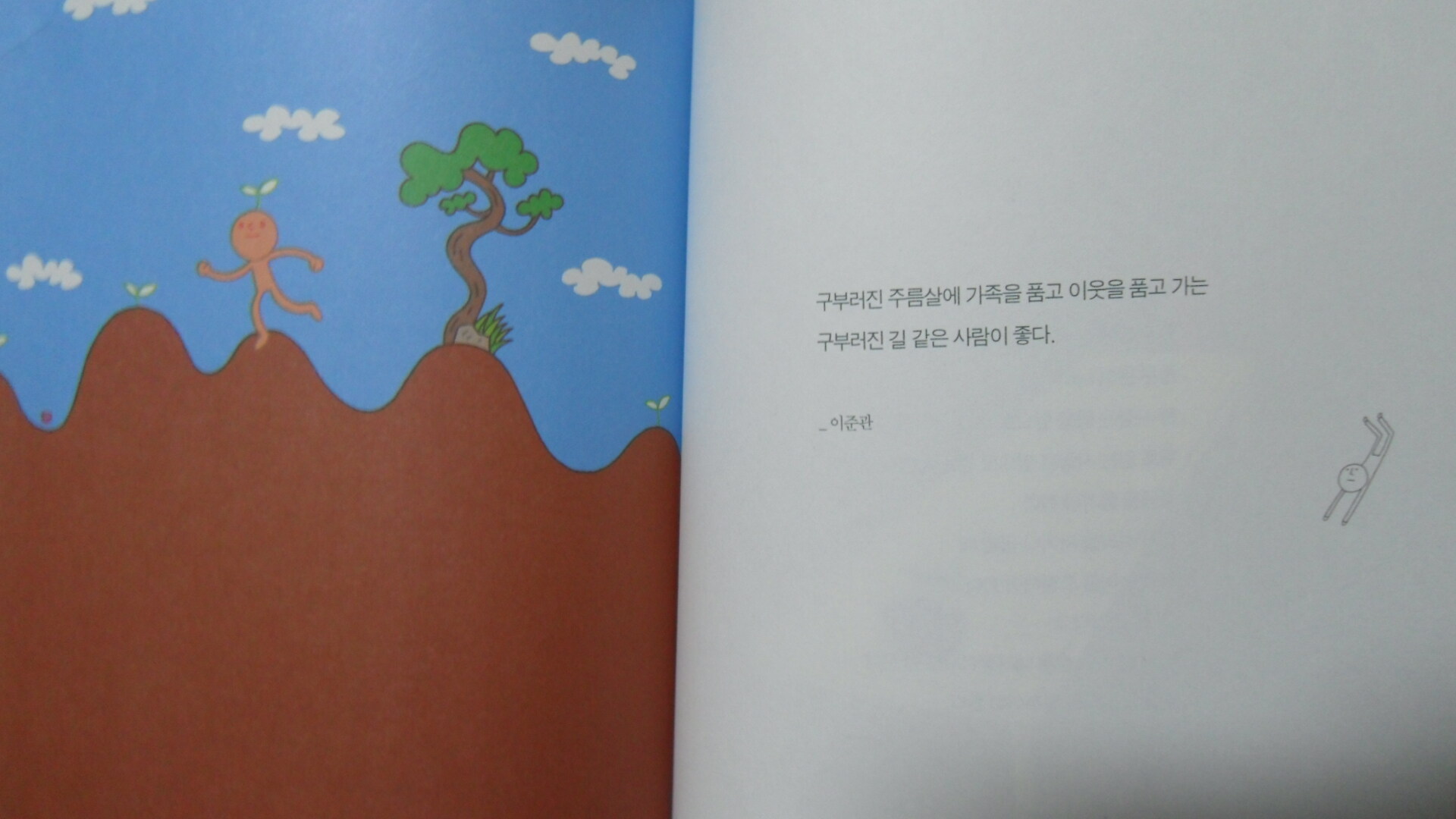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들꽃이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이준관의 <구부러진 길> 중에서 (159~160쪽)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꼬부랑 할머니'가 생각나는 시라서 순간 푸훗 하며 웃은 시입니다. 코믹한 동요를 상상하다가 시골 옛 길을 상상하게 만드는 풍경화 같은 시입니다.
멋진 시골길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예전에 흙길에서 만났던 작은 생명들을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직선의 잘 빠진 아스팔트 길보다 꾸불꾸불 제멋대로인 흙길을 좋아하거든요.
그 길에서 만나는 민들레, 패랭이꽃, 제비꽃, 바위취, 진달래, 철쭉, 질경이, 개불알꽃, 별꽃, 나비, 거미, 개미, 까치, 제비, 어치, 청설모 등 길을 지키거나 길을 오가는 많은 생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모든 것을 품는 길, 그런 구부러진 길을 주말엔 타박타박 걷고 싶어집니다.
구부러진 길이 모든 생명을 품 듯이 여러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곷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 정채봉의 <오늘> (179쪽)
소소하다고 소중한 것들을 무심히 지나친 적은 없는지, 귀중한 것을 미처 기억하지 못해 섭섭하게 만든 건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마음과 작은 손길을 내밀어 슬픈 하루가 되지 않길 해야겠어요.
삶을 빛나게 하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꽃에 시선이 머무는 하루, 새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하루, 신을 생각하는 하루, 내 곁의 사람과 손 잡는 하루,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모으는 하루이길 바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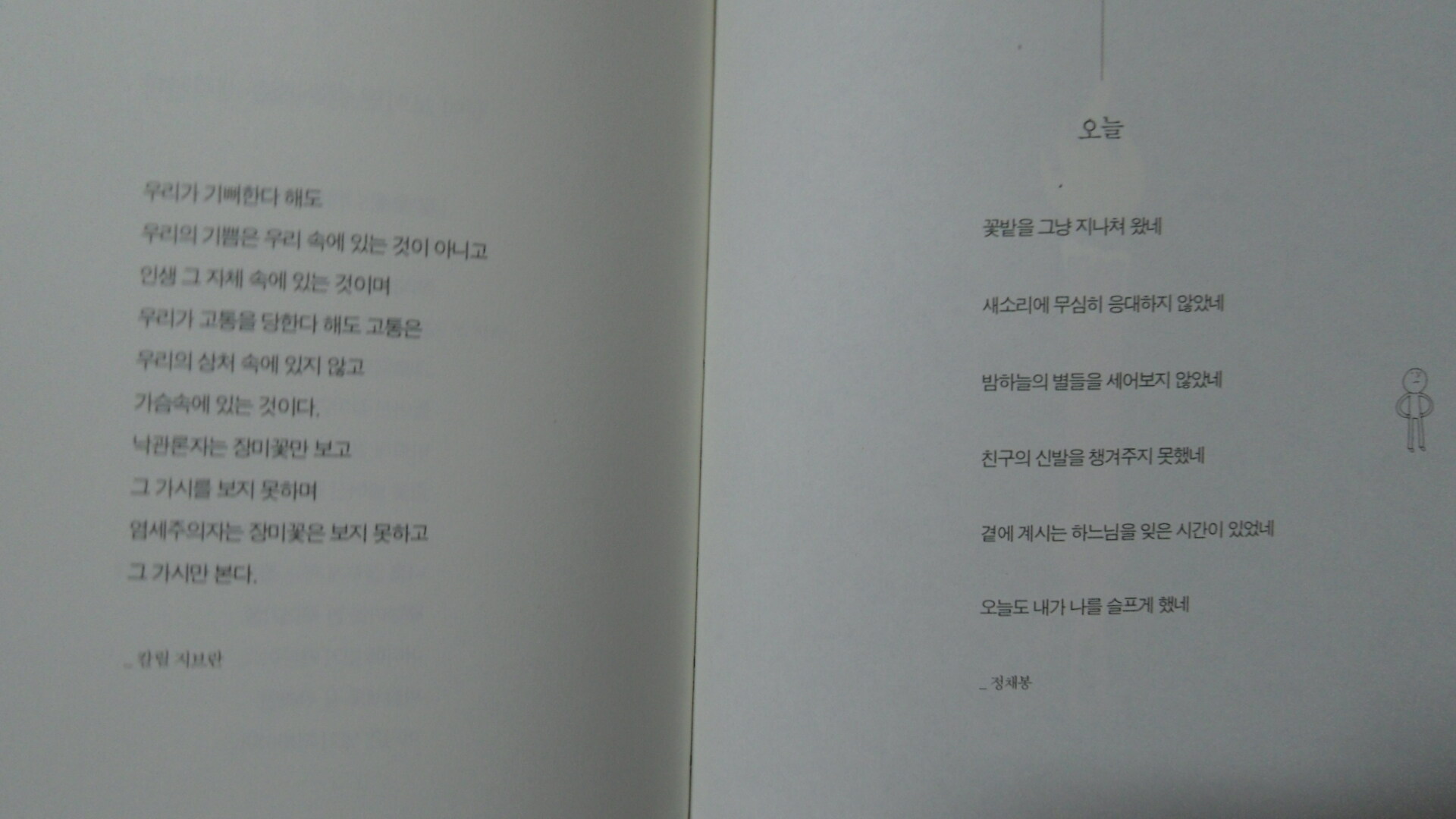
동서고금의 멋진 시와 박광수의 생각하는 그림이 만난 시편들을 보며 깊은 생각, 긴 여운에 빠져 느릿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옛 시인들의 노래가 소리없이 가슴을 파고 들기도 하고, 현재 시인들의 노래가 가슴에 잔물결을 일렁이게 합니다.
언제나 그림과 시가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