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루 한시 - 한시 학자 6인이 선정한 내 마음에 닿는 한시
장유승 외 지음 / 샘터사 / 2015년 9월
평점 :



하루 한시/샘터/소박한 일상을 담은 옛 선비들의 한시 101수
문인이든 아니든 마음을 담아 시를 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분위기가 있고 여유가 느껴진다. 하루 한 편씩 한시를 보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든다. 한자로 된 한시이지만 어렵지 않게 한글로 풀고 번역한 시에다 에세이까지 만나면서 옛 선비들의 생각과 일상을 엿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시를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며 그렇게 삶을 사랑했던 옛 선비들의 여유와 지혜도 배우게 된다.

한자를 제법 안다고 생각하고 한자로 풀이해 보려다 자꾸만 막히는 한자에 포기하고 풀이로만 읽은 책이다. 우리가 한시와 멀어진 이유엔 한자 교육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우리 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한시는 한글 전용 교육아 되면서 멀어진 문학이 아닐까? 다시 교과서에 한자 병용이 된다면 한자에 익숙해지고 한시와도 친숙해지지 않을까 싶다.
대야 깼다 어린 여종 혼내지 말 것이니
괜스레 타향에서 고생만 시키었네
산가의 기이한 일 하늘이 날 가르쳐
이제부턴 시내 나가 내 얼굴 씻으려네
-윤선도 <여종이 낡은 세숫대야를 깨뜨려서>, 《고산유고》 -23쪽
고산 윤선도의 시다. 나무로 된 세수대야일까? 잘 깨지는 세숫대야라니. 물건이 귀했던 조선시대에 세숫대야를 깨뜨린 여종을 혼내지 않고 시내를 대야삼아 세수를 한다는 발상이 호기롭고 여유가 느껴진다. 유배를 많이 다닌 고산 윤선도의 배짱과 호연지기도 느껴진다.
높이 달린 것은 다 따지 않고
다람쥐 먹이로 남겨둔다네
김창협 <과일을 따다>, 《농암집 》-41쪽
감나무에 달린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남겨두거나, 도토리나 밤을 다 줍지 않고 다람쥐 먹이로 남겨두는 것은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배려였으리라. 먹이가 귀했던 배고픈 시절이기에 한 개의 감, 한 톨의 도토리나 밤이 눈에 아른거렸을 텐데, 동물과 나눠 먹으려는 마음이 여유롭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눌 때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을 터득한 선현들의 지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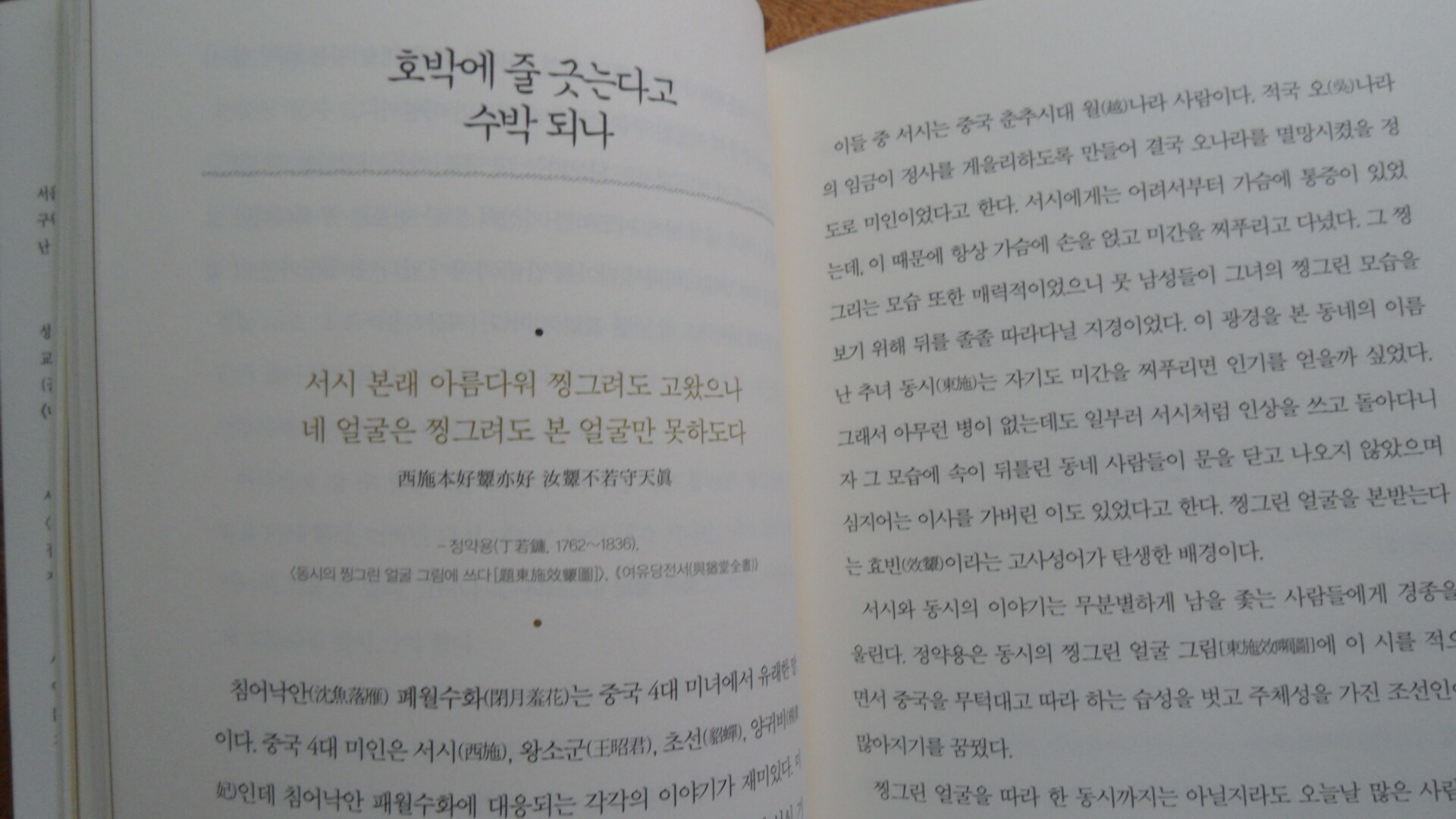
다산 정약용, 고산 윤선도, 최치원, 박제가, 이황 등 역사책 속에서 마주했던 인물들의 한시를 읽으며 옛날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루를 보내며 풍류를 즐기는 옛 선비들을 만나본 듯하다. 어쨌든 옛 선비들의 일상의 흥과 정신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한시를 통해 자연을 벗하고 인생을 노래한 옛 시인들의 낭만을 느긋하게 즐기게 된 책이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접한 뒤로는 읽을 기회가 없었던 우리의 한시인데, 한시의 짧지만 깊은 여운과 유머, 풍자가 깃든 압축미에 매료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