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명 이야기 ㅣ 아우름 1
최재천 지음 / 샘터사 / 2014년 12월
평점 :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최재천]생존하려면 경쟁과 포식이 아니라 공생을....
적자생존의 생태계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갈등과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공감과 공존도 필수다. 삶에 정답이 없다지만 서로 손 잡는 모습은 대상을 막론하고 아름답다. 더불어 잘 살자는 이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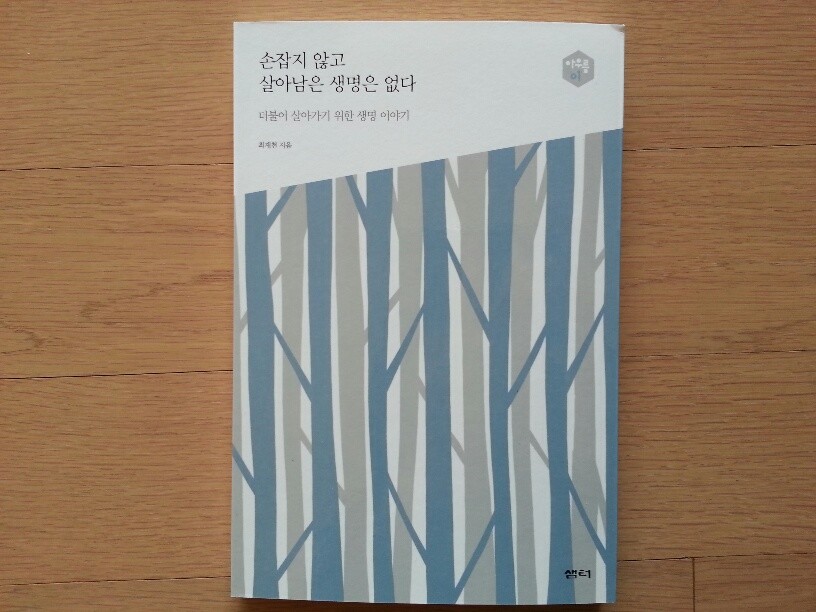
작고 허약한 인간이 지구를 장악한 것은 불과 25만 년 전이라고 한다. 거대한 공룡, 날카로운 사자를 제치고 인류가 최고의 포식자로 등극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생도 그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
유한의 삶이지만 모든 생명들은 영속성을 지닌다. 수많은 난자와 정자들은 신기한 방법으로 각자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생명을 복제한다. 이렇게 유전자들은 살아남아 대대로 이어진다.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하게 사는 생존 방식이 유전자인 셈이다.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 목소리까지 닮는다는 유전의 법칙은 신묘할 정도다.
찰스 다윈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태초에 우연히 생성된 어느 성공적인 복제자 하나로부터 복제되어 나왔다고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개미, 까치, 은행나무 등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DNA에서 분화된 일원성을 지닌다고 한다. 특히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99% 같다고 한다. 침팬지는 다른 유인원과 달리 손금이 있다고 한다.
우성 복제자를 내세운 인위적인 생명의 영속 전략은 득일까, 아니면 실일까.
새들은 1년에 1번 알을 낳지만 닭이 매일 알을 낳는 이유는 알 잘 낳는 닭을 집중적으로 번식시켰기 때문이다. 젖소가 자식을 낳지 않고도 젖이 잘 나오는 이유도 인간이 젖을 잘 내는 젖소를 집중 번식시켰다는 것이다. 지나친 인위적인 유전자 복제, 유전자 조작은 위험성도 안고 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주제들이다.
이렇듯 모든 유전자는 행동을 유전시킨다. 행동이 모이면 문화가 되기에 문화는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동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가장 진화한 동물이 인간이지만 동물과 함께 자연을 나누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과 포식이 아니라 공생이 가장 현명한 생태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동물에도 감정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고 사회조직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심지어 개미들은 농사도 짓고 장례문화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저자는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 한다. 그동안 몰랐던 동물들에 대한 이해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한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에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학문과 학문이 통섭하고, 통섭생물학의 붐, 동물행동학, 생물학의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무엇보다 동물행동학자이자 국립생태원 원장인 최재천의 시골 강릉에서 자라 자연 속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동물과 함께 했던 유년기를 늘 그리워하던 그가 결국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물학을 선택했고, 동물 연구에 빠지게 된 과정들이 담겨 있기에 소소한 재미를 준다. 자기 분야를 찾으려는 이들에게 가이드가 될 지침들도 있다.
동물과의 공생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꽃과 개미, 개미와 진딧물, 열매와 동물의 배설, 꽃과 벌, 이미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과 인간의 공감, 인간과 동물과의 교감도 생각하게 된다.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은 서로 물고 뜯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손 잡고 있다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