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자 3 : 학문이 끝나는 곳에 도가 있다 ㅣ 노자, 도덕경 시리즈 3
차경남 지음 / 글라이더 / 2013년 10월
평점 :

품절

[노자3] 학문이 끝나는 곳에 도가 있다고?!!
2500여 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세상을 구하고자 여러 사상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대표가 유가, 도가, 법가, 묵가라고 한다.
묵가와 법가는 사회의 제도와 규율에 대한 것은 있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유가는 사회와 인생에 대한 예의범절과 제도는 있으나 인간과 우주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이 없었다.
인간 존재의 이유, 궁극의 사물에 대한 탐구는 오로지 노자뿐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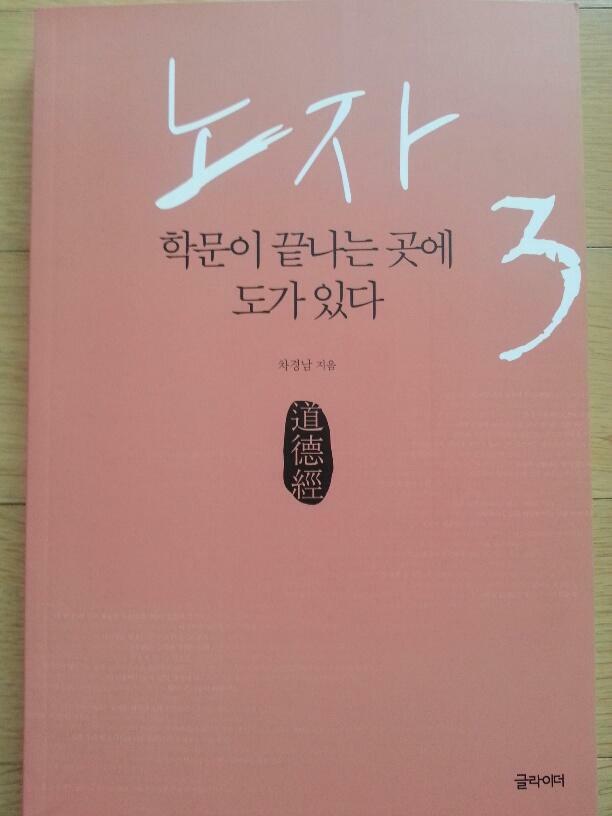
학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이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이다. (책에서)
학문과 도에 대한 노자의 정리다.
이 간단명료한 정리 앞에 가을날 익은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노자가 말하는 道는 천지자연의 참모습이고 궁극의 사물이치이나 學은 인위가 가미된 왜곡된 모습, 다듬어진 세상원리이다.
그러니 도는 학을 넘어선 것이다.
궁극의 형이상학이 도의 핵심이다.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종교 감정과 노자의 도는 서로 비슷할까,
양자론을 말한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 감정은 우주의 장엄한 기운은 신적인 기운이지만 인격적인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신적인 것이나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존재는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노자의 도와 통한다.
만약에 아인슈타인과 노자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까.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격적 신'을 폐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대신 '비인격적 신성의 개념'을 불러왔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이다. (책에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니,
만상의 형태가 나타나고
사물의 질서가 거기에 생겨난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책에서)
우주의 원리가 자율적인 원리에 따른다고 본 노자.
자연의 이치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이치에 따른다고 본 노자.
무위자연의 세계는 타율적인 개입이 없는 스스로 운행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는 렛잇비(Let it be.)와 통하는 것이다.

무위자연의 도가 그대로 만물의 이치, 사물의 질서, 인간의 자율성인 것이다. 스스로 조화로울 수 있다는 발상…….
자연을 유유자적해 본 자의 지혜다.
자연에 개입하지 않고 타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인 것이다.
길러주고도 주재하려 하지 않는 다는 장이부재(長而不宰).
자연은 길러주고도 주재하려 하지 않으니 진정한 장이부재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장이부재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다.
자식을 기르나 주인행세를 않고 자율적인 삶을 배려하는 게 노자의 도임을, 자연의 이치임을 생각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이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진정 강한 것이다.
지혜로운 빛을 쓰되,
다시 본래의 밝음으로 돌아가야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으리니,
이것이 영원함을 배우는 것이다. (책에서)
큰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 도라고 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가슴으로 공부하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이다.
사실 모든 공부가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아는 자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 알지 못한다. (책에서)
진짜 아는 사람은 모름지기 함구 하는 법이라니!
아는 만큼 드러내야 알아주는 요즘 세상에 노자는 일침을 가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걸까.
얕은 지식으로 안다는 나,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뻥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동양의 인문학인 文, 史, 哲은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한다.
현실에 대한 역사, 이상을 아우르는 꿈과 상상력에 대한 문학, 현실과 초현실 사이의 균형 잡는 일을 하는 철학으로 인생을 이해하자는 인문학이라고 한다.
저자의 문, 사, 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다.
역사책은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닌 것이 끼어든다.
등장인물과 무대는 진짜고 내용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짜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학은 등장인물과 무대는 가짜이지만 내용은 우리의 삶 그대로 진짜다. 인생을 알기 위해 역사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문학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니 역사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인생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방향감각이 필요하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의 궁극의 목표와 이상은 무엇인지를 철학서들은 보여준다. 그 중 가장 심오한 철학서 중의 하나가 <도덕경>이라는 것이다.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다.
오직 병을 병인 줄 알면
병이 사라진다.
성인에게는 병이 없나니,
병을 병으로 아는 까닭에
병이 없는 것이다. (책에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게 워낙 많아 다 소화할 수 없고 섭렵할 수도 없는데....
알량한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건 그저 말장난임을 생각한다.
배워온 지식 조각들을 모아도 앎의 수준엔 미치지 못함을 생각한다.
그러니 자연 앞에 서면, 우주 앞에 서면 머리 수그릴 밖에.
너 자신을 알라던 소크라테스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지 말라는 노자가 대담을 벌인다면 서로 무슨 말을 할까.
노자는 "나는 아무 것도 모르오. 나 자신 조차도."라고 말할까.
무지한 자신을 알 뿐이라는 소크라테스보다 노자가 한 수 위가 아닐까.
글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할 수 없다. -주역 계사전- (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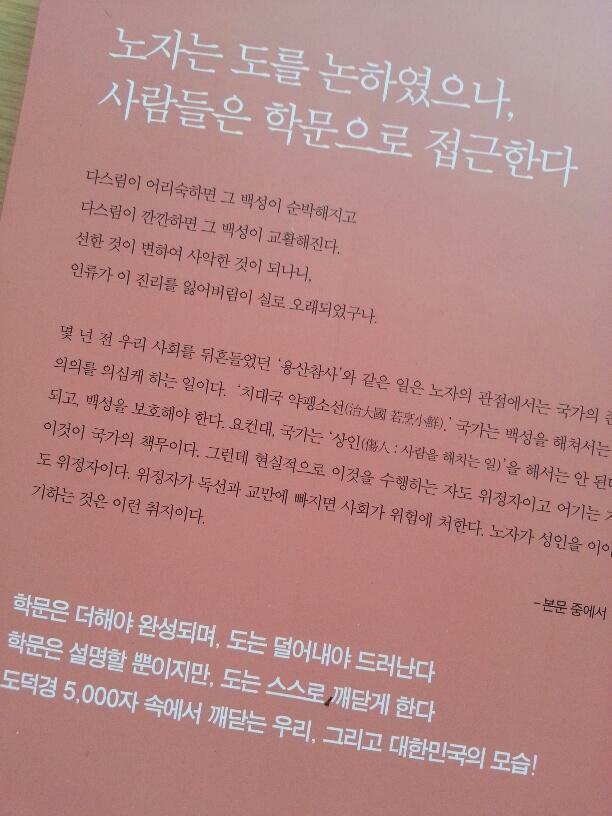
노자의 뜻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으랴. 오늘도 깨치는 건 그가 자연주의라는 것 밖에.
혼자 하는 산책은 침묵인데, 동행이 있는 산책은 새소리처럼 지저귀게 된다. 조용히 가고 싶어도 안되는 게 인생인가 보다. 오늘도 지저귀고 있으니.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삶의 무리라는 노자의 말을 되새긴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는 노자의 말을 음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