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2]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요즘 들어 제자백가 중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노자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
굳이 대답하라면…….
그의 사상은 등산 중에 만나는 옹달샘 같은 달콤함이 있다고 할까.
긴 여정 중에 만나는 쉼터 같은 아늑함이 있다고 할까.
아침산책길에 만나는 벤치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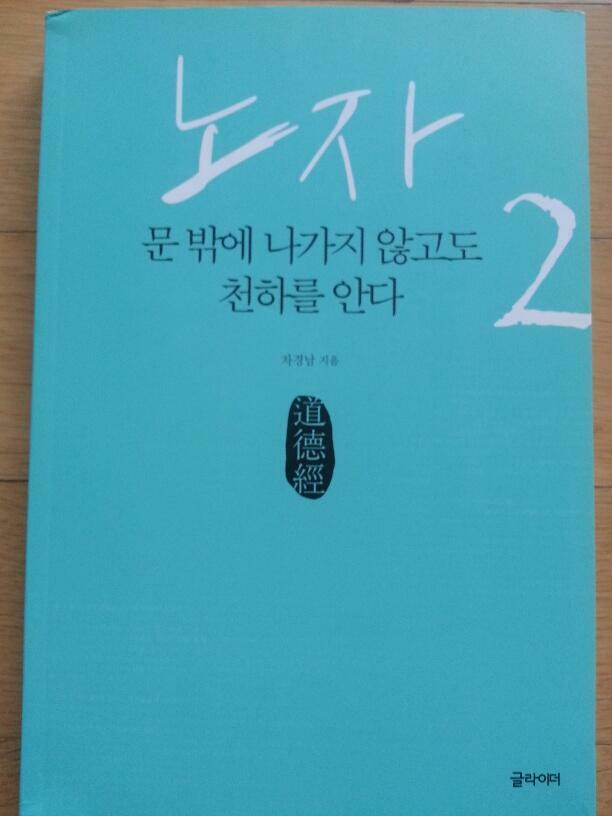
인류의 스승, 현대인의 삶의 멘토, 동양사상의 원천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이가 노자라는 생각이 든다.
역설의 대가, 명백한 논리의 대가, 자연 법칙의 대가라고 할까.
비움과 여백이 동양화의 미학이라면 그것을 사상으로 잘 드러내는 이가 바로, 노자라는 생각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無爲)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걸까.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무위를 주장한 노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는 옛말에 익숙해서였을까.
무위를 무위도식으로 해석해 버리고는 노자를 장자와 묶어서 세트로 싫어하기까지 했는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은 민폐요, 꼴불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깨치는 무위는 이런 것이다.
행위가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는 하되 본질에 맞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의미임을, 자연 법칙에 따라 제대로 살라는 의미임을 깨치게 된다.
인위, 작위가 배제되고 인공과 억지가 배제된 세계가 무위임을 생각한다.
노자의 <도덕경>이 바른생활을 의미하는 윤리도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연의 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체득하기 위한 경전이란 의미라고 한다.
노자는 보물은 내 안에 있다고 했다.
본질, 본성을 소중히 여기는 노자의 이론이 플라톤의 철인국가와도 통할까.
타고난 본성을 바탕으로 그 능력과 소질을 살리는 점에서는 서로 통하지 않을까.
저자는 노자의 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정기, 질료, 형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노자가 말하는 道는 인간 윤리도덕이 아니라 자연의 도,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德은 윤리적인 덕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과 여유의 경지를 말한다.
노자가 말하는 물(物)이란 물건이나 사물이 아닌 모든 사물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 바탕이므로 명백하진 않으나 황홀지경이라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정(精)이란 정수, 본질을 의미하는 말인데, 정은 그윽하고 어두운 것, 생명의 기운이랄 수 있겠다.
노자는 사물의 참 모습을 유(有)와 무(無)가 아니라 은(隱)과 현(顯)이라고 한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그것을 무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게다.
왜냐하면 잠시 휴식하식하고 있는 유가 은이기 때문이다. 존재는 결코 사라질 수 없으며, 유는 결코 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도는 황홀하고 오묘한 것이어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무, 텅 빈 공허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어 있는 듯 채워져 있는 그 무엇 이라는 것이다.
별 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
누가 이리 하는가?
천지다.
천지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랴.
(책에서)
도는 본래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소박한 통나무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이나
이를 지배할 자 세상에 없나니,
왕이나 제후가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저절로 복종할 것이오.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를 내릴 것이오.
백성들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려질 것이다.
소박한 통나무가 잘리면
그릇이 되어 이름이 생긴다.
허나, 이렇게 이름의 세계가 전개되면
또한 마땅히 멈출 줄을 알아야 하나니,
멈출 줄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비유하면 천하에 도가 존재하는 방식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책에서)
이 부분은 노자의 사상 전체를 응축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노자가 말한 도의 심오한 경지를 어찌 다 깨칠 수 있으랴.
궁극의 진리를 깨치려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라져 갔다.
그들이 많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어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를 절감한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노자와 소크라테스가 만났다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꽃>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순간을 절묘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사물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도의 실체도 이름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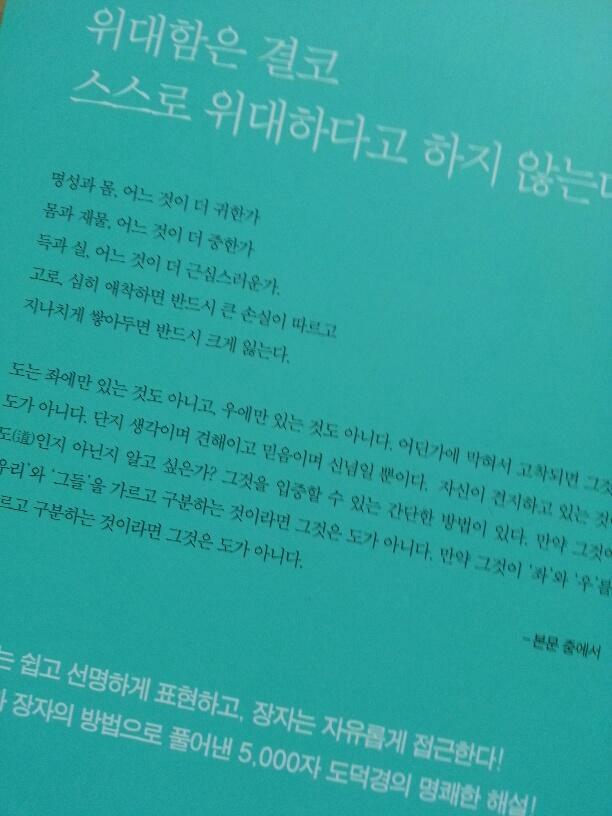
노자의 사상을 읽고 있으면 늘 수천석두라는 말이 떠오른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자연의 순리요, 자연의 위대함을 말하는 듯하다.
수천석두의 지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치, 이 모두가 노자가 말하는 도임을 생각한다.
짙푸른 잎이 어느새 빨간 잎으로 물드는 나무를 보며 노자의 자연주의를 생각한다.
자연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따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진리는 사물의 안에, 내 마음에, 자연 속에 있다는 노자의 말이 위로가 된다.
모든 사물에는 뭔가가 있는 거다. 그게 도이고 핵심이고 원형질 같은 바탕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물을 사랑한 노자를 한 권의 책에서, 산책길의 단풍나무에서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