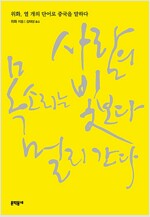위화의 새 산문집이 번역돼 나왔다.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푸른숲). 중국 당대문학 간판작가의 한 명이면서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중국작가의 문학견습기로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기회가 닿아서라기보다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의 장편소설을 대부분 강의에서 다루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가 소설가라기보다는 이야기꾼이라는 것이다. 현대소설로서의 기대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야기로서는 얼마든지 제값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소설‘들이 그렇다.
소설과 산문을 통틀어서 그의 가장 좋은 책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문학동네)인데, 나는 그의 산문(이 경우에는 에세이다)이 소설들과 합쳐져야 제대로 된 작품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에세이와 같이 합해져야 작품을 구성하는 쿤데라의 프랑스어 소설들도 비슷한 경우다). 다르게 말하면 소설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게 위화의 에세이다(<형제>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게 <사람의 목소리>다. 이 둘은 합쳐져야 제대로 된 작품을 구성한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위화의 소설=이야기+에세이‘이고, 통상 소설로 분류되는 그의 작품들은 여기서 ‘이야기‘에 해당한다. 그의 산문이 소설과 별도로 일가를 이룬다는 견해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건 중국 현대소설이 충분히 숙성(성숙)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당대 사회현실을 묘사하고 재현한다는 당위론의 차원에서), 다른 외인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내가 소설로서 더 읽고 싶은 건 <마사지사>의 작가 비페이위의 신작이다. 위화가 무엇을 더 쓸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비페이위는 기대를 갖게 한다. <마사지사> 정도의 작품을 써내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