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 후 유용한 조언을 많이 얻었다. 그래 나도 이제 열심히 쓸 거야!
그런데....
습관이란 놈은 정말 무서운 놈이라 페이퍼 쓰러 들어왔다가 (미리 쓰는 거 까먹음)
내 서재로 먼저 안 들어오고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 아침 시간이 다 가버렸다.
밥 먹고 와서 이웃 서재 둘러보기를 일단 멈춤하고 쓰기 버튼을 눌렀다.
3월이 다 가기 전에 2월에 읽은 책 정리는 해야지.
조언해주신 고수님들 저 잘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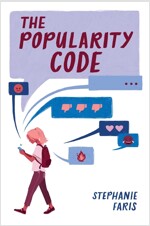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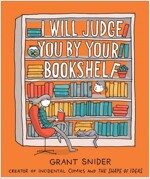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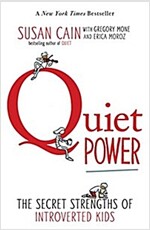
<We Are Not from Here>를 읽고 머리 좀 식히려고 읽었던 <얼음에 갇힌 여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여자들이 살해당하는 내용이라 우울한 데다가 주인공이 자꾸 거슬렸다. 이런 거 너무 싫다. 능력 있는 형사인데 막 혼자 행동하다가(형사는 꼭 파트너랑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감) 위험에 빠진다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자기 집에 누가 침입해서 건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간다고?? 그리고 또 당한다. 남자 형사 주인공들은 막 자기 감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해도 절대 저 정도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위험에 빠져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넌 전의 실수에서 배운 것도 없냐? 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했다. 시원하고 통쾌한 스릴러 원했다가 속만 답답했음.
<The Popularity Code>는 표지를 보고 갸우뚱했지만 굿리즈 평을 믿어봤는데... 흑. 중학교에 Slambook이라는 웹사이트가 생기고 거기 아이들 각각의 페이지가 생긴다. 처음에는 인기 있는 아이들 페이지만 생기고 좋은 댓글만 달리지만 곧 다른 아이들 페이지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듯 나쁜 댓글이 포스트 되기 시작한다. 다루는 주제는 지금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주인공과 친구들의 모습 등 모든 게 좀 어설펐다. 너무 뻔하기도 하고. (고수님들이 이야기한 메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음. 읽으면서 속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남)
<Bloom>역시 굿리즈의 평을 보고 선택했는데 또 실패. 비가 온 뒤 갑자기 자라게 된 식물이 제거도 안 되고 마구 자라 사람도 잡아먹는다. (엄청 큰 식충 식물을 떠올리면 됨) 알고보니 이 식물은 외계인이 보낸 것이고 주인공 세 명은 DNA의 절반이 외계인인 것이다. 사실 나는 이런 류의 책도 잘 보는데 이 책은 영 어덜트 책의 냄새가 너무 풀풀 났다. 영 어덜트 책을 좋아하면서 또 너무 그런 냄새가 나서 싫다니... 앞뒤가 좀 안 맞나? 이 책은 삼부작의 첫번째 책인데 여기까지만 보려고.
좋았던 책은 제대로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이러다 또 그냥 넘어갈 거 같으니 일단 여기 계속 써야겠다.
<The Lion of Mars> 화성 정착민 이야기.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똑같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에 있어야만 했던 (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모습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건 진리. 마지막 갈등 해소 부분이 너무 쉽게 해결된 게 좀 아쉬웠지만 아이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Quiet Power> 예전에 <콰이어트>를 읽고 좋았었는데 (왜 좋았었는지는 까먹음. 나 책을 왜 읽는 거지?) 청소년용으로 나왔는지 몰랐다. <I Will Judge You By Your Bookshelf>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려 검색하다가 작가의 이름을 넣었더니 이 책이 나왔다. (여기 삽화를 그렸다.) 아! 진작 이 책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52:48 정도의 내성적 성격이지만 엠군은 엄청나게 내성적이라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사서 건네줄까 생각 중. 물론 엄마가 책을 사서 건네 줘도 본 척도 안 하겠지만 말이다.
<Santiago's Road Home>는 따로 리뷰 씁니다. 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