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읽었다'라고 외치는 책이 이 책뿐일까...
이 책이 출간되던 당시 라디오에서 엄청 홍보했던 기억이 있지만, 특별히 눈여겨 두지 않았던것 같아요. 다만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 대략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만 했었답니다. 그리고 20년전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책을 지금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참 곱다... 책이 이렇게 곱게 만드니 눈길이 안갈수 있나요. ^^
이 책 표지가 이렇게 고울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곱고 이쁜 겉모습에 속지 마라~~~라고 경고하듯이 말이죠.
알라딘 친구덕분에 저렴하게 내 책장에 꼽아두고.. 언제 읽지...하던참에, 친구가 읽고 싶다하여 이 참에 읽고 친구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책 읽는거 너무 좋아요.^^ 나 혼자 읽으려면 언제 읽을지 모르다가 주변에 읽고 싶다는 분들을 만나면 빨리 읽고 선물해주고 싶더라구요. ㅎㅎ 물론 새책을 선물 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ㅠ.ㅠ;; 함께 읽었다는 기쁨이 있으니깐.... ^^

드레스덴 인형이라고 불리었던 네 아이.
이쁜것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서버리고 싶은 마음은 뭘까요?
아마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나쁜 마음을 죽이고 좋은 마음을 살려 아끼고 사랑해주겠지만, 가끔 비이성적인 사람은 좋은 마음을 죽이고 나쁜마음을 살려 악행을 저지르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이 시리즈 4권까지 읽을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마지막 5권을 읽고나서야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보고 지켜왔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이해하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곳에 현혹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진짜 지켜줘야할 존재를 바라보는 지혜를 잃게 된거죠.

그나저나 20년이라는 세월을 참 무시못하겠습니다.
이 책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도 나도 많이 변해있었습니다. 만약 이 책을 20년전에 만났더라면, 소녀적 감성과 충격적인 소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텐데, 책속의 충격적인 일보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20년을 지내와서인지 그리 충격이 덜했어요. ^^;; 어쩜 충격을 덜 받은 내 모습이 더 충격적인가??

처음에는 유혹적인 표지와 항간의 소문 탓에 약간의 달달한 로맨스를 이 책에서 기대했던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길티 플레져'같은 뭔가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욕망을 깨울수 있는 에로틱한면을 기대했었답니다. 물론, 아주 없다고 할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제 욕망을 깨우기엔 좀 부족했어요. ㅋㅋㅋㅋ
오히려 점점 고딕호러스러운면이 발견되면서, 로맨스를 집어치우고 호러쪽으로 치중해서 읽으니 재미가 있더라구요. 20년전에는 그냥 성격파탄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하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모두 '소시오패스' 같더라구요. ㅋㅋ 결과적으로 더운 여름에 딱 적합한 책을 제가 고른 셈이네요. ^^


그러고보면 제가 보았던 길티 플레져류의 책표지들은 대부분 남성의 상반신 탈의 표지가 많았던것을 생각한다면 '다락방의 꽃들'은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 내용도 다를수밖에...^^;;

사실 캐시와 크리스의 죽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던 4권을 다 읽을때쯤 굳이, 캐시와 크리스가 없는 5권이 나와야했을까????했는데, 다 읽고 보니 전체 이야기와 가계도가 쫘악 펼쳐지면서 이 책을 읽어야 한가문에 얽힌 뒤틀린 욕망과 탐욕이 완전히 마무리 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동안의 고독`이 떠올랐습니다. 공통점은 한 가문과 근친상간 정도겠지만, 한쪽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악의 씨앗이 탄생하며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다면, 한쪽은 악의 씨앗이라 믿었던 그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으로 태어났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까요. 물론 그 향기를 얻기 까지 무수한 피가 거름이 되었지만.... 결국 씨앗이 문제가 아닌 꽃을 가꾸는 정원사의 손길에 따라 향기로운 꽃이 될지, 꽃도 피어보지 못한채 시들어 죽을지 결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20년전에 저는 '다락방의 꽃들' 대신 '백년동안의 고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살짝 뒤바뀐감은 있지만, 그 당시 '백년동안의 고독'이 저에게 길티 플레져와 같은 감정을 주었었거든요. 만약 '다락방의 꽃들'을 그때 읽고, 지금 다시 읽었다면 감회가 달랐을것 같아요. 가끔은 책도 읽을시기가 잘 맞을때 케미가 잘 어울려지는것 같습니다. 그 케미가 잘 맞게 책을 만날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숙이는데, 살짝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당신의 꾸미지 않은 입술에 키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야." 그가 승낙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내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 깃털 같은 입맞춤에 전율의 감각이 몰려왔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출발이라는 걸 왜 모든 남자가 알지 못할까? 살아 있는 채로 잡아먹힐 듯 다루어지고, 혀가 밀고 들어와 질식당하기를 원할 여자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나는 아니었다. 나는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싶었다. 피아니시모로 여리게, 라르고로 느리게, 레가토처럼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서 켜지고, 그러고는 크레센도로 최고조에 도달하고 싶었다. 오로지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황홀한 절정을 향해 감미롭게 가고 싶었다. 그것은 남자가 분위기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손이 희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딱 맞는 그런 키스를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중에서-
5권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던 바이올린이 되고 싶게 했던 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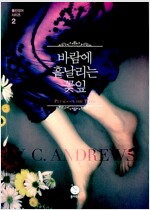



그가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숙이는데, 살짝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당신의 꾸미지 않은 입술에 키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야." 그가 승낙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내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 깃털 같은 입맞춤에 전율의 감각이 몰려왔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출발이라는 걸 왜 모든 남자가 알지 못할까? 살아 있는 채로 잡아먹힐 듯 다루어지고, 혀가 밀고 들어와 질식당하기를 원할 여자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나는 아니었다. 나는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싶었다. 피아니시모로 여리게, 라르고로 느리게, 레가토처럼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서 켜지고, 그러고는 크레센도로 최고조에 도달하고 싶었다. 오로지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황홀한 절정을 향해 감미롭게 가고 싶었다. 그것은 남자가 분위기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손이 희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딱 맞는 그런 키스를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