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정확히는 세 어절로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몇 줄로 써보려고 한다. 긴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모든 분에게 스킵을 권한다.
최근에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상화’였다. 어떤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칸트의 정의를 따르자면 오로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개인을 이용하는 태도나 행위를 말하고, 캐서린 맥키넌, 안드레아 드워킨 같은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존경하는 정희진 선생님의 정의를 가져와 보면 이렇다. 2022년 11월 30일 경향신문. 미소지니에 대한 설명과 혼재되어 있고, 대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문장은 세 문장뿐이지만 인용해 본다. 전체 글 링크는 여기에 있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 사진과 총, 캄보디아에서의 대통령 부인 ;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211300300065 )
무엇보다 ‘김건희’는 ‘엘리너 루스벨트’가 아니다. 미소지니는 여성 개인을 혐오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당연히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착하지 않다. 미소지니는 한 인간을 동일한 성격을 지닌 집단성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자는 모두, 그저 여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을 어머니와 창녀로 이분화하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내가 미소지니를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혐오라는 단어가 주는 피로감, 남성 혐오라는 황당한 대칭어의 생산, 그리고 이 문제가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지배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소지니는 상대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맘대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고인 가부장제와 동양에 대한 서구의 상상(망상)인 오리엔탈리즘, 이 두 가지가 문명의 두 축이다.
대상과 대상화는 다르다. 누구나 대상일 수 있다. 대상화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다. 이성애의 정상성은 동성애에 대한 낙인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고, 결혼제도의 정상성은 이혼과 저출산이 문제라는 사고방식이 없다면 작동할 수 없다. 흰 피부의 우월성은 흑인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것이 사고방식으로서 ‘미소지니’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

대상화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다. 타인이 나의 설명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과 상황, 환경을 동원하지 않고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나는 노트에 ‘대상화’라고 쓰고, 관련된 글을 찾아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공사다망하여 잊어버렸던 차에, 마사 누스바움의 이런 문장을 만났다.

대상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책상이나 펜을 사물로 다루는 것을 두고 ‘대상화’라 부르지는 않는다. 책상과 펜은 그 자체가 사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상화는 사물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는 사물이 아닌 인간 존재를 사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대상화는 그 대상에 인간성이 존재한다고 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더 많은 경우 완전한 인간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교만의 요새>, 41-2쪽)
대상이 가진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 그 속에 깃든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을 대상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나는 상황과 환경을,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혹은 그려내야 하는가. 이를테면, 내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혹은 나 자신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리에 눕기만 하면 5분 이내에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내게도 잠 못 이루는 며칠이 있었으니, 시몬 드 보부아르와 거다 러너와 케이트 밀렛과 실비아 페데리치를 읽은 밤에는 그랬다. <파크 애비뉴의 영장류>를 읽고, ‘a thinking woman up at night’에 대한 글을 썼다.(https://blog.aladin.co.kr/798187174/9196710) 2017년이었다. 끝없는 고민이 확고한 결정으로 바뀐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결심을 했고, 올해는 그 결심이 나의 실제가 되었다.
사회적 고용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서 보냈던 나의 19년을, 나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나의 노동은 여전히 국가 GNP 속에 계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가족들이 나의 노동과 노력을 인정해 주고 고마워하는 것과 상관 없이, 나는 여전히 사회 속의 ‘보이지 않는’ 존재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19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은 ‘돌봄 노동’의 범주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하얀 빈칸에 그걸 적을 수는 없었지만, 또한 그것밖에 적을 것이 없었고.
며칠 후, 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 통지서’ 내용을 담은 카톡을 받게 되었다. 보이지 않던 존재였던 나는, 비로소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일을 하면 하는 대로, 일한 시간에 맞춰 돈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해주어 내게 힘을 줬다. 혼자 있을 때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급기야 어느 금요일 밤에 교회에 갔을 때는, 설교와 찬양, 기도 순서가 끝나고 각자 통성기도를 할 때, 키보드를 치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제가 나눌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그 사랑을 조금씩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면서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정한 사람이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내게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몇 배 더 힘든 일이었으니. 나는 자주, 아주 자주, 염려와 걱정, 실망과 자괴감으로 점철된 저녁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내가 이러려고 19년 만의 대탈출을 감행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익숙했던 나. 퇴근하고 그다음 날 출근하는 그 놀라운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겨우 20여 일 맛본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을 느끼기에 이른다. 우리 각자는, 각자 삶의 무게를 견디고 산다. 8살짜리는 8살짜리 대로, 12살짜리는 12살짜리대로, 30대는 30대의 무게를, 40대는 40대의 무게를 각자 지고 산다. 그만두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8살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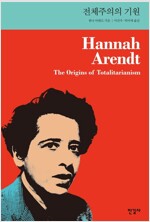
그리고 밤에는 책을 폈다. 10분 뒤에 고개를 떨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책을 펼쳤다. 아렌트를 펼치는 밤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함께 하기도 했다. (우리, 아렌트 읽을 때는 옆에 꽃바구니 놓고, 화병에 꽃 꽂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이 시간을 산다.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할지, 혹은 설명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고, 또 모르겠지만. 샬럿 브론테를 모방해 내가 쓰려는 그 한 문장을 여기에 쓴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 문장이다.
독자여, 나는 취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