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 고흐 「해바라기」 1888년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청년 화가 L을 위하여 -
함형수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碑)돌은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오늘 중앙일보의 ‘나를 흔든 시 한 줄’이라는 코너에 유종호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 함형수의 ‘해라바기의 비명’을 소개했다. 아침에 만난 반가운 시였다. 그러나 옥에 티가 있었다. 시에 오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의 부제가 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이 수록된 시집은 1989년 문학과 비평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나 현재 절판이다. 지금은 그의 시집은 eBook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부제는 ‘청년 화가 L을 위하여’다. 신경림 시인은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시 중의 하나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그가 쓴 책『시인을 찾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시의 분량이 적다해서 별 볼일 없는 시인이 아니다. 시는 질로 따져야지 양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가 남긴 시는 ‘해바라기의 비명’ 단 한 편뿐이지만, 수천, 수만의 시인들 가운데 단 한 편의 ‘해바라기의 비명’이 없는 시인이 허다하다”고 썼다.
여름의 뙤약볕에도 굴하지 않고 태양을 마주하던 해바라기는 가을이 되면 절로 고개를 숙인다. 마치 사람의 한 생애를 닮았다. 피 끓는 청춘의 시절 당당하게 고개 들고 운명과 대결하던 이들도 나이가 들면 운명과 맞서려 하지 않는다. 그 부질없음을 알게 된 까닭이리라. 대신 불멸을 꿈꾼다. 누구든 죽고 나서 흔적 하나쯤 남기고 싶어 한다. 훗날 ‘참 잘 살다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 노란 해바라기와 보리밭, 무덤, 태양, 꿈, 그리고 부제를 보면 이 시는 화가 반 고흐의 꿈과 죽음을 소재로 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반 고흐가 자살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이 시의 모티브로 등장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 함형수가 반 고흐처럼 정신착란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반 고흐는 정신질환 속에 권총 자살했으며, 그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예술적 동지였던 동생 테오 역시 형이 세상을 뜬 지 6개월 만에 정신착란으로 숨졌다.
두 형제는 밀밭과 해바라기가 있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에 나란히 묻혔다. 생전에 작품이 팔리지 않았던 반 고흐의 쓸쓸함, 이와 대비되는 열정적이고 눈부신 예술세계, 형제의 죽음 등이 함형수의 시에 무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숙연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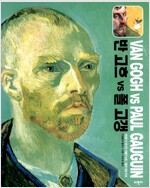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폴 고갱과 함께 쓸 작업실을 장식할 목적으로 해바라기를 그린다고 하였다. 프랑스 남부의 8월에 고흐는 생의 의지를 가지고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다.
고흐는 맹렬한 속도로 그린다. 자세히 보면 그림물감이 미묘하게 서로 섞이고 있고 마르지 않은 상태의 물감을 덧칠하는 것으로 독특한 생명감을 자아내고 있다. 고흐는 꽃 그 자체의 볼륨감을 내기 위해서 물감을 충분히 발라 거듭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마치 조각과 같은 입체감이 그림으로 태어난다.

폴 고갱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 1888년
그러나 고갱은 기억을 바탕으로 창조력을 구사하는 반면 고흐는 눈앞에 모델이 없으면 그릴 수 없었다. 정반대의 화가였던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명은 대립해 우정 관계는 무너져 갔다. 그렇게 위험한 공동생활 속에서 그려졌던 것이 바로 ‘해바라기’ 그림이다. 고갱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려 그린 해바라기.

폴 고갱 「의자 위의 해바라기」 1901년

반 고흐 「폴 고갱의 의자」 1888년
두 명의 우정의 표시이기도 한 이 꽃을 한 번 더 그리는 것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관계를 수복하려고 했지만 오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의 공동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고갱이 떠난 아틀리에에서, 고흐는 다시 해바라기를 두 매 그린다. 이별의 해바라기를. 고흐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뒤, 남태평양 이국 땅에서 병마로 인해 피폐해진 예술혼을 끝까지 불태우고 있던 고갱은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을 제작한다. 저 먼저 세상을 떠난 고흐가 그리워서였을까. 의자 위에 놓인 해바라기는 생전 고흐가 의자 위 물건을 정물화의 소재로 그렸던 그림이 연상된다. 고갱은 고흐가 정신적 충격으로 한 쪽 귀를 자른 사건과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한다.
아니면 이제 곧 병으로 지친 자신의 영혼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결을 느꼈을까. 고흐의 해바라기가 태양빛처럼 이글거리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진다면 고갱의 해바라기는 거의 말라 죽을 듯하다. 노란 꽃잎이 듬성듬성 떨어져 나간 상태다.
배경과 화병조차 노란색인 이 그림은 고갱이 초록색 눈동자라고 묘사한 해바라기의 중심만 제외하고는 거의 노란색 일색이다. 보는 이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하지만, 고흐가 생의 희망을 가지고 그린 이 해바라기조차 그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열네 송이가 담긴 화병은 희망과 정열의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들은 고흐 그 자신처럼 병들어가면서도 생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하다.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처럼 고갱은 고흐를 떠나려했고, 고갱과 다투고 난 뒤 자신의 귀를 자르면서부터 고흐의 정신병적 발작은 시작되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도 그림을 그렸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림을 그렸다.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였다.
고흐의 해바라기는 예술혼의 결정체이다.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다. 지독한 신경강박증이 없었더라면 누가 청년 화가의 해바라기 은유에 대해 그토록 오래토록 기억해줄 것인가. 오늘밤도 몇 번씩 제 귀를 면도날로 오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당신, 당신이야말로 해바라기 품는 예술가임을 잊지 않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