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민석에 대해서라면 호불호가 갈린다. 아롱이는 열렬한 팬이라 할 수 있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남편도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설민석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가끔은 표현과 기교가 너무 작위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내가 틀어놓은 유튜브 클립 ‘책 읽어드립니다 – 신곡 (지옥편)’을 슬쩍 쳐다보며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뭐랄까. 말로 하기는 참 그런데 말이야, 약간 사기꾼 같지 않아? 약장사 같다고 말했었지, 내가. 큰아이는 기억을 못하는 듯한데, 내 말을 기억하는 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난 생각한다.
아롱이의 ‘우리집’ 불만사항과 희망사항은 항상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그건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 말고도 볼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텔레비전까지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결혼할 때 장만했던 텔레비전이 고장나마자마 바로 버렸었는데, 아롱이는 그게 내내 아쉬운 듯하다. 다른 집에 다녀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집에는 게임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다. 텔레비전 얼마나 한다고 우리도 하나 살까 하다가도 핸드폰, 노트북에 더해 텔레비전 리모컨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할라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텔레비전이 없어 미안하다, 아롱아. 그래도 너에겐 유튜브가 있잖니. 게임 설명 동영상을 제일 좋아하는 아롱이가 요즘에 발견한 프로그램이 ‘책 읽어드립니다’이다. 작년에는 ‘알쓸신잡 시즌3’를 즐겁게 정주행했다. 엄마아빠가 ‘알쓸신잡’류의 프로그램은 오래 시청해도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아롱이가 필사적인 서치 끝에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보석을 발견해 낸 것이다. 게다가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무려 설민석.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은 그의 강연에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1년에 책 한권을 안 읽는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독서 문화가 떨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서 문화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책읽기에 두려움이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알고 있고, 새로운 작가에게 도전할 만한 독서력을 갖춘 분들이 차고 넘치는 알라딘 마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새해를 맞이해 책 좀 읽어봐야지, 독서를 시작해 봐야지,하는 보통의 독자라면 당장 어떤 책을, 어느 작가의 책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모르니 베스트셀러 중에서 책을 고를 수 밖에 없고, 베스트셀러란 정말 단순히 많이 판매되는 책일 뿐이어서,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할 확률은 더 높다.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기는 쉽지 않고, 다시 일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독자의 수만 더해질 뿐이다.
이런 경우 <책 읽어드립니다>류의 교양을 위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 대한 요약, 설명을 설민석이 전부 도맡아서 진행한다는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책소개 시간을 마치면 소설가, 음악가, 과학자,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데, 독서 모임 특유의 독서 수다가 재미있고 유익하다. 줄거리 소개, 인용해 주는 문단 등을 통해 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은 물론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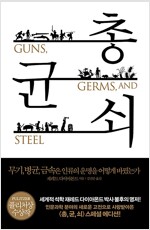



방송을 이어보지는 못하지만 몇 개의 클립을 연속해서 보게 되었던 건, 선정된 책들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사피엔스』, 『총,균,쇠』는 재미있게 읽었던 것들이라 책수다를 듣는 일이 한결 즐거웠고, 『징비록』은 꽤 괜찮은 책의 발견이라 할 만했다. 『데미안』은 아직까지도 이 책을 읽지 않은 나를 원망하게 했고, 『멋진 신세계』는 어느 출판사로 읽을까 바로 번역본을 검색해 보게 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한 책은 단테의 서사시, <신곡-지옥편>이다. 『단테의 신곡』은 완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스타브 도레의 음산한 그림을 보고 싶어 대출했고, 박상진 번역의 민음사판도 준비해 두었다.
우리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백 만년전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 겨울. 떼로 이동하는 패키지 관광객들답게 산타 크로체 교회 앞에서, 우피치 미술관 앞에서, 단테의 생가 앞에서 잠시 버스에서 내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의 글을 한 줄도 읽지 않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이리저리 사진 찍기에만 바빴는데, 지금 단테의 시를 이렇게 펼쳐놓고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고 있자니, 단테의 흔적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시를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간을 되돌리는 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단테를 읽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테, 오늘은 단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