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이글먼의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미뤄두었던 대히트 전작을 먼저 읽었다.

많고 많은 뇌과학 책 중에서 평도 좋았는데 띠지의 저자 얼굴이 맘에 안 들어서 미뤄두었던 책이다. 뇌과학이라면 어쩐지 양자역학과 더불어 사기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야 내가 이해할 자신도 이해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읽었으니 나를 칭찬해 줍니다.
전작 <더 브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 는 것이다. 쉽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구별 못하는 (아이들이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 뉴스에서 배웠는데 아직도 걔가 얜지 아닌지 모름) 생물 무식쟁이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심지어 재미있게. (하지만 벌써 이 책 리뷰에대한 신뢰도가 하락함)
2킬로그램 안되는 회백색 물컹거리는 인체 부위 뇌는 여러 신경 세포들 사이, 시냅스 사이에 전기 자극/신호를 주고 받는다. 저자의 생생한 묘사대로 컴컴한 골방, 혹은 상자에 들어있는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로 여러 색과 소리, 맛과 촉감 등을 '느낀다.' 그런데 그 신호들은 때론 기만적이기도 하며 양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데카르트와 장자의 철학적 고민을 저자는 뇌과학자답게 설명한다. 여러 신호를 받은 뇌가 다시 신호를 되보내 여러차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뇌가 디즈니 만화의 여러 감정들의 헤드쿼터처럼 우리 신체의 반응을 총괄 지휘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의외로 장내 미생물이나 호르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되먹임('더 브레인'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만 신간에서는 '피드백'이라고 씀) 과정에 외부세계 특히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의 뇌는 제 역할을 해 내며 성장할 수 없다. 그와는 달리 신체의 감각 수용(전달) 기관인 눈, 귀, 팔과 다리의 장애와 심지어 뇌 자체의 결점(상해 등)은 뇌의 놀라운 '적응'(이글먼은 '생후배선'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작용으로 어떻게든 외부세계에 개인을 연결시켜 준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너무나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긴 생애에 걸쳐 계속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외부세계에 자신을 투영하며 성장하고 기억을 만든다. 자, 그럼 누가 진짜 나인가. 사지육신 눈동자 얼굴 너머에 있는 내 뇌 덩어리?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을 (응 아님, 거기 없어요) 기억과 스페셜한 나의 아이덴디티? 이 뇌만 잘 보존한다면, 컴에 이식 혹은 업로드 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잖겠음? ... 이라는데 까지 저자는 이야기를 펼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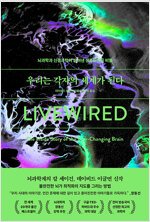
이런 놀라운 뇌의 적응, 가소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신간에 실려있다. 시각이나 청각을 잃은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장애를 가진 신체 부위를 우회해 바로 뇌로 신호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소개된다. 여러 웨어러블 기기들이 실험(+사용) 중인데 저자의 회사도 그런걸 만든다고. (주식 검색을 해봅니다) 얼핏 언급이 지나가는 '바이오 해커'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의족이나 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바로 그 인공적 '신체'까지가 뇌가 인식하는 나의 자아/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저자는 뇌의 불완전한, 즉 무궁한 발전 가능성 혹은 적응력을 AI가 따라오기 힘들다고 말한다. 전작에서 나 자신을 머리, 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기 자극과 신호들로 수렴해보았듯이 이번엔 뇌의 가소성, 변화 가능성, 외부 세계로 상상을 한없이 뻗어간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 수리(?) 건물 등. 대륙 간에서 신호를 주고 받아 행해지는 신체 아바타 실험들은 이제 sf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인간은 생체 신호들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에서 기계와 다르고, 인간의 기억과 결정 행위에는 주름 갯수의 몇 배의 가설이 존재한다. 더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엄연히 있다. 저자는 번역본 제목의 문장으로 책을 맺는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이다. 나를 둘러싼 사회, 문화, 시간에 걸친 기억과 경험들이 뇌의 활동 덕으로 나를 이루고 세계와 연결시킨다.
전작 '더 브레인'에 비해서 신간은 좀 덜 재미있었다. 동일 주제의 책을 연달아 읽는 것은 이 책들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흥미'와 목적 의식/의욕을 떨어뜨리기에 뇌가 좀 지쳤나보다.
저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야기를 능숙하게 끌고 간다.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주 저 짝에 내 뇌만 동동 떠다녀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내놓는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있다. 기계 문명도 인간의 뇌도 모두들 너무나 건강하고 활짝 웃고 있어서 읽다보면 좀 겁도 나고 지친다. 그가 다루지 않은 무력한 뇌, 수동적인 뇌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더해서 인간의 욕구나 감정, 온갖 비이성적 감정들(실연과 가족의 죽음 후에 느끼는 슬픔은 뇌의 항상성으로 설명이 되지만서도)과 의식적 결정(그리고 외부세계로의 내 자아의 발산 혹은 표현)이 뇌와 어떻게 협력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다. 뇌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아직은.
하지만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과학자들은 뇌를 자르고 쑤시고 들여다보는 실험으로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있다. 책을 읽고 내가 곡해/오해 했을까봐 (그리고 내 무식이 탄로날까봐) 정리를 안하려고 했던 페이퍼를 용기내서 적어봤다.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아닌가? 이거 내 뇌 속의 어떤 긍정 신호가 온건가?) 그래서 뇌과학/기억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한다. <스틸 앨리스>의 저자가 쓴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