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차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포용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가 저급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저급한 편견이 사회에 팽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차별화에 따른 차등적 보상원리가 모든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나아가 사회 · 경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분배정책이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마음껏 재능과 창의를 발휘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결과의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분배 위주 정책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면 남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개혁의 기본 방향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쪽으로 설정돼야 한다. 문제는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살맛 나는 사회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국 재벌만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착각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줬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이다. 이 문제점은 상대방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국가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좌파의 선동으로 우기는 박사모,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혐오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믿는 ‘도덕’을 내세운다. 이 ‘도덕’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정반대인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도덕을 몰이해하는 성향이 타인에 대한 무지한 편견을 만들어낸다.

* 앨런 G. 존슨 《사회학 공부의 기초》 (유유, 2016)
차별과 편견을 용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런 존슨(Allen G. Johnson)은 어떤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을 공부한다고 말한다. 사회학은 사회의 고통이 특정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을 알아내고, 그 잘못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학은 ‘우리 자신에 관한 학문’이면서도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다.[1] 이러한 사회학의 기본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 공동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다. 이러면 이성의 힘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사회 문제를 오로지 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원인 탓으로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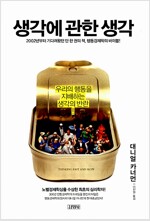
*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김영사, 2012)
우리는 사회 전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진리 또는 문화를 의심과 검증의 여지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직관’을 의미하는 ‘빠른 사고(시스템 1)’와 ‘이성’을 뜻하는 ‘느린 사고(시스템 2)’가 충돌하면, 직관이 인간의 판단과 생활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리의 뇌는 느리고, 복잡한 과정의 절차를 싫어한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손쉽게 결정하려는 직관에 의존한다. 문제는 이 직관을 ‘합리적 이성’으로 착각하게 된다. 즉 자신은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신뢰한다. 사회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안정을 지향할수록 이성의 힘이 약해진다.
태극기 집회에 나서는 박사모나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그들이 용돈 벌기 위해 태극기를 들면서 ‘종북 척결’,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고 외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최소 저항의 길’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최소 저항의 길’은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서 간편한 절차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2] 박사모 회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장에 모이는 노인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 보수’로서의 의무감을 내세워 태극기를 휘날린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항하는 ‘태극기와 성조기 콜라보 집회’를 열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좌파 세력이 음모를 꾸민다’ 식의 허위 선동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노인들은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레드 콤플렉스를 교묘히 이용한 허위 선동을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서해문집, 2016)
박사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응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일이다. 현 정부는 색안경을 낀 채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도 넘은 행동과 비하 발언을 용인하고 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하 행위가 권력의 힘에 기댈수록 위험해진다. 권력과 결합한 비하 행위는 상대방의 도덕적 가치를 낮게 보는 ‘부당한 차별’이 된다. 즉 비하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의 ‘도덕’에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반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덕’이 잘못되었다고 무시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회 구성원은 HSD(history of mistreatment or current social disadvantage) 속성을 가지게 된다.[3] 기성 집단은 이 HSD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비하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세월호 사고 소식에 지친 사람들이 ‘최소한 저항의 길’을 택한 지 오래됐다. 그들은 세월호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형성된다. 비록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차별이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차별과 비하 행위에서 비롯된 불의의 사태를 방관하는 것이다.
[1] 앨런 G. 존슨 《사회학 공부의 기초》 14쪽
[2] 같은 책, 44쪽
[3]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