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군가가 먼저 죽음을 주제로 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 죽음이 너무 무섭기 때문일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죽음은 먼 옛날부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만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생각해낸 게 두 가지 묘책이었다. 하나는 지옥이나 천국과 같은 내세의 관념을 만들어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 이른바 불멸성이다. 이로써 삶의 유한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죽음을 멀리 떼어놓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애써 부정하여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려 든다. 마치 햇빛 아래서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 노베르트 엘리아스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2012)
* 셸던 솔로몬, 제프 그린버그, 톰 피진스키 《슬픈 불멸주의자》 (흐름출판, 2016)
나와 그림자가 하나이듯이 삶과 죽음도 별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외면하거나 알려 하지 않는다. 죽음은 삶의 끝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여긴다. 과거엔 가족이 시한부 환자를 부양했고, 삶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까지 시한부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죽어가는 순간이 가까울수록 가족과 사회에서 더 멀리 배제된다. 특히 의료체계는 죽음과 죽음을 환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격리한다. 죽어가는 자는 중환자로 격리되며, 시신은 영안실의 싸늘한 침대 위에 눕혀진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노화는 실버타운에 격리된다.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는 현대 문명이 죽음을 손쉽게 숨길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 과거의 죽음은 두려우면서도 친숙한 개념이었다. 과거에 아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아이들은 세 살 무렵부터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주1].


* 에밀리 디킨슨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민음사, 2016)
* 에밀리 디킨슨 《디킨슨 시선》 (지만지, 2011)


* 한국현대영미시학회 엮음 《현대 영미 여성시의 이해》 (동인, 2013)
* 박재열 《미국 여성시 연구》 (L.I.E, 2009)
시인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민낯을 아주 가까이서 봤다. 그녀가 아홉 살이었을 때 이사 간 집 주변에 묘지가 있었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을 자주 지켜봤다. 죽음은 그녀의 일상에서 멀지 않은 것이었다. 디킨슨은 친구, 자신과 정서적으로 교류를 나누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다. 그래서 디킨슨은 죽음과 불멸을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썼다. 그녀는 일상의 삶과 죽음이 동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디킨슨에게 죽음은 자신과 무관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일이다.
디킨슨은 자신의 죽음을 여러 가지 상황과 이미지를 통해 상상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
나는 내 두뇌에 장례를 느꼈네.
조문객들이 이리저리
밟고— 또 계속해서 밟았고—
마침내 감각이 완전히 터지는 것 같았다네—
그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추도식이, 북처럼—
울리고— 또 계속해서 울렸고—
마침내 내 마음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이 관[주2]을 들어 올렸고,
똑같은 납 장화가 걸으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시, 내 영혼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공간이— 조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네.
모든 하늘이 하나의 종이 되었고,
존재는 단지 하나의 귀가 되었고,
나와, 침묵은 어느 이방의 종족이 되어
여기서, 외로이, 난파되었다네—
그런 다음 이성의 널빤지가, 부서졌고—
나는 아래로, 또 아래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곤두박질치며, 별 세계와 부딪쳤고,
그제야— 마침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끝이 났다네—
(No. 280, 윤명옥 옮김, 《디킨슨 시선》, 29~30쪽)
I felt a Funeral, in my Brain,
And Mourners to and fro
Kept treading — treading — till it seemed
That Sense was breaking through —
And when they all were seated,
A Service, like a Drum —
Kept beating — beating — till I thought
My Mind was going numb —
And then I heard them lift a Box
And creak across my Soul
With those same Boots of Lead, again,
Then Space — began to toll,
As all the Heavens were a Bell,
And Being, but an Ear,
And I, and Silence, some strange Race
Wrecked, solitary, here —
And then a Plank in Reason, broke,
And I dropped down, and down —
And hit a World, at every plunge,
And Finished knowing — then —
화자(디킨슨)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상상한다. 조문객들이 지나가가면서 생기는 발소리는 화자의 감각을 터뜨리게 만든다. 죽은 자를 추도하기 위해 울리는 북소리는 화자의 마음을 마비시킨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조종(弔鐘) 소리는 화자의 환청이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변인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혼자서 감당하는 시인을 예민하게 만든다. 시인의 정신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은교 시인은 시 280번의 4행을 “다리에 아무 감각도 없어진 듯할 때까지”라고 번역했다.
장례행렬이 지나가네, 머릿속으로
애도자들은 이리저리
걸어가네 — 걸어가네 — 마치
다리에 아무 감각도 없어진 듯할 때까지.
(No. 280, 강은교 옮김,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27쪽)
강은교 시인은 원문의 “Sense was breaking”을 ‘감각이 없다’는 의미로 의역을 했다. ‘breaking’은 ‘파괴’를 뜻한다. 윤명옥 교수는 “감각이 완전히 터진다”라고 옮겨 썼는데, 이 번역문을 읽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한 시인의 감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디킨슨의 시 465번은 임종 직전의 상황을 그린 내용이다. 그녀는 이 시에 독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존재’를 등장시켜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린다.
나는 임종 때에— 한 마리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네.
방 안의 정적은— 폭풍과 폭풍 사이에 있는—
공중의 정적과 같았다네—
빙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도 마르고—
숨소리도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네.
왜냐하면 왕께서 그 방에— 임종 증언을 위해
현현하는 순간의— 그 마지막 입성을 지켜보려고—
나는 내 유품에 대해 유언을 했고— 내 소지품을
어떻게 나눠 가지려는 것에 서명을 했다네—
그런 다음, 한 마리 파리가 날아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네—
푸른— 정체불명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빛과— 나 사이에 훼방을 놓았네—
그러더니 창이 가려졌고— 그런 다음
나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네.
(No. 465, 윤명옥 옮김, 《디킨슨 시선》, 63~64쪽)
죽음을 앞둔 상황,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화자는 죽음에 초연한 모습이다. 윤명옥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의 내용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는 기독교적인 전통에 반한다. 이 시에서 말하는 ‘왕(king)[주3]’은 죽어가는 화자의 눈앞에 나타나 그/그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신성한 분위기를 망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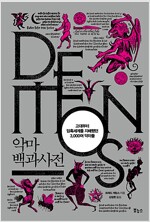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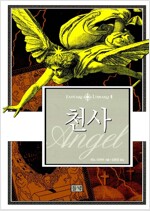

* 프레드 게팅스 《악마 백과사전》 (보누스, 2014)
* [품절] 마노 다카야 《천사》 (들녘, 2000)
* 마노 다카야 《타락천사》 (들녘, 2000)
‘왕’과 ‘파리’는 대조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신’과 ‘악마’의 대립 구조를 연상시킨다. 디킨슨의 시에 나타난 파리는 ‘베엘제붑(Beelzebub)’ 또는 ‘벨제붑’으로 알려진 악마를 상징한다. 베엘제붑의 본래 이름은 바알제불(Ba’al Zebul)이다. 히브리어로 ‘하늘의 주인’을 뜻한다. 베엘제붑을 신으로 숭배하는 셈족(Semites)의 신앙을 적대시한 유대인들은 이 호칭이 그들이 존경하는 솔로몬 왕(Solomon)을 떠올린다는 이유로 히브리어로 ‘파리의 왕’을 뜻하는 바알제붑(Ba’al Zebûb)으로 바꾸어 불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악마를 가리킬 때 ‘베엘제붑’을 쓰기 시작했다. 베엘제붑은 지옥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악마이다. 사탄(Satan), 레비아탄(Leviathan)과 더불어 타락 천사 3대장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베엘제붑이 누군지 몰라도, 록밴드 퀸(Queen)의 대표곡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를 질리도록 들어 본 사람이라면 이 특이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절정에 이르는 오페라 파트 마지막에 “Beelzebub has the devil put aside for me”라는 노랫말이 나온다.
오늘날의 죽음은 삶의 뒤편으로 밀려난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이방의 종족”이다. 그렇지만 디킨슨처럼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죽음의 얼굴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아주 많이 관심을 보이면서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거나 외면해버린다. 막연한 공포감과 거부감에 짓눌려 죽음을 외면하는 게 과연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 디킨슨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삶에 대한 애착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죽음과 타협하는 방법을 알려고 했다. 죽음에 관한 디킨슨의 시는 독자에게 ‘삶과 함께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제목에 대한 주]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크로스, 2018.
[주1] 셸던 솔로몬 외, 이은경 옮김, 《슬픈 불멸주의자》, 48쪽.
[주2] 박재열 교수는 원문의 ‘Box’를 ‘상자’라고 직역을 했는데(《미국 여성시 연구》, 43쪽), 시의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 ‘Box’는 시신을 안치하는 ‘관(coffin)’을 상징하는 단어로 봐야 한다.
[주3] 강은교 시인은 ‘죽음의 왕’이라고 번역했다(《고독은 잴 수 없는 것》, 73쪽). ‘king’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신(God)’을 상징하고, 신의 권위를 깨뜨리는 존재가 ‘파리’이다. 따라서 ‘king’을 ‘죽음의 왕’으로 보기 어렵다. 파리야말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서 나타나 신과 대립하는 ‘죽음의 왕’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