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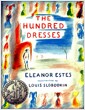
-
The Hundred Dresses (Paperback) - 『내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원서, 1945 Newbery ㅣ Odyssey Classics 16
엘레노어 에스테스 지음, 루이스 슬로보드킨 그림 / Harcourt / 2004년 9월


[책을 펼치는 순간 글과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삽화가 눈길을 끌었어요.]
[남들과 다른다는 이유로 피하게 되는 사람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완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네요.]
[완다를 놀리는 페기와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볼수밖에 없었던 매기.
어쩜 완다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줄 모르고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페기보다 그런 행동들이 잘못인줄 알면서도 방관하는 매기가 더 마음이 불편했나봅니다.]
[세실의 아름다운 옷 때문에, '백벌의 드레스' 게임은 시작되게 됩니다.]
[페기의 단짝인 매기도 사실은 가난한 소녀였어요. 완다처럼 한벌의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페기의 헌옷을 고쳐입어야하는 매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다의 편을 든다는것은 자칫 자기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수 있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방관자인 아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왜 '완다'가 책을 읽지 못하는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다의 성을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금방 눈치채실수 있을거예요.
]
[완다가 그린 100벌의 드레스. 오른쪽 맨 아래의 2개의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완다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매디와 페기는 완다의 집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완다는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차마, 사과의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대신 '완다'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했다며 다정한 마음을 담아 매기와 페기는 완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매기는 완다가 준 그림을 보면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다가 매기와 페기에게 준 그림은 그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분명 완다는 애정을 담아 이 그림을 그렸을거라 믿으며 두 소녀들의 마음은 비로서 웃을수 있었습니다.]

[100벌의 드레스 속에서 페기와 매기를 알아볼실수 있나요?]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할지 모를때,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뉴베리상'을 수상한 작품을 고르는것이예요. 딱 제 수준에 맞는 영어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학이다보니 감동과 재미 게다가 교훈까지 확실히 전달해주거든요.
그래서 'The Hundred Dresses' 도서를 정보 없이 선택하게 되었는데, 책을 읽은후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백하기도 부끄럽지만, 바로 제가 '페기'와 '매기'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점점 잊혀져보내고 있지만, 혹 '완다'였던 그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다니는건 아닌지 오래전부터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때 나를 친구라 생각했던 그 아이는, 내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초대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때 우리반에서 그 아이의 집을 알고 있었던것은 저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너무 이상했던 집과 가족을 보고 점점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를 거부했었답니다.
어느날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의 집을 알고 있던 나를 선생님께서 찾아가보라고 시키셨을때는 너무 귀찮아했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정말 그 아이는 이사를 가서 더 이상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을때, 너무 너무 미안했었던 혹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아이를 놀리거나, 그 아이의 집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친구라고 여겼던 제가 더 이상 그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상처를 주었을것 같아요.
어쩜 저에게 그 아이가 이사를 간것은 아버지 직업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설명하시는 담임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담임선생님은 아셨던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게는 약간의 위로를 주었었으니깐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 당시가 떠오르면서, 새삼 완다에게 편지를 보낼수 있었던 매기와 페기가 부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