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30여 년 전, <안네의 일기>는 <중학교 1학년 필독 도서> 중 3월의 도서였다. 데어라 혼의 이 책에는 <안네의 일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를 추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제목과 겹친다.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안네의 일기>가 그토록 사랑받은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요구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당시 암울하고도 묘한 유럽의 상황 속에서도 ‘탈출’ 혹은 ‘이사’ 혹은 ‘이민’ 가지 않은 독일계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었다. 레비는 썼다. ‘그들은 자신들을 독일인으로 생각했다.’ 이미 충분히 독일 사회에 동화된 유대인들은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출한 독일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 제반 여건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정치적 지분을 확대해 가던 히틀러가 정치의 정점에 섰을 때, 독일인들은 독일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직장에서 내쫓고 재산을 빼앗고 학살했다. 이는 하얼빈을 대도시로 만들어 낸 유대인들의 몰락과 닮아있다. 그들은 정부에 협조적인 자신들의 태도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그저 ‘사라져야 할 어떤 사람들’, ‘유대인’일 뿐이었다.

2.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최근 알라딘 이웃님과의 대화에서도 썼듯이, 나는 ‘글쓰기가 (결국엔) 잘난 척’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고, 이 책은 그 어떤 책보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책이다. 근데 이 책만 펴면 (심하게) 졸리고 책장도 안 넘어가는, 세상 읽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앞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2부 <정교한 조율: 관찰과 해석>부터 읽고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노트에 적어보았다.
1. 전자기력 대 중력의 비율(즉 전자기력/중력)
2. 강한 핵력
3.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4. 우주 척력(cosmic repulsion)
5. 중력의 속박력 대 정지질량 에너지의 비율인 Q
6. 공간 차원의 숫자인 D
우주 탄생의 결정적 요소인 이런 기본 상숫값들이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우주의 진화는 다른 경로를 밟았을 것(260쪽)이고, 태양계의 구성 역시 달라졌을 것이며, 지구는 현재처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행성이 아닌 다른 모습의 지구일 것이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오차 없이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차근차근 진화의 과정을 밟아온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는 물론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주 아주 오랫동안.

3. 견딜 수 없는 사랑
나는 오랜 시간 한 사람(만)을 좋아했고, 또 내 사랑은 응답받지 못했기에 나는 그(런) 사랑 고백에 마음이 금방 말랑해진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부탁을 들어 주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다. 츠바이크의 <낯선 여인의 편지>를 기억나게 하는 이 소설에서도 절절한 러브레터 몇 편이 소개되는데, 부끄럽고 안타까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듯한 이야기가 애절하게 펼쳐진다. 지독한 사랑.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저 멀리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자막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죽었다. 몸속에서 온기가 퍼져나갔다. 일종의 자기애였다. 나는 두 팔로 나 자신을 꼭 끌어안았다. 필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우연히도 살아남았다. 제드 패리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은 이때였다. 그의 길고 여윈 얼굴에 고통스러운 의문이 떠올라 있었다. 곧 벌을 받을 개처럼 불쌍한 표정이었다. 이 낯선 이의 맑은 청회색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던 그 1~2초 동안, 나는 살아 있음을 자축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야겠다는 마음도 잠깐 들었다. 내 생각이 화면에 흐르고 있었다. 이 친구, 충격이 크군.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36-7쪽)
죽음의 우연성과 필연성에 대한 이런 평범한 문장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저 남자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다.’ 저 남자는 (인간의 운명을 따라 결국엔) 죽었고, (언젠가 죽을 운명의) 나는 (지금은) 살아 있다. 언제까지 살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 채로. 살아 있다, 아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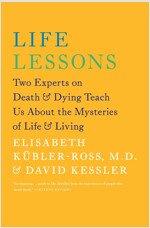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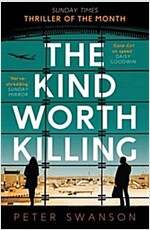
4. 행복의 약속, Life Lesson, The kind worth killing
그래서 지금 읽는 ‘중’인 책은 이렇게 세 권. <행복의 약속>이 계속 진도가 지지부진해서 걱정이다. 5월의 책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바쁘다. <Life Lesson>은 모두 옳은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라 지루할 듯싶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일화가 흥미롭게 읽힌다. (진도에 맞춰) 부지런히 읽고 있다. 피터 스완슨의 책은 두 번째인데 아직까지는 재미있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 죽나 안 죽나, 그게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최근 몇 개월 중에 지난달에 책을 제일 많이 산 듯하다. 앨리스 마우스패드와 앨리스 문진 때문이다. 앨리스 문진은 진짜 너무 완전 예뻐서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 이제 (책을) 읽기만 하면 되겠다. 책과 책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