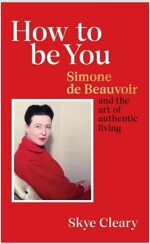
저자 Skye Cleary는 호주 출신의 철학자다. PhD MBA 로 해당 분야에서 십 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 Columbia 대학과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작가 소개를 읽어보니 태권도 검은띠에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한다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인데 어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뤄냈는지 놀라울 뿐이다.

표지 정면의 보부아르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책은 보부아르 연구서다. 전기처럼 보부아르는 일생 전체를 조망한 것은 아니고, 보부아르의 저서만을 연구한 책도 아니다. 저자가 선택한 주제어(성장, 우정, 사랑, 결혼, 모성, 노화, 죽음) 등에 맞추어 논의를 이어가는데, 대체적으로는 특정한 개념에 대한 보부아르의 주장 혹은 입장을 보부아르 개인의 삶과 연결해 살펴보고, 보부아르의 소설 속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간간히 실려 있는데, 유자녀 기혼 여성이고 동년배라서 (동갑 아님) 더 가까이 느껴지는 면이 있었다.
The philosopher Albert Camus, winner of the 1957 Nobel Prize in Literature and once a friend, said that she humiliated French men. Some condemned her writing as pornography. In later memoirs, recounting the reception of The Second Sex, Beauvoir pointed out the double standards that applied to her: while it's normal for men to discuss women's bodies, when women talk about it, they're branded as indecent. (12)
『제2의 성』에 대한 프랑스 남성들의 거부감 그리고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판매량 등은 내내 유명한 이야기일 텐데, 카뮈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 책을 통해 알게 됐다. 그 두려움과 분노,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인류 역사의 발흥과 함께 시작되어 오 천년을 이어져 온 가부장제 하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비이성적이고 동물적이며 주체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나요. 네? 카뮈?
This is Hegel's master-slave dialectic: When two people meet, one tries to dominate the Other. If both hold their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equally, they form a reciprocal relation - although it could be either antagonistic or amicable. However, if one succeeds in dominating the Other, it becomes a relationship of oppression. (57)

헤겔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한 변증법의 몇몇 대목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더 잘 들어맞는다. 헤겔에 의하면, 주인의 특권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생명에 반해 정신을 주장한다는 데서 온다. 그러나 정복된 노예 역시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 반면에 여자는 본래 생명을 주지만 자기 목숨을 걸지 않는 실존자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결코 싸움이 없었다. 헤겔의 정의는 특히 여자에게 적용된다. "다른 [의식]은 의존적 의식인데 그 의식에게 본질적인 현실은 동물적 생명, 즉 다른 실체에 의해 주어진 존재다.". (『제2의 성』, 112쪽)
『제2의 성』의 타자에 대한 설명과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한 설명은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영어이기도 해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헤겔(헤결 말고 헤겔) 잘 아는 사람에게 과외 좀 받아야겠다. 마침 『정신현상학』에 대한 새 번역이 출간되었다고 한다. 바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축하드린다.


기억에 남는 문단은 여기를 고르고 싶다.
I spent long dark hours slouched in an armchair, nursing and cuddling until my arms ached and my shoulders cramped. Like a cow, I produced milk. I could have stopped the flow, but in the Australian culture in which I lived at the time, there was a strong theme of ‘breast is best'. Good mothers breastfeed, so they say. The influence of attachment parenting has been stifling in the United States, too. One friend told me, '[Attachment parenting] made me feel so inadequate as a first-time mom.' (135)
결혼 이후에 여성에게 혹은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여러 ‘의무’(라고 여겨지는 억압) 중에서 나는 ‘식사 준비’가 가장 어렵다. 입덧하지 않았고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는 임산부였고, 출산 때에도 과정 내내 거의 ‘제정신’이었던 나였다. 돌봄 노동, 감정 노동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먹을 것’을 챙기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이것을 여성의 일이라 ‘규정’함으로써 남성들이 누리는 무한한 자유의 무게만큼, 이 세상 모든 여성은 계급에 상관없이 ‘메뉴 선정’과 ‘밥 차리기’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먹는 것을 싫어하거나 꺼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다만, 차려진 밥을 좋아한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시겠지만, 차리는 수고를 ‘마다하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번거로움이 주는 포만감의 기쁨 대신 ‘하지 않음’의 결과인 배고픔을 선택하는 (게으른) 사람이다. 엄마가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 주시는 밥도 잘 안 먹는 나였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 토요일에는 시댁, 주일에는 교회 가다 보니 쌀이 썩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달라졌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야 했고, 먹여야 했다. 잘 먹지 않을 때도 많으니 그럴 때는 각종 미디어(유튜브)와 장난감(성대모사 필수), 과자(고래밥)를 동원해 달래서 먹여야 했다. 아기 때는 이유식, 조금 커서는 어린이 반찬, 그다음에는 고기반찬. 내가 먹지 않아도 먹기 싫어도, 준비하고 만들고 먹여야 했다. 인생 이 정도 살고 나서야,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하루에 꼭 세끼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삼시세끼’라는 말이 생겼는지. 그 말을 최초로 만들어낸 그 사람을 만나 차근히 오래오래 따지고 싶었다.
예전에 알라딘 친구가 자기는 좋아하는 책 집중해서 읽을 때는, 라떼랑 쿠키 먹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냉동식품, 반조리식품, 반찬가게에서 사 오는 반찬의 도움을 받는 나 같은 사람도, 매일 매일 쉼 없이 이어지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안 먹을 수 있지만, 자식은, 새끼는 먹여야 하니까.
이 문단에는 모유 수유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나도 작은 아이를 15개월 모유 수유했는데, 젖소 부인 ‘같다’가 아니라 진짜 젖소가 된 기분에 울적한 적이 많았다. 비린내 때문에 잉어는 먹을 수 없었지만, 한약방에서 특별 제조 및 판매하는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한약에 우유, 두유, 따뜻한 모든 음식을 동원해 온몸을 공장처럼 돌렸다. 종종 젖이 부족했다. 더 먹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달래서 재운 적도 있었다. 아이가 곯아떨어지면, 배가 부른데도 다시 새로운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유를, 두유를 한없이 마셔댔다. 24시간, 연중무휴. 공장은 쉴 수 없었다. 이제 아이들이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오는 시절이 되었다. 더 이상 내가 해준 밥을 먹지도, 그리워하지도 않는 아이들. 아쉬움과 해방감이 교차한다. 물론 해방감이 훨씬 더 크다. 라떼와 쿠키, 자두의 시대가 왔다. 드디어.
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진 시간 되시겠다. 앞쪽을 넘겨보니 8월 30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잠깐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책을 가지고 다녔다. 책읽기가 습관이 안 된 사람들에게 책읽기를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어디에 가든 책을 가지고 다녀라’라고 하던데, 우리 모두 그러지 않나. 항상 가방에 책이 2권 이상 있지 않은가. 들고 나간 책이 재미없을 경우 낭패이므로 여분의 책을 준비하고, 여행 갈 때 제일 즐거운 고민은 ‘무슨 책 가지고 갈까?’이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크레마 챙기고, 이북도 미리 다운받아 놓고. 우리 모두 그러지 않는가. 나도 그랬다. 어디에 가든 책을 가지고 다녔고, 틈날 때마다 사진을 찍었다. 그중 잘 나온 사진으로만 엄선해서 업로드한다. 책을 읽긴 읽은 거냐, 책이 소품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책은 다 읽었고, 책은 제일 예쁘고 근사한 소품이 맞다.
보부아르는 천재이고, 아름다우며, 빨간색이 아주 잘 어울린다.
아름다운 빨간 천재, 시몬 드 보부아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