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미니즘 입문의 계기
페미니즘 입문의 계기
수하님의 <페미니즘 입문의 계기>에 이어서 쓴다.
‘정규직 내정자’를 채용하지 않기 위해,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 채용 후 출산 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모집 분야를 바꿔 다른 남자 직원을 뽑는 사람들의 마음을, 수하님은 이해한다고 썼다. 나 역시도 그랬을 거 같다. 세상이 온통 남자들 세상인데 여자들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는 건, 그래, 너무 과하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배신감,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결혼 후 남편과 나에 대한 시댁과 친정의 ‘처우’를 보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 경우다. 이른바 시월드 입성 후. 시어머니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 보통보다는 나은 경우라는 걸, 결혼 후 4-5년 차쯤 됐을 때 알게 됐다.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그랬다. 나도 결혼 전에는 친정에서 팬덤 거느리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 남편은 ‘하늘 같은 아들’과 ‘백년손님’을 오가는 데 비해, 나는 (수식어 없는) 큰며느리와 (역시 수식어 없는) 딸이었다.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지는 않았지만 놀랍기는 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된 후에야 비로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적어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슴 터질 듯한 사랑도 느꼈지만 미칠 듯한 좌절감도 맛보았다. 그전까지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백만 가지 방식으로 아이와 연결된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페미니즘의 이상향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페미니즘을 저버릴 수도 없었다. 아이를 욕조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20쪽)
『빨래하는 페미니즘』의 저자 스테퍼니 스탈은 바너드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언론계와 출판계에서 활약하던 중 결혼-임신-출산을 겪으며 프리랜서 기자로 전업한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던 중 대학의 ‘페미니즘 고전’ 수업을 청강하면서 그 과정을 책으로 엮어냈다. 나의 페미니즘 읽기의 시작과 같은 책. 이때가 2015년이다.

『내 날개옷은 어디 갔지?』는 2013년에 읽은 책이다. 여자, 여자로서의 삶, 여자의 일생,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위대함, 이런 류의 제목에 질색하던 내가 그림(장차현실님)에 이끌려 무심코 읽기 시작했는데 이 문장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집이 안식처가 될 수 없는 나의 현실과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
다음 날 아침이 지나면 집은 다시 거짓말처럼 어질러져 있다. 벽에 기대 앉아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있다. 어디부터 또 손을 댈까. 아기는 자기만 보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아댄다. 집이 나에게도 쉬는 곳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나는 집을 나가서 쉬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다. (30쪽)

세 번째로는 레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가 기억난다. Mansplain의 재발견도 놀라웠지만, 더 놀랐던 건 이런 문장.
부연하자면, 총에 맞아 죽은 여성들의 3분의 2 가까이는 현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게 살해되었다. (49쪽)
이 나라에서는 9초마다 한번씩 여자가 구타당한다. 확실히 짚어두는데, 9분이 아니라 9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미국 여성의 부상 원인 중 첫 번째다. (49쪽)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속담을 가진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는 여성 폭력이 미개함과 후진성의 증거(그것 그대로 사실이긴 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 여자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가장 부유한 나라의 여성도 ‘맞는다’는 데 생각이 이르자,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여성 부상 원인의 첫번째가 배우자의 폭행이라는데 식겁했다. 은폐되고 감춰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와 민족, 계급과 인종을 넘어 사회 전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이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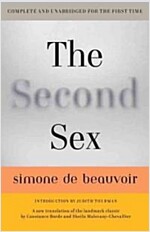
여자가 자신을 위해 자신에 의해 살게 될 때, 그때 여자는 완전히 한 인간이 될 것이다. (379쪽)
네 번째 책은 <여성주의 책 같이읽기>에서 함께 읽었던 주옥같은 책들 중,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천재가 들려주는 여성의 역사. 제2의 성으로 갈음되었던 여성이 겪어냈던 여성의 역사, 신화와 문학 속 여성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현재에 대한 통찰이 이어진다. 그 외에도 주옥같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처음 페미니즘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울림을 주었던 책을 위주로 적어 보았다.
다음을 묻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다음은? 이라고 묻는 사람이고 싶다. 농경 사회에서부터 지속된 견고한 가부장제의 오천 년 역사와 신화, 종교,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문화, 문학, 과학을 지배하는 여성혐오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 너머,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묻고 싶다. 다 망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인류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안다. 같은 호모 사피엔스를, 여성을, 동물을, 토양을, 해양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핍박하고 착복하는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 그럼에도 다음을 묻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묻고 싶다. 물어야 한다고, 그래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 그 답은 반핵과 반전, 그리고 환경운동이 될 것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로 엉망이 된 이 지구를 구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멸망을 연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나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 하아, 우리의 새 정부는 북한에 적대적이어서 한반도에 초긴장 상태가 예견되건 말건 전혀 상관없다는 듯, 원전 세일즈한다고 저러고 다닌다.
페미니즘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