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놓친 책이 있을까, 몇 날을 훑어보다 산 책이다. 도서정가제 기념 덤핑(?) 시즌에 -.-;

처음 알라딘에서 봤을 때, 책이 너무 두꺼워 놀랐다. 조금 무서웠다. 그리고는 싼 가격에 또 놀랐다. 50% 할인이기도 했지만, 정가 자체가 책 두께에 비해 싸다. 39,900원. 나는 19,950원에 샀다.

철학을 계통을 밟아 배워 본 적이 없어서, 철학책을 읽을 때 나는 항상 불안하다. 공자의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를 경구로 새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學은 스승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동학들 사이의 토론을 포함한다. 함께 읽고 배우고 논쟁하여야 비로소 學이 된다. 그래서 혼자 읽는 책은 思에 더 가까울 것 같다. 그것은 殆, 위태롭다. 그냥 좋아서 읽는데, 기회가 되면 강유원의 아카데미 같은 곳을 찾아볼 생각이다.
몇 권의 철학사를 읽어보기도 했다. 그런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얇팍한데 지루하고, 어려운데 깊이는 없고, 체계적 지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또 샀다.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 철학사』는 제목으로 일단 사람의 기를 죽인다. 이래도 읽을래? 그런데 목차가 마음에 들었다. 특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계몽주의, 칸트, 그리고 헤겔로 이어질 19세기 철학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두툼한 분량의 칸트, 어느새 칸트가 내 손안에 들어온 듯 했다.
철학사든 세계사든, 나는 보통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현대를 이루는 토대가 이 시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근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대는 자본주의, 합리주의, 국민국가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강유원의 책에서 읽었다.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은 합리성이다. 합리성의 기준은 실용성이고, 실용성이란 한마디로 이익이 되는것, 돈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일은 모두 쓸데없는 짓, 비합리적인 행동이 된다.
어릴 때 엄마에게 자주 듣던 말, "책 읽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당시, 가난한 환경에서는 그랬다. 이야기책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 지금 이야기책은 다양한 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다못해 '서재지수'라도 올라간다, '쓸모' 라는 기준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쓸모, 실용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우리의 근대는 일본을 경유한 서양의 근대에 바탕한 것이다. 우리는 仁보다 資本을, 禮 보다 자유와 평등을 더 사랑한다. 조선 500년이 가르쳐 왔던 것 보다, 유럽이란 먼 땅의 혁명이 만든 사상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 토대 위에 삶을 바꾸어 왔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사는 꼬라지를 되돌아 보기 위해, 고려와 조선 보다 먼저 서양의 근대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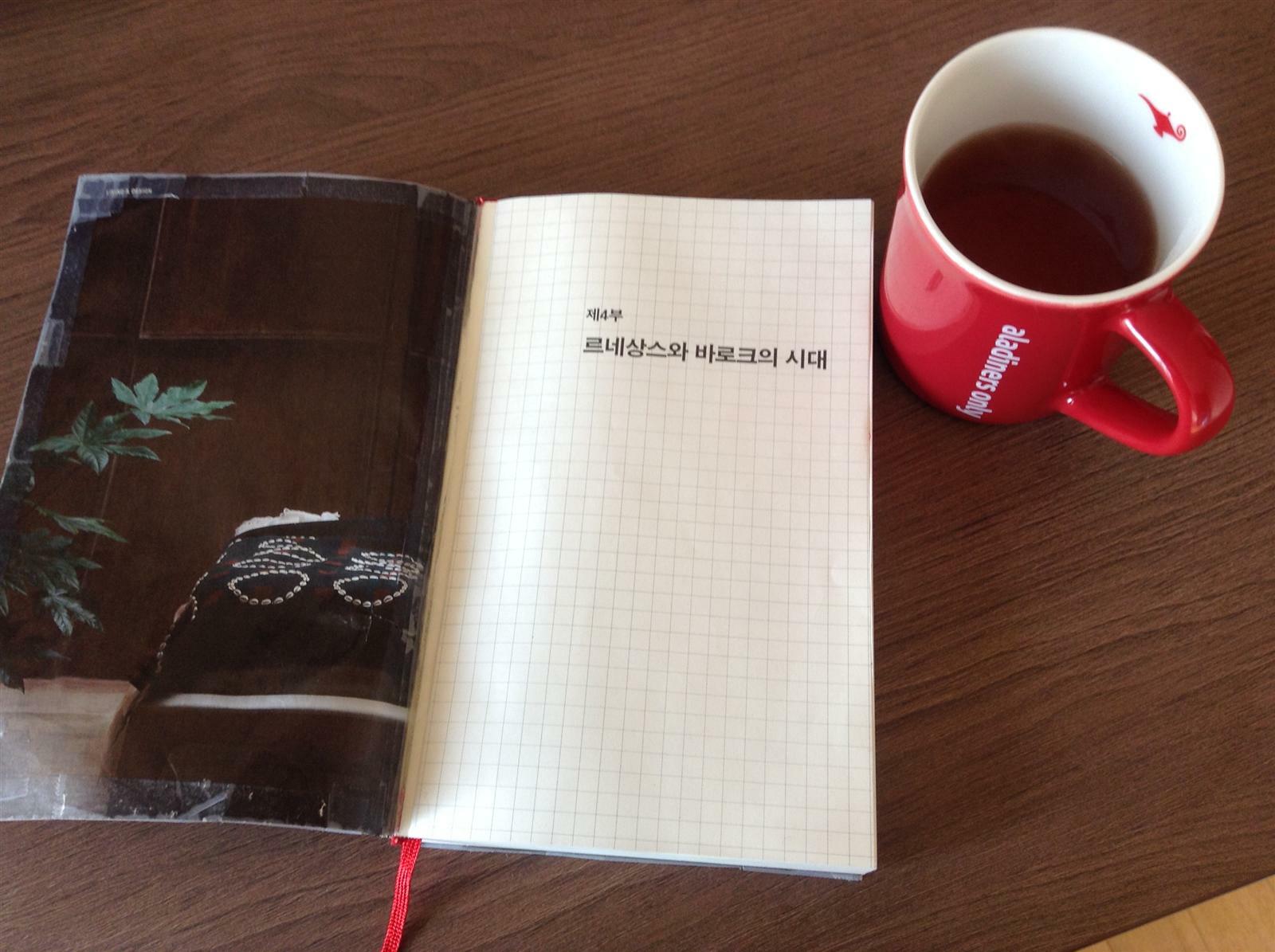
지난 주 알라딘의 메일이 도착했다. 『세계 철학사』리뷰를 올려달라는, 통상적인 광고 메일인데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도착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이 두꺼운 책을 벌써 어떻게 읽고 어떻게 리뷰를 쓰냐? 이 바보야, 소리가 절로 나왔다. 게다가 이번 달은 소소한 일들이 많아서, 마음먹고 책상 머리에 앉거나 카페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
지난주에 겨우 읽기 시작해서 <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대>를 읽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어떤 점이 그랬냐고 묻는다면... 그냥 정리겸 리뷰를 쓸 생각이다. 총 7부라 적어도 7개 이상의 리뷰가 될 것 같다. 분류상으로 그렇지만 아마도 10개가 넘을 것 같고, 두세달은 족히 걸리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