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368호)에 실은 리뷰를 옮겨놓는다. 주요 정치철학자들의 공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난장)을 오랜만에 읽고서 알랭 바디우의 민주주의론을 간추렸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숙고할 여유가 없지만, 총선 이후에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들을 던져주는 책이다.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론(바디우는 민주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단계에서는 그가 정의하는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글이기도 하다. 바디우가 번역한(번안한) <국가>도 소개됨 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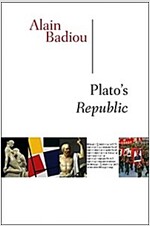
주간경향(20. 03. 16) 세계 자체가 실종된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는 번역본의 제목이고, 원제는 ‘민주주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의 간판 철학자 아홉 명이 제출한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한데 모은 책이다. 1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문제의식은 전혀 퇴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주목해서 읽어봐야 할 글이 많지만, 국내에도 많은 책이 소개된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민주주의론을 간추려본다. 그의 글 ‘민주주의라는 상징’에서 상징은 ‘엠블럼’의 번역인데, 바디우가 겨냥하는 것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비판이다. 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상징’이라는 것은 바디우만의 견해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비판의 도마에 올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는 그 비판에서 제외된다. 곧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가림막 뒤에 숨을 수 있다. 바디우는 그 민주주의를 건드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며, 살고 있다고 믿는 성벽의 성벽지기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시도하며 바디우가 버팀대로 삼는 것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게 민주주의란 특정한 국가 형태(정체)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주체의 유형과 분리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주체, 혹은 ‘민주주의적 인간’은 어떤 주체인가? 그것은 하찮은 향락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의 주체다.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에게 디오니소스적 격정을 심어주며 68세대의 아나키스트가 그랬듯이 “구속받지 말고 즐겨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년에게는 모든 가치가 똑같다고 가르친다. 모든 가치가 동질화되면 가치의 표준으로서 돈만이 숭배되고 노인들은 차츰 구두쇠가 된다. 민주주의적 인간이란 탐욕스러운 청년과 구두쇠 노인을 접붙인 인간이다.
바디우가 보기에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세계 자체가 실종된다. 플라톤주의자로서 바디우에게 모든 세계는 차이에 의해서만 구축된다. 세계는 먼저 진리와 의견의 차이에 의해 구축되고, 이어 서로 다른 진리 간의 차이를 통해 구성된다(바디우에 따르면 진리는 사랑과 정치, 예술과 과학, 네 영역에서 발명되고 생산된다). 그런데 만물의 등가성을 통해서 모든 차이가 지워지고 배제된다면 논리상 세계는 출현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무세계이고, 무정부 상태다. “이 무정부 상태는 무가치한 것에 기계적으로 부여된 가치와 다름없다. 보편적 대체 가능성의 세계는 고유한 논리를 갖지 않은 세계이며, 그래서 세계가 아니다.”
이러한 무세계, 혹은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바디우는 플라톤이 귀족에게만 한정했던 역할을 모든 인간에게 확대 적용하려고 한다. 알려진 대로 플라톤은 <국가>에서 생산자 계급과 달리 수호자 계급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것과 공유만이 존재했다. 이러한 수호자 계급의 일반화를 바디우는 “모두를 귀족이 되게 하기”라고 표현한다. 덧붙여 그는 모두의 귀족 되기가 공산주의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말한다. ‘인민이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갖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러한 공산주의자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디우의 주장이다. 우리의 선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게 한다.
20.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