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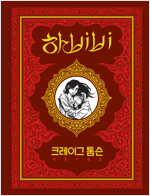
지난주 그래픽 노블 <하비비>를 도서관에서 만나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다. 동네 슈퍼에서 1+1 세일 중이던 파스타 소스를 둘 샀고 2+1 탄산수도 여섯 개나 챙겼기 때문이다. 카톡으로 들어온 '상호대차 신청 도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메세지는 내가 건널목을 건너기 직전에 받았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만났을 땐, 내일 올걸 그랬지.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책일줄은 몰랐지. 그런데 알았어야지. 그 유명한 <담요>의 작가의 책인데.

<담요>가 기독교 안에서 살아내며 성장한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면 <하비비>는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과 (이방인이) 경전과 계급, 온갖 굴레를 살아내면서 물/생명/글/잉크를, 결국 이야기와 구원을 추구하는 이야기다. ... 라고 쓰고보니 과연 그랬나? 싶다.


초반부는 <천 개의 찬란한 태양>과 <페르세폴리스>가 연상되는 여성 잔혹사로 시작한다. 주인공 여성 도돌라는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다 그곳에서 버려진 어린 흑인 아이(잠)을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친다. 도돌리가 겨우 열두 살, 잠(후에 하비비)은 세 살 때의 일이다. 표지의 두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이 두사람은 모자로 보기에도, 연인이 되기에도 매우 불안한 관계다. (성경과의 의도적인 병렬구조는 마리아-예수 모자관계를 연상시킨다. 피에타의 두 인물이 얼마나 애절한지 떠올려본다) 도돌라는 하비비를 돌보며 살아가다 납치되어 할렘에 갇히고 강제로 임신 출산을 겪는다. 하지만 어린 도돌라와 성인 도돌라가 함께 교차하며 등장해서 함/잠/하비비 등 여러 이름의 아기/소년/남자 등으로 복잡하며 불리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갸가 갸라는 건 조금 더 읽어야 나온다. (이거 스포일러가 되어버렸군요)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과 인연 보다도 이들을 둘러싼 환경/문화/적들을 풀어내고 그려내는 방식이 독특하다. 이들은 코란 경전의 글자들로 하나씩, 그림 같이 보이는 그 문자들의 틀로 보호도 받고 그 안에 갇히기도 한다.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을 짚어낼 때마다 세계는 멀티버스로 갈라지는 것도 같다. 노아의 아내는 방주에 탔는가. 노아의 아들 함은 왜 저주를 받았는가 (받은 건 맞대?), 아브라함이 바치려던 '아들'은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그리고 ... 무엇보다 시초에 있었던 말씀 혹은 잉크 한 방울.
마지막 장면도 그닥 희망적이지 않고 묵직하게 의무감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살자. 살아보자. 날자, 날자꾸나.
대상화가 되어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았던 도돌라는 결국 하비비가 필요했으니 아들이 있어야 하는 어머니/여성인 건가. 명절에 제사 모실 아들이 필요한건가. 이런 식으로 여성은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는구나.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미국인 백인 남성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불편하다. 여성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벗으려 애쓰고 있는데 과연 그 작업에 성공했는가.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폭력의 기운에 그는 얼마만큼 협조하고 있는가. 여성은 끝까지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너그러운' 저자의 시선은 오리엔탈리즘과 어떻게 다른데?
복잡한 내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림은 역동적이다. 등장 인물들이 도망가고 쫓고, 추락하고 폭발하는 장면 장면들은 흑백으로 정지된 컷안의 그림이 아니라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