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민호 기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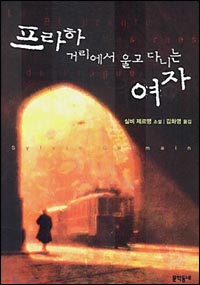 |
|
|
|
| ⓒ2006 문학동네 |
프라하,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비교적 싼값에 명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개성 강한 문학가들의 발자취 때문인가? 어쨌든 ‘프라하’를 말하는 책들은 끊이지 않고 나온다. 얼마나 프라하가 좋은지 경쟁이라도 붙은 듯이.
실비 제르맹의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는 어떨까? 장르가 소설임에도 ‘프라하’ 때문에 눈에 띈다. 제목을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그녀’는 왜 울고 다닐까? 그 좋다는 프라하 거리에서? 궁금증을 갖고 책을 펼쳐본다.
‘그녀’는 누구일까? 모른다. 저자는 엄청나게 큰 거인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녀가 책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가 배회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배회라니, 어디서? 프라하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도대체 그녀는 누굴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나타나는 곳은 오직 프라하라는 것 뿐이다.
그녀가 나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평소에는 진지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 울음 소리다. 그녀는 왜 우는 것일까?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녀의 울음은 보통의 사람들이 우는 것과 다르다. 그녀의 울음은 그녀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것이 우는 것과 같다.
“사실 그 여자는 전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살 속에서 흐르는 피가 귀에 들리지 않게 잉잉대는 소리가 문득 들리게 된 것인 양, 물기 있는 속삭임이 그녀의 몸 저 속으로부터 나직하게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을까? 그것은 그녀의 살이 속에서 떠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살갗이 떨리는 소리였을까? 그렇지만 그 무슨 이기지 못할 고통 때문에?”
-책 속에서.그녀를 만나는 것은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과 같다. 하나의 사실들을 하나씩, 혹은 둘씩 알아간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다. 그녀를 만난 그때 어린아이의 시를 듣는다. 테레진의 어린아이다. 테레진!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수용소로 사용했던 장소로 약 14만 명의 유대인이 수용됐던 곳이다. 3만여 명이 여기서 죽었다. 9만 여명이
아우슈비츠 등으로 이송됐다. 전쟁이 끝났을 때 겨우 2만 여명이 살아남은 곳이 바로 테레진이다.
“미풍은 한 어린아이가 쓴 그 시의 낱말들을 아주 낮게, 아주 아주 낮게 웅얼거리고 있었다. 테레진의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된 어린아이가 쓴. 끝내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러나 사람들이 재에게, 바람에게, 구덩이에게, 망각에게 넘겨줘버린 한 작은 어린아이가 쓴.”
-책 속에서.그녀는 누굴까? 누구이기에 프라하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것일까? 혹시, 그녀가 곧 프라하가 아닐까? 아니,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허락한다면 프라하의 영혼은 아닐까?
“세기에 세기를 거듭하는 동안 그토록 많은 사라진 몸들, 난파한 남자 여자들, 맨발로 환장하여 눈이 뒤집힌 아이들을 그 헌 누더기의 주름주름마다 품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저 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무거운 역사의 몸을 떠메고 가야 하는데 그 거인여자가 어찌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책 속에서.그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를 따라가는 건 프라하의 아픈 기억 속으로 스며들어 간다는 것일 게다. 그렇다. <프라하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의 책장을 여는 건, 상처를 공유하겠다는 주문을 외는 것이다.
좋다고 소문난 프라하를 기대했다가 되레 아팠던, 그리고 지금도 아픈 프라하를 마주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남을 멈춰야 할까? 내 것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본다는 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처음과 같은 질문이지만 의미가 달라진 의문 때문에 갈등을 참아낸다. 그녀는 ‘왜’ 울고 다닐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그녀를 쫓게 만든다.
“한순간, 아주 짧은 한순간, 도시 전체가 거인여자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그녀의 품안에서 포근히 감싸였다. 그리고 그녀의 배에서, 대지와 그 뿌리의 깊은 태 속에서, 우유맛이 나는 눈물의 종소리를 내는 심장에서 솟아오르는 노래가 그 도시를 쓰다듬었다.”
-책 속에서.그녀는 왜 울고 다니는가? 위로? 연민? 무엇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울고 있는 그녀가 있음으로 해서 짧은 순간이라도 그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보듬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그녀가 있음으로 해서, 그녀가 울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프라하는 어제의 프라하를 마주보며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다. 울면서, 웃으면서.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는 묘한 울림이 있다. 그래서인지 프라하를 홍보하는 목소리에 비하면 작고, 가냘프지만 마음을 이끄는 데는 무엇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다. 작품의 중간 중간에 언급된 ‘프라하의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쉽게 잊게 만드는 고혹적인 울림이다. 어제와 오늘의 프라하와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일까? 프라하, 그곳의 향기를 잔뜩 불러내고 있다.
/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