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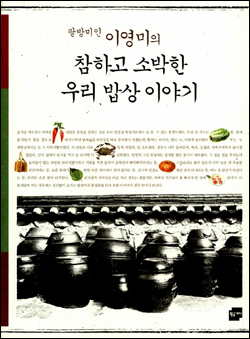 |
|
| ▲ 0605-110.jpg |
| 1R|1109964140.jpg|width="250" height="339" alt=""| |
| ⓒ2006 유혜준 |
읽으면서 입맛을 쩍쩍 다시게 하는 책 한 권을 만났다. 입맛만 다시는 게 아니라 어찌나 쫄깃거리게 썼는지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팔방미인
이영미의 참하고 소박한 우리 밥상이야기>다.
웰빙이 유행하면서 소박한 밥상이야기는 신물나게 듣거나 보았다. 또한 내가 워낙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방면의 책도 여러 권 읽기도 했다.
나는 집에서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십년도 더 전부터 현미를 넣은 잡곡밥을 해먹고 있다. 가급적이면 햄이나 소시지를 반찬으로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인스턴트 식품도 가능하면 적게 먹으려고 하고, 점심도 도시락을 싼다.
다시 말하자면 소박한 밥상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물론 아는 것을 모조리 실천하는 건 직장생활을 하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가능하면 실천하고 애를 쓴다.
그런 내게 이영미의 책 제목은 솔직히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펼치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게 어찌나 재밌던지 그만 홀려버리고 말았다.
책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는 건 독자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읽으면서 이영미가 풀어놓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기쁨을 빼앗는 것이 되니까.
물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은 저자의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지 못할 수도 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라면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나 추억이 비슷해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차리는 밥상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먹거리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만들던 과정, 내가 지켜보면서 맛을 보던 일 등을 생각했다. 그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거나 음식을 만들 때면 꼭 나를 불러 앉혔다. 저자처럼 나도 결혼할 때까지 한번도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지만 하는 과정은 늘 지켜보았고, 맛을 보았다. 처음에야 뭐가 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 번 되풀이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간을 볼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나 김장 때 음식 간을 보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겨울 김장김치는 친정어머니와 내가 같이 담근다. 내가 없으면 김치속의 맛을 제대로 가늠할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맛을 보면서 '고춧가루를 더 넣어라' '마늘을 더 넣어라' '소금을 더 넣어라' '멸치액젓을 더 넣어라' 등등 이야기를 한다. 명절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소금을 더 넣어라' '식초는 그만하면 됐다' '설탕을 더 넣어라' 등등도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소리다. 그럴 때면 울 어머니는 내가 음식맛을 귀신같이 본다고 좋아한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지 좋아하는 호박잎쌈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올 여름에는 호박잎쌈을 많이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홍옥이니 국광이니 하는 사과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어머 맞아, 그런 사과들이 있었어' 하면서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당주당과
미리내의 비빔냉면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그 시절에 나도 거기서 눈물을 쏙 빼면서 매운 비빔냉면을 먹었던 기억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나 역시도 저자처럼 떡볶이를 무지 좋아한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어울려 신당동까지 가서 연탄가스 냄새 맡으면서 먹던 즉석떡볶이가 먹고 싶어졌다. 그 때는 그게 왜 그리 맛있던지... 지금은 그 맛이 안 난다. 요즘도 가끔 노점상 떡볶이를 사먹는데 맛있는 집이 드물다.
나는 우리 고유의 먹거리가 제일 좋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 제철 음식을 먹기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제대로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즉석음식이라는 레토르식품이 많이 나오는 건 요즘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렌지에 휙 돌려서 먹는 즉석음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슬로우푸드는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은 무지 긴데 먹어치우는 건 순식간이다. 그래서 쉽게 음식을 만들겠다고 달려들 엄두가 안나는 것이다. 그게 아쉽다. 그래도 먹거리는 중요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게 어디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
거봐, 그동안 잊고 편안하게 살았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아까운 게 아니야. 소박한 밥상을 제대로 차리라구. 그게 다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
이영미 덕분에 바쁜 내 몸이 더 고달퍼지게 생겼다. 그래도 이 책을 읽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읽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책을 읽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잘 주는 편인데 이 책은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고? 이런 책은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혜준 기자